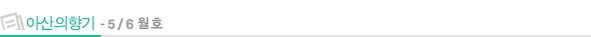|
 정훈소의 여백
정훈소의 여백 |
 황진이2 황진이2 |
정훈소 |
|
|
당신을 못 본 지 여러 날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병상입니다. 역시 나이는 속이기가 힘든가 봅니다. 워낙 노쇠한 몸이라 병을 얻은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몸을 아끼지 않은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족에 힘이 없고 자꾸 눕게만 됩니다. 낮에도 잠깐씩 잠이 들면 나쁜 꿈을 꾸곤 합니다. 혹 이러다 정신을 놓게 되면 어쩌나, 예전의 습관대로 여러 권의 서책을 머리맡에 두고 읽기는 읽습니다만,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옛말에 사람이 나이 먹으면 귀가 맑아져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 했는데 나는 어쩐지 그 반대입니다. 몸에 병이 침범하니 마음까지 황량합니다.
집의 식솔들과 이웃의 벗들은 조용하고 가까운 곳에 병이 나을 동안만 다녀오라고 요양과 여행을 권합니다만, 나는 그러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냥 여기 앉아 내 몸의 병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후세의 어느 시인은 병을 일컬어 ‘몸에 쓰는 답장’이라고 했다지요,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고 당신의 안부와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안부 묻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요? 아픈 곳은 없고 마음은 평안한지요? 두루두루 궁금합니다. 내가 병중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과 헤어져 병석에 누운 것이 가을인데, 해가 바뀌고 벌써 봄입니다. 며칠 전에는 날씨가 하도 화창하고 잠시 병이 물러간 듯 몸이 가뿐하여 시동 아이와 함께 오랜만에 못가와 집 안팎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작년에 가꾸어 놓았던 화단이며 못가의 철쭉이며 쑥부쟁이, 노란 개나리가 보기 좋게 피어 있었습니다. 목련나무의 흰 꽃들은 벌써 떨어지고 있었지요. 역시 일찍 핀 꽃은 일찍 시드는가 봅니다. 사람도 이와 같다고 봅니다. 하늘의 명과 사람의 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대기만성을 좋아합니다. 부디 당신이 정진하고자 하는 일에 힘쓰기 바랍니다.
당신이 처음 나에게 왔을 때 나에게서 도를 알고자 왔다고 했었지요. 그러나 나는 당신을 담을 만한 그릇이 못 되었지요. 오히려 당신이 도를 담을 만한 그릇임을 나는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시시때때로 직감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잠시 동안만 나의 곁에 머물다 가라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당신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흘러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내가 왜 그때 당신에 대한 나의 마음의 싹을 단칼에 베어버리지 못했었나… 지금은 후회합니다. 나의 지나친 신중함이나 순간의 선택은 나를 가끔씩 후회의 문턱에 다다르게 합니다. 왜 그럴까 아무리 곰곰 생각해 보아도 나는 도무지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늘이 나를 무쇠처럼 단련시키고자 나에게 베푸는 풀무질, 제련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물론 사람의 길흉화복의 운명이나 그런 것이 미리 정해져 어떤 궤도를 따라 앞으로 나아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이 정말 하늘이 나에게 주는 어떤 것이라면 나는 또한 하늘의 명을 따르기로 합니다.
당신과 나, 이렇게 멀리서 서로 바라만 보는 것, 안타깝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에게는 분명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넘거나 버려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킬 때, 사람은 사람입니다. 당신도 안타깝지만 나 역시 뼈저립니다. 이 뼈저림과 안타까움이 나를 나답게 하고, 당신을 당신답게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만 줄입니다. 지금은 병중이라 마음은 황황하고 붓을 놀리기도 힘이 듭니다. 부디 나를 용서하기 바랍니다.
글쓴이 정훈소는 뇌성마비 장애인이다. 지금은 삼성동 그의 집에 웅크리고 앉아 처마밑 쳐 놓은 거미줄에 먹이가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거미처럼 습작과 창작에 몰두하고 있다.시집으로 「아픈 것들은 가을하늘을 닮아 있다」 등이 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