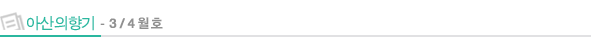|
 정훈소의 여백
정훈소의 여백 |
 아이와 사진 아이와 사진 |
정훈소 |
|
|
공원에 낡은 나무 벤치가 하나 길다랗게
놓여 있다 낡은 나무 벤치를 사이에 끼고
아이가 하나 양쪽 팔을 좌우로 펼쳐 비행하듯 깔깔거리며
뛰어다니고 있다
바로 앞
카메라를 든 아이의 부모가 재성아 재성아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저만큼 나비처럼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세살바기 아이를 향해
찰칵 찰칵 셔터를 누르고 있다
셔터를 누를 때마다 세살바기 아이의 시간이며 풍경이
사진 속에
꼼짝없이 묶이고 있다
그러나 아이는
사진 속
묶인 시간이며 풍경에는 아랑곳없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공원의 한 모퉁이 길다랗게 놓인 낡은 나무 벤치의 한쪽 모서리가
방금 전보다
조금 더 닳아져 있다
시간은 균열이다. 그것은 존재에 대한 폭력이고 테러리즘이다. 사물들은 시간이라는 무시무시하고 거대한, 불가항력적인 폭력 안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들어있다. 사물이나 존재들은 서로서로 연계하여 시간의 흐름이나 테러를 막아보려고 발버둥쳐 보지만 그 모두가 다 소용없는 헛손질들이다. 시간의 권력 아래 놓여진 사물들 중 그 무시무시한 폭력을 피해가거나 역행하여 흐름을 흐트러 놓을 수는 없다. 다만 존재나 사물은 시간 안에서 폭력과 테러를 수용할 뿐, 그 결과로서 사물들은 균열한다. 틈이 생기고 그 틈 사이사이로 소멸의 물방울이 스며든다. 어둠이 한줄기 빛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듯, 시간은 오직 사물의 균열과 소멸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잠깐씩 잠깐씩 노출할 뿐이다.
여기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한 장 있다. 사진 속 아이가 두 팔을 날개 삼아 팔랑팔랑 날아다니고 있다. 공원의 풍경을 보니 어느 휴일의 오후인 모양이다. 햇살은 맑고 투명하고 눈이 부시게 공원을 비추고 있다. 이렇듯 사진은 시간의 정지이고, 시간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다. 인간은 한 장의 사진을 통해 순간순간 이미 과거가 되어 버린 시간을 소유하려 하고 앨범 속에 끼워 놓으려 한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소유하거나 앨범 속에 끼워놓을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엄밀히 말해 그것은 카메라의 렌즈를 통과한 빛의 잔상이고 감광막에 맺힌 사물의 그림자다. 지나간 모든 건 우리들 기억 속에, 감광지 위에 빛의 잔상과 그림자를 남기지만, 우리들 기억조차도 믿을 수 없고, 불완전하고, 점점 희미해져 간다. 방금 전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거쳐 나온 사진 역시, 나오는 순간부터, 공원을 내리쪼이는 밝은 오후의 눈부신 햇살에 의해 보이지 않게 변색되거나 해체되어 간다.
시간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시간은 수수께끼다. 그것은 언제나 희뿌연 안개 뒤에, 장막 뒤에, 14세기 중세의 수도사들처럼 자신이 쓰고 다니는 검은 망토로 몸을 가리고 있다. 신성한 자신의 알몸을 밖으로 사람들 앞에 함부로 드러내길 지극히 꺼려한다. 망토를 벗기고, 혹은 희뿌연 안개를 걷어내고 그것의 알몸을 본 사람은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다. 백과사전을 가져오고, 우주와 인간의 기원을 말하는 성경이나 코란, 세상의 모든 역사책을 뒤진다 해도 그것은 결코 풀리지 않는다. 시간은 인간 사고의 영역을 넘어서 있다. 시간이 무엇인가? 순간, 순간 나의 존재를 삭제하면서 그것은 왜 미래로만 흐르는가? 나는 그것을 잠시 멈추어 놓거나 내가 행복하였다고 기억하는 과거의 어느 날로 역행하여 나를 옮겨 놓을 수는 없는가? 물으면 물을수록 나는 미로 속을 헤매고, 나의 사고는 벽에 이마를 부딪고 여기서 중지한다.
중관학파(中觀學派)의 용수(龍樹)는 공(空)을 말했다. 지금 내 컴퓨터 책상 위에는 볼펜이 한 자루 굴러다니고 있다. 이 볼펜은 그 속을 열어 보면, 스프링과 잉크를 담는 긴 대롱과 종이에 그으면 잉크가 묻어 나오는 심 끝의 작은 볼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들은 간단한 메모를 하거나 글을 쓸 때 대부분 볼펜을 사용한다. 나는 볼펜으로 글을 쓰지는 않지만, 손을 뻗어 볼펜을 집어 들 수 있고, 책상을 똑똑 두드려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다른 용도, 예를 들어 심을 빼내고 껍질만 불에 달구어 빰뿌리를 만들어 담배를 꼽아 피울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이 볼펜은 지금 내 코앞에 있다. 그런데 용수는 공을 말했다. 아마 용수도 시간에 대해 말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사실 시간 안에서 확실한 것이란 없다. 그렇다고 시간을 멈출 수도 없다. 시간을 멈추거나 시간의 지배, 혹은 폭력에서 자유로워지거나 벗어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사물로서의 존재의 부정을 의미한다. 산다는 것은, 아니 어떠한 형태로든 사물로서 존재의 끈을 놓지 못한다는 것은 시간을 호흡하며 시간 안에서 시간을 견뎌내고 시간과 싸우다 시간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주고 소멸해 가는 것이다.
글쓴이 정훈소씨는 뇌성마비 장애인이다. 지금은 삼성동 그의 집에 웅크리고 앉아 처마밑 쳐 놓은 거미줄에 먹이가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거미처럼 습작과 창작에 몰두하고 있다.시집으로 「아픈 것들은 가을하늘을 닮아 있다」 등이 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