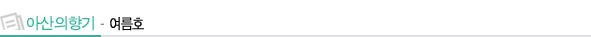|
 여름의 편지
여름의 편지 |
 고양이가 웃네 고양이가 웃네 |
박완서 |
|
|
집에 오는 손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왜 개를 안 기르냐는 소리이다. 혼자 사는 게 적적해 보이기도 하고, 안전을 염려해서일 듯도 싶다. 아닌 게 아니라 집집마다 개 없는 집이 거의 없다. 나는 시간이 날 때 마다 동네를 슬슬 한 바퀴 도는 게 운동 겸 취미인데, 사나운 개가 있는 골목은 피해 다닌다. 크고 무서운 개일수록 굵은 쇠사슬에 묶여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길길이 뛰면서 짖는 걸 보면 쇠사슬을 끊고 곧 뛰어나올 것만 같아 오금이 다 저려온다.
나는 그런 개를 길들일 주제가 못된다. 우리 동네는 재래식 땅 집 동네지만 이렇게 사나운 개를 기르는 집보다는 아파트처럼 작은 애완용을 기르는 집이 더 많고, 그런 개들은 대개 아무나 보고 꼬리를 치니까 나도 귀여워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더러는 개 때문에 끌고 나온 주인하고 말을 트게 되는 경우도 있다. 나도 개를 싫어하는 건 아니다. 다만 책임을 지기가 싫을 뿐이다. 나는 훌쩍 여행을 떠나기를 잘하는데, 그럴 때 개를 맡기려면 이웃이나 딸네 집에 신세를 져야하는 게 싫고, 신세지기 싫다고 개 호텔 같은데 맡기는 건, 비용을 떠나서 나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어서 더 싫다.
우리 동네엔 고양이도 많다. 집 고양이인지 들 고양이인지 소속은 분명치 않지만 하나같이 예쁘고 사람한테 적대적이지도 않지만 우호적이지도 않다. 우리 마당에도 소리없이 들어와 어슬렁거리기도 하고 쉬었다 가기도 하는데, 어쩌다 꽃그늘에서 쉬는 걸 보면 겸재의 그림에 나오는 고양이처럼 그 존재 자체가 오묘한 예술이다. 그러니까 고양이는 나에게는 풍경이지 동물이 아니었다.
그러나 손님이 오거나 해서 쓰레기봉투에 고기나 생선류의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갔을 때는 어떻게 알고 고양이들이 모여 잔치를 벌인 듯, 대문 밖을 더럽게 어지럽혀놓고 간다. 다른 쓰레기하고 달라 내 집 음식물 쓰레기가 길바닥에 파헤쳐진 걸 보면 내 오장육부가 백주에 드러난 것 같은 혐오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히게 된다. 저놈의 고양이들을 어찌 할 것인가, 모조리 사로잡아 어디다 보내고 싶은 난폭한 충동까지 느끼게 된다. 그러나 땅 집만 있는 동네엔 의례 쥐들이 들끓게 마련인데 우리 동네에 쥐가 없는 건 고양이 덕이라는 이웃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고양이도 마을 공동체에서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마음을 고쳐먹자 대안은 쉽게 찾아졌다. 쓰레기봉투를 뒤지게 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먹게 하면 될 게 아닐까. 그래서 마당 한 귀퉁이에 그릇을 마련해놓고 끼니때마다 고양이가 좋아할 만한 것을 모으기도 하고 일부러 남기기도 해서 갖다주게 되었다. 즈네들이 좋아하는 게 들어있지 않은 쓰레기봉투는 그것들이 절대로 건드리지 않으니 한걱정 덜게 되었다. 그렇다고 내가 집을 며칠 씩 비운다고 그것들이 굶을 걱정을 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나보다 더 자유로운 야생이니까.
그러나 열심히 걷어 먹인 결과가 좋기만 한 건 아니다. 들 고양이들이 서로 연통을 해 우리 마당을 제집 드나들 듯 하면서부터 마당에서 자주 고양이가 응가 해 놓은걸 치워야하는 일이 생겼다. 이거야 원, 잘 먹여주는 집 마당은 알아서 더럽히지 말 것이지. 생각할수록 얄미웠다. 한 번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 점이 아주 아름다운 얼룩박이 고양기가 마아가렛 꽃그늘에서 응가를 하려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걸 목격하게 되었다. 너 잘 만났다, 나는 응가를 하기 전에 쫓아버리려고 팔을 높이 쳐들고 뭐라고 악을 쓰면서 다가갔다.
그러나 그 얄밉도록 예쁜 고양이는 꼼짝도 안하고 제 볼일을 다 보고도 도망가지 않고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눈부시게 흰 이마에도 윤기나는 검은 점이 박혀 있었고, 그 밑의 두 눈은 금빛이었다. 그 금빛 눈이 비웃는 것 같았다. 너희들 인간은 먹기만 하고 싸지는 않냐? 그러면서.
나는 그 아름다움과 그 비웃음에 질려서 쫓아버리려던 손길을 슬며시 내려놓았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