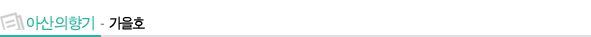|
 병상일지
병상일지 |
 질병을 벗삼아 질병을 벗삼아 |
주명순 |
|
|
“질병하고는 친한 벗으로 같이 살아가야만 한다.”
병하고 친구하며, 더군다나 오순도순 함께 살라고 하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하겠지만 건강 상담을 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되뇌는 말이다. “친구야!” 그저 부르기만 해도 감성이 따뜻해지며 무채색 미소가 번지는 그리운 벗, 늘 함께 있고 싶은 사람만 정다운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삶을 등짐으로 지고 언덕을 오르다가 기다리던 빛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림자를 거느리게 되는 건 필연이다. 그때부터 빛과 그림자는 벗으로 제각기 다른 모습과 색감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가꾸는 건 아닐까? 사람이 아닌 대상을 벗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밑그림으로 그려놓고 상담을 시작하다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정해지며 괜스레 넉넉해진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아진 요즘은 일상적인 것부터 병의 원인과 예방 및 치료과정이며 사후관리 문제까지 다양한 질문을 시도 때도 없이 받게 된다. 아무 일도 아니라고 버티다가 급기야 진료를 받은 후에도 매일 시간 맞춰 약을 먹거나 몸무게를 재야하는 등 투병과정에서 잊지 않고 실천해야할 내용을 빠짐없이 챙기는 일은 결코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질병하고 친한 벗으로 살아가야 한다’며 실마리를 찾는 게 버릇처럼 되어버렸다.
특히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께는 “지금부터 약이나 주사, 식이요법 하고는 평생 벗이 되어 친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늦게 만난 친구니까 마음 터놓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며 친하게 지내세요” 라고 당부한다. 그러면 “그 말이 좀 더 빨리 마음에 와 닿았으면 병과 싸우지도 않았을 텐데….” 라는 답이 돌아오곤 한다.
건강이라면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넘치던 친구가 십여 년 전 자궁암 전이 진단을 받고는 무의미한 전투태세로 가느다랗게 늘어진 생명의 끄나풀을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무척 안쓰러웠다. 장마가 시작되던 어느 날, 굵은 빗줄기에 가슴을 찔리며 마주앉아 표정이 구겨지지 않게 다듬이질하며 암과 친한 벗으로 살아가자고 했지만 절망 쪽으로 무게를 옮기고 서성거렸다.
우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앉던 젖은 산새 소리와 어깨 늘어진 물보라를 안고 있어 더 무거워진 바람결이 펼쳐놓은 어두운 풍경을 아무렇지 않게 담아내던 십여 년 전 여름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아픔으로 채색되어 있다. 친구가 암과 친한 벗이 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흘려보낸 억울했던 시간의 행간들이 지금도 뒷덜미를 잡고 늘어진다.
그 친구를 보낸 후부터 상담할 때는 “질병과 벗하며 살아야 한다” 로 시작하여 갈피를 잡았다 싶으면 장님과 벙어리이고 귀머거리로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은 헬렌 켈러 여사의 소망을 소개하는 걸 잊지 않는다.
“눈을 뜨게 된다면 나의 첫째 소망은 해가 떠오르고 해가 지는 장엄하고 신비스러운 광경을 보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 소망은 미술관에 가 보고 싶은 것이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