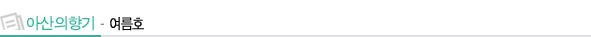|
 병상일지
병상일지 |
 행복한 시지프를 바라보며 행복한 시지프를 바라보며 |
장효진 |
|
|
여름 공기가 제법 상큼해진 어느 날, 병동 전화번호가 찍힌 채 전화벨이 울린다.
“선생님, 환자가 물도 못 삼키시겠대요. 빨리 좀 오셔야겠는데요.”
이 00씨. 후두암으로 보존적 치료를 하고 있는 63세 남자 환자다. 평소 편안하시냐는 물음에 말없이 고개만 조용히 끄덕여 주시던 분. 분명 아침 식사 전, 라운딩 때도 만족스레 웃으며 날 안심시켜 주었는데 물도 못 삼키시겠다니!
식도조영술을 했다. 종양인지 음식물인지 구분이 모호한 것이 꽉 막혀 있어 물조차 흘러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오늘 아침까지 식사를 하셨던 걸로 봐선 종양이 커졌다기보다는 음식물이 걸렸을 확률이 크다. 잠시 후 suction(흡입시술). 하나 둘 밥알을 건져내는 중간 중간 환자는 꺽꺽 힘겨운 삼킴질을 계속하신다.
바로 그 순간. 밥알 하나하나를 삼키며 고통스러워하는 환자와 씨름하며 나는 굴러 떨어지는 돌을 다시 언덕 위로 밀어 올리는 시지프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있음과 이곳, 여기에 실존하고 있음을 밥알 하나하나가 식도로 넘어가는 고통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의 운명이 순간 야속했다. 원망스러웠다.
밥알들이 한 알씩 건져져 나오면서 환자는 물을 좀 마셔 보겠다고 일어섰다. 환한 미소! 밥알이 넘어 간 것이다.
조금 전까지 세상의 고통을 다 짊어진 듯 했던 표정은 환희에 가까운 기쁨으로 바뀌어져 있었다. 아, 순간이었지만 내 짧은 감정의 경망스러움이 부끄러웠다. 그의 실존은 비록 남들에게 처절하게 보여 질 수 있었겠지만.
수없이 반복되는 고통스런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말없이 승화된 어떤 기쁨을 터득하고 있는 행복한 시지프를 바라보며, 나는 그가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 살아남을 수 있고 그리고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를 깨달았다. 그것은 결국 그 몸부림 자체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감상도 잠시 잠깐, 또다시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린다.
“선생님, 000 환자가요~”
귓불을 간질이는 한 줄기 바람에 여름의 향기가 묻어나온다. 환자와의 또 다른 교집합을 꿈꾸며 분주히 움직이는 나.
지금 나의 삶은?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