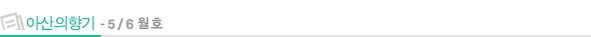|
 형형색색 세상보기
형형색색 세상보기 |
 어둠에서 태어나는 빛 - 눈동자 어둠에서 태어나는 빛 - 눈동자 |
염복남 |
|
|
어둠에서 태어나는 빛 - 눈동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을 만드실 때 까만 부분과 바깥쪽의 하얀 부분을 만드셨다. 우리가 물체를 바라 볼 때는 하얀 자위가 아니라 가운데 있는 검은 자위를 통해서 본다.
왜 하나님께서는 검은 자위를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도록 만드셨을까? 탈무드는 말한다. “너의 인생이 아무리 어둡다고 할지라도, 너의 현실이 눈동자와 같이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그 어둠을 통해 오히려 밝은 것을 볼 수 있다.”
‘깃발나무’라는 나무가 있다. 이 나무는 백두산 정상 밑에서 자라는 나무이다. 수목한계선에서 사는 나무이다. 그만큼 산소라든지 토양이라든지 하는 조건이 좋지 않은 자리에 사는 것이다. 흔히들 악조건 속에 있다고 한다. 특히 산 정상 쪽이라 바람이 굉장히 세다. 센 바람을 온몸으로 맞다보니까 바람 맞는 쪽엔 가지가 없고 그 반대에는 가지가 있다. 그래서 깃발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나무는 세계적인 희귀종으로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한다.
로키산맥 해발 2,000 미터에 수목한계선이 있다. 그곳은 비바람이 너무 강하여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악조건을 견디다 못해 마치 웅크리고 있는 앉은뱅이처럼 되어 버린 나무가 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세계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바이올린 재료가 된다. ‘공명’ 즉, 울리는 소리 때문이다. 신비한 공명 때문에 바이올린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나무를 최고로 친다.
삶의 불행이나 현실의 무게에 대한 태도도 이와 같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불행이라고 여기는 것은 마치 매트리스 같아서 깔려 있으면 죽을 맛이지만 위에 올라 있으면 편안하다.
로베르또 베니니는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를 배경으로 ‘인생은 아름다워’란 코미디를 만들었다. 아들과 함께 수용소로 끌려온 주인공은 모든 것이 ‘하나의 게임’이라고 말한다. 현실의 무게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으면서도 그 현실에 깔려 버리는 것을 거부하는 그의 여유와 웃음은 수용소조차 수채화 같은 그림으로 만든다.
도저히 배겨낼 수 없는 시련이란 없다. 엄살부릴 것이 아니다. 자기 불행에 대한 허위 의식과 과잉 의식은 엄살이다. 돋보기를 던져버려라. 돋보기는 눈앞의 것만, 그것도 아주 작은 부분에만 집중해서 커보이게 할 뿐이다. 돋보기를 던져버리고 고개를 들면, 얼마나 엄청난 불행들이 침묵하고 있는지 보일 것이다. 인간의 그 검은 눈동자는 어둠을 보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둠 속에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검은 눈동자는 어둠이 아니라 빛을 보라고 있는 것이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