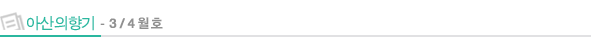|
 행복이란
행복이란 |
 행복의 좌표 찾기 행복의 좌표 찾기 |
이만재 |
|
|
친구의 별장
서울서 남쪽으로 둬 시간 남짓한 거리에 친구의 별장이 있다. 일찍이 자수성가로 사업에 성공해서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그는 말년의 별장 생활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고 여겨, 나도 일년에 서너 번쯤 집사람과 그곳을 방문해서 빼어난 풍광을 함께 즐기곤 한다.
풍광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정말 친구는 자연 경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던지 천혜의 요지에 별장 터를 참 잘 잡았다.
읍내에서 차로 10분쯤 들어가는 한적한 시골 동네, 자그마한 찔레 언덕을 등에 업고 집 앞으로는 하얀 모래밭을 동반한 맑은 강물이 흐르는데, 그보다 더한 장관은 강 건너에 병풍처럼 둘러선 기암 절벽의 수려함이라 할 수 있다. 그런 강변 풍경에 검은 조선 기와와 아름드리 원목으로 고풍을 흉내 낸 튼실한 대청마루의 한옥을 짓고, 통나무 울타리를 친 다음, 잘 다듬어진 잔디밭 요소요소에 멋들어진 키다리 적송(赤松)들을 정원수로 심어 놓았으니 누가 보아도 그 취향이 결코 예사롭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친구는 그 별장을 짓는 데 여러 해의 공을 쏟았다고 했다.
우선 천혜의 절경 한복판에 어렵사리 건축 허가를 내어 터를 다진 일 하며, 조선식의 기와집을 제대로 지을 줄 아는, 한국 땅에 몇 남지 않은 노(老) 대목(大木)을 구한 일 하며, 수입목이 아닌 국산의 통나무 원목을 강원도 진부에서 구해온 일 하며, 특별히 고안된 황토 온돌 방식으로 ‘건강 방구들 공사’를 마무리한 일 하며, 하늘을 찌를 듯이 드높은 멋쟁이 조선 소나무들을 특수 중장비로 옮겨 온 일 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옮겨온 고집불통의 소나무들을 새로운 땅에 묻어 적응시키는 일 하며…. 별장 짓기에 쏟은 공력담을 들어주는데 하룻밤도 모자랄 지경이었으니 말이다.
조수석에 마누라를 태우고
아무튼 친구는 경치 좋은 강변에다 자기 전용의 별장을 짓고 더없이 행복한 신선의 주말 풍류를 누리며 산다.
그에 비해 나는 어떤가. 누구처럼 진작에 사업 같은 것은 꿈도 꿔보지 못한 처지이니 재산을 모았을 까닭이 없다. 평생 타이프라이터 한 대로 토닥토닥 글을 써서 겨우 자식 셋을 가르쳐 출가시켰을 뿐이다. 재산이라고 해 봤자 분당 신도시 어름의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이다. 주말 생활은 또 어떤가.
별장 같은 게 있을 리 없다. 젊어서부터 자동차 여행을 좋아해 온 까닭에 토요일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지프형 디젤 승용차에 시동을 건다.
조수석에 늙은 마누라를 태우고 떠난다. 어디로? 대자연 속으로다.
정말, 대자연이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좋다. 동쪽으로 가면 설악 5령과 동해안 길이 있고, 서쪽으로 가면 강화도, 제부도, 만리포, 안면도, 변산반도가 있으며, 남쪽 방향 내륙으로는 월악산, 충주호, 청풍명월, 내장산, 청량산, 추월산, 담양호, 장성호, 지리산 외에, 욕심을 좀 부렸다 싶으면 멀리 진도며 땅끝 마을이며 고흥반도 녹동항이며 나로도며 통영항이며 거제도길이며가 다 내 발자국과 묵은 정 풋정 가리지 않고 인연을 맺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기를 수십 년이다.
어느 날 밤, 친구의 별장에서 차를 마시면서 무심코 그런 얘기를 들려 주었더니 뜻밖에도 친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친구는 원래 좀 과묵한 편이라 가끔씩 상대방을 답답케 만드는 일면이 있다. 눈을 감고 뭔가를 한참이나 생각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이형이 무한 부럽소!”
뜬금없는 거두절미가 웬일인가 싶어 잠시 기다려 주었더니 뜻밖의 토로가 그의 입에서 새어 나왔다. 요약하자면 이런 얘기였다.
경치 좋은 명당을 잡아 별장주의 신분이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였다. 알 만한 사람은 아는 일이지만, 도시와 달라서 자연 속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며칠 동안만 사람의 손길이 뜸하다 싶으면 금세 반란이 일어난다. 정원수는 정원수대로, 잔디밭은 잔디밭대로, 사방천지 잡초는 잡초대로 들고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마루며 방바닥이며 창호며 벽이며는 늘 사람의 체온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사정이 그러다 보니 주말이나 휴가철이 되어도 어디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날 수가 없다. 별장 주인이 아니라 별장지기가 되어버렸다는, 묘한 자업자득의 신세 한탄이었던 것이다.
다 이형의 소유 아니오?
그러나 듣는 나로선 정말 의외였다.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품은 듯이 보였던, 그래서 늘 선망의 대상이었던 친구 아니었던가.
아, 그렇다면 사람의 행복이란 정녕 무엇이란 말인가. 과묵한 그의 의중에 숨은 디테일이 궁금하여 눙쳐 물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내가 왜 부럽단 말이오? 그러자 망설임 없이 그의 대답이 돌아왔다.
“주말의 행복만 해도 그렇소. 나는 이곳 물가의 집 한 채에 족쇄 물린 바 되어 주말마다 꼼짝을 못하는 처지인 데 비해 이형은 어떻소?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청풍명월에서 땅끝 마을까지 팔도강산의 온갖 절경들이 다 이형의 소유 아니오? 설악산 송이조림에서 내장산 산채나물까지, 동해안의 오징어 물회에서 남도 한정식의 진수성찬까지가 다 이형의 밥상 아니오? 주말마다 나는 기껏해야 이곳에서 만날 똑같은 절벽이나 바라보면서 집에서 싸온 김밥을 먹거나 아니면 컵라면 신세란 말이오.”
나는 친구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음보를 터뜨려야 했다. 껄껄껄걸….
글쓴이 이만재는 카피라이터이자 칼럼니스트이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