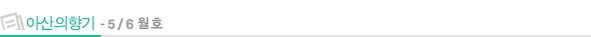|
 노돗둘
노돗둘 |
 부서진 나무 의자 부서진 나무 의자 |
안도현 |
|
|
뒷다리 한쪽이 부서진 나무 의자가 있었다.
쓰레기 분리 수거함에다 삐딱하게 몸을 기댄 채 나무 의자는 고약한 냄새 때문에 며칠째 코를 싸쥐고 있는 참이었다. 뒷다리가 부서질 때 생긴 상처가 자꾸 욱신거려 왔다. 나무 의자는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다. 금방이라도 주저앉아 버릴 것만 같았다.
옛날에 나무 의자는 어린 소나무였다. 숲속으로 비쳐 들던 맑은 햇빛과 산새들의 노랫소리를 받아먹으며 크던 시절이 있었다. 그의 몸집이 제법 크낙한 그늘을 만들 줄 아는 나이가 되었을 때였다.
“이놈을 베어 아들 녀석의 의자를 만들어 주어야겠군.”
산으로 늘 나무하러 오던 젊은 나무꾼이 어느 날 자신의 몸에 날카로운 톱을 들이댔다. 소나무는 허리가 끊어지는 통증을 느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슬픈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었다. 오히려 마음 한쪽에서 뿌듯한 기운이 샘물처럼 새록새록 스며 나왔다. 몸은 비록 잘리지만 그는 나무 의자로 다시 태어날 것이었다.
‘내가 의자가 되면 평생 그 의자의 주인을 기다리면서 살 거야.’
정말 그랬다. 소나무는 작고 예쁜 의자가 되었다. 그의 주인은 중학생이 된 나무꾼의 아들이었고, 의자는 그 주인을 기다리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의자는 주인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를 기다렸고, 그가 먼 도시에 나가 공부를 할 때는 방학이 되어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주인을 기다리는 동안, 자기 몸을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도록 닦아 놓는 일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런 즐거운 기다림의 시간은 끝이 났다. 부서진 나무 의자는 무덤 같은 쓰레기 하치장으로 실려 갈 것이고, 거기서 잡스런 오물들과 뒤섞여 치욕스럽게 생을 마감할 것이었다. 게다가 옛날의 주인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나무 의자는 소리 내어 울고 싶을 정도로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아파트 입구 쪽에서 노인 한 분이 천천히 걸어나오고 있었다. 그 노인은 옛날에 소나무를 베어 아들에게 의자를 만들어 준 나무꾼이었다. 노인은 나무 의자 가까이 다가와서는 의자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고쳐서 쓰자고 했더니 결국은 여기에다 갖다 버리고 말았구나.”
노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손을 좀 보면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노인은 나무 의자의 부서진 뒷다리를 쓰다듬었다.
노인의 손은 거칠었으나 참 따뜻하였다.
글쓴이 안도현은 시인이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