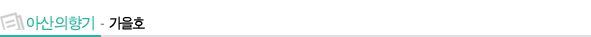|
 나누는 행복
나누는 행복 |
 아름다운 수다 아름다운 수다 |
김정용 |
|
|
토요일의 이른 퇴근을 기뻐하며 복잡한 만원버스 속에서 이리저리 부대끼다가 겨우 손잡이를 잡을 수 있는 곳에 서게 되었다. 하지만 버스가 설 때마다 관성의 법칙에 의해 밀리던 몸을 편안하게 고정시켰다는 안심도 잠시 뿐. 나는 이내 소음에 시달려야 했다.
좌석에 앉아있는 아주머니 옆에는 초등학교 3학년쯤으로 보이는 사내아이가 서 있었는데 줄곧 말을 해대고 있었다.
“여기는 간판이름이 00예요. 그러니까 00동 같아요. 가로수도 잎이 넓적해요.”
하다못해 길가의 가게에 붙어 있는 할인판매가 몇 %라는 것까지 말하고 있었다.
조용하게 오후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좀 짜보려던 나는 몇 정거장을 지나면서 아이의 수다에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다. 아이의 엄마가 보여주는 태도가 그 화를 더 돋우었다. 아이의 온갖 수다에 “응. 그렇구나!”하는 말로만 대답을 할 뿐, 아이를 제지하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속으로 “저런 엄마니까 애가 저리 수다스럽지”하면서 혀를 찼다. 그때 아이 옆에 있던 남자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버스 안에서 왜 이리 시끄러워!”
그 때부터 아이는 입을 다물었고, 나도 조용하게 토요일 오후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 속으로는 “이 녀석아!”싶게 통쾌하기도 했다.
그런데 나의 이런 통쾌함과는 달리 아이는 점점 울기 직전의 표정이 되어 엄마의 손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지만, 버스 안의 그 누구도 아이의 표정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몇 정거장을 지나 아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문 쪽으로 걸어 나갔다. 아이 엄마의 걸음걸이가 너무도 어눌했지만, 흔들리는 버스 안이라 그러려니 생각하며 나도 내릴 준비를 했다. 아이는 내가 내리는 정거장에서 함께 내렸다.
“엄마! 다 왔어요. 제 손을 놓으면 안돼요. 길이 조금 울퉁불퉁하거든요.”
그 제서야 나는 아이의 엄마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알아챘고,
아이가 버스 안에서 왜 그리 자잘한 설명을 엄마에게 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아이의 수다(?)는 버스에서 내리자 또 다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수다는 내 귀에 천사의 울림으로 전해져왔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