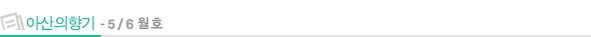|
 나누는 행복
나누는 행복 |
 어머니와 밥 外 어머니와 밥 外 |
김기숙 外 |
|
|
어머니와 밥
밥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 민족에게 쌀에 대한 느낌은 다른 민족에 비해 남다르다. 요즈음이야 쌀이 남아도는 시대이니 느껴지는 바가 다를지 모르지만, 그래도 밥그릇에 하얗게 담겨진 하얀 쌀밥은 여전히 애틋함을 자아내곤 한다.
나의 친정어머니는 시골에서 나고 자란 분이다. 손바닥만한 땅 한 평 가지지 못한 어머니 집은 그래서 쌀이 더 귀했고, 말로만 듣던 보릿고개에 배를 곯아야 했다. 지금도 친정에서 밥 한 번 먹으려면 긴장부터 된다. 어머니는 밥 한 톨 허투루 하는 법이 없는 분이시기에 밥그릇을 말끔히, 그것도 갓 설거지한 양 깨끗이 비워내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지금의 애들 아빠가 처음 친정에 인사하러 와서 밥상을 받고 밥그릇 비우는 양을 지켜보시던 어머니, “밥 굶지는 않고 살겠구나.” 그게 전부였다. 요즘 세상에 어디 밥 굶는 사람 있느냐며 한 소리 거들어도 어머니에게 있어 밥은 사람 살아가는 기본이고 전부였기에 소 귀에 경 읽기로 들릴 수밖에.
어릴 적, 더운 여름이면 냉장고도 없던 시절이라서 밥이 쉬는 일이 종종 있었다. 지금 같으면 얼른 버려버리는 것들도 어머니는 찬물에 두어 번 씻어내어 쉰 김치 얹어 술술 넘기셨던 것이 기억난다. 다른 반찬은 버리는 일이 간혹 있었어도 밥만은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 어머니에게 있어 밥은 어렵게 살아온 지난 과거에 대한 보상과도 같은 존재였을까. 쌀을 대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그때의 어머니만큼 커 버린 지금의 나로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결혼을 하고 분가해 사는 지금, 하얗게 지어낸 밥 위로 모락모락 김이 오르면 나 또한 저절로 기분이 좋아진다. 아득한 평온함마저 느껴진다. 그 밥이 가족들 수저에 소담스럽게 담겨 입안으로 들어갈 때면 나도 덩달아 침이 꼴깍 삼켜진다. 나도 어김없는 어머니의 딸이라는 증거가 핏줄이 아닌 밥상으로 땡겨지는 순간이다. 나 또한 어머니를 닮아 밥을 대할 때면 경건함이 느껴질 때도 있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얼마 전, 친정집 나들이를 하였다. 초등학생이 된 딸아이와 남편과 함께 한 오랜만의 친정 나들이는 나를 설레게 했다. 갑자기 늘어난 식솔들로 덩달아 바빠진 어머니는 전기밥솥이 아닌 결혼 전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냄비밥을 지어 내놓으셨다. 고슬고슬 뜸이 알맞게 든 하얀 쌀밥은 정말이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맛을 냈다. 몸이 불편하셔서 여러 가지 맛난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신 미안함을 밥으로 대신하신 것이다. 밥이라도 맛나게 먹여야겠다는 어머니의 진한 사랑이 밥수저 하나 가득 입안으로 그대로 전해졌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나중에 끓여 내 주신 누런 누룽지죽과 숭늉은 또 어떠한가. 어머니의 정성이 녹아내린 숭늉 한 그릇을 남김없이 비워내며 나도 나중에 내 딸에게 이런 밥상을 차려주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친정에서 돌아온 날이면 유독 밥상을 대하는 기분이 달라진다. 친정어머니가 해 주신 그 소담스런 밥상은 아니어도 그런대로 정성껏 차려낸 상에 우리 세 식구 오붓하게 마주대하면 식탁이 가져다주는 작은 행복감에 감사하게 된다. 지금은 배가 고파 고생하는 세상이 아니지만 그래도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다투고 경쟁하는 현실 속에서 그래도 따뜻한 밥상을 마주대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져본다. 남과 비교된 풍요를 따지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 작은 행복에 만족하며 살 줄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 준다.
오늘도 우리 가족은 밥 한 공기씩을 말끔히 비워냈다. 그리고 빈 그릇에는 그만큼의 행복이 담겨진다.
글쓴이 김기숙은 서울시 성동구에 살고 있는 주부이다
아내는 등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시간이면 저마다 주어진 삶을 맞이하기에 바빠 부산을 떨지만 현관문을 빠져나와 열쇠를 잠그는 짤각 소리를 뒤로 하고 온 가족 4명이 자동차에 옹기종기 모여앉음으로써 비로소 맛보게 되는 가족의 느낌은 힘든 일터에서도 힘을 가져다 주는 원동력이 되는 듯싶다.
아내는 결혼하고 나서 집에서 아이를 기르고 내 뒷바라지를 하다 얼마 전 학원강사로 맞벌이 부부 전선에 뛰어들었다. 아이들 밥해 주고 챙기고 개구쟁이 녀석들이 후줄근히 적셔오는 빨래감과 씨름하기도 힘든데 학원에서 늦게 와서 밥 차리고 나서 또다시 공부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사실 그 전에는 집안 일이야 당연히 아내 몫으로 생각했고, 나야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니 가장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자신하고 있었던 터다.
그러나 가족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힘든 일도 마다않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아주 중요하지 않은 약속은 가급적 삼갔고,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집으로 달려가 내가 할 수 있는 집안 일들을 하나씩 찾아 했다. 그러면서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조금씩 깨달았고, 한편으로는 보람도 느꼈다. 나보다 더 늦게 퇴근할 아내를 기다리면서 가족의 애틋함도 알게 되었고, 아내에게 고마움을 자주 표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생활한 지 어느덧 8개월이 되어 가는 어느날, 아내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아내는 그동안 누적된 피로 때문인지 여느 때와는 달리 나약한 마음으로 의지할 곳을 찾는 듯보였다.
“경험이 쌓여가면서 더욱 자신감을 얻으려면 그만큼 더 노력해야 하는 거야. 나도 당신을 보면서 적극성을 갖게 되고 큰 힘을 얻곤 하거든.” 나는 아내의 등을 토닥거려 주었다.
식탁에 앉았던 아내 먼저 일어나 침실로 향했다. 결코 번듯하거나 화려하거나 흔하거나 사치스럽지 않은 나의 아내, 아내의 뒷모습이 먼 곳에서도 빛을 비추고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묶어주는 등대와도 같아 보였다.
글쓴이 신준철은 강원도 춘천시에 살고 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