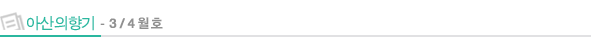|
 재단 사람들
재단 사람들 |
 봄을 맞으며 外 봄을 맞으며 外 |
이경희 外 |
|
|
봄을 맞으며
파릇파릇한 새봄이 우리 새집 문턱을 사알짝 넘어오고 있군요.
창문을 활짝 열어 봄기운을 가득 마시고,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큰 기지개를 켜면서 봄 향기를 느낍니다.
오늘처럼 봄비가 촉촉히 대지를 적시는 날에는 예쁜 새집에 우리의 꿈과 사랑과 행복을 가득 심고 싶어집니다. 지난해 10월 중순 시작한 공사는 도저히 완공할 것 같지 않았고, 어설프기만 했던 공사 현장을 밤늦은 줄 모르고 수없이 오르락내리락 하였습니다. 겨울의 긴긴 밤들을 이마를 서로 맞대고 의논하고, 아침에는 어제 저녁보다 더 나은 결정을 하고 출근하는 꼼꼼한 당신이 계셨기에 우리들의 예쁘고 아름다운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문득 우리 인생도 집짓기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쓸모 있고 아름다운 집을 완성하듯 우리의 인생도 서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 주고, 도우며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멋진 인생의 집이 지어지겠지요. 집을 짓는 동안 우리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많이 생각해 주는 이는 바로 곁에 있는 당신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 집은 기간이 있어 서둘러 완성했지만, 인생의 집은 쉬어 가길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쉬도록 해 주고, 그늘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늘을 주고, 배고파하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면서 차근차근 짓고 싶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살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 때마다 나지막하게 속삭입니다.
“날마다 모든 면에서 나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글쓴이 이경희는 영덕아산병원 임상병리과 이진룡 씨의 아내이다.
처음처럼
처음 중환자실에 발령받아 왔을 때가 생각난다. 학생 때 본의 아니게 중환자실 실습 스케줄이 없었던 터라 내게 중환자실은 낯선 공포로 다가왔다. 출입문을 여는 순간 그리 상쾌하지만은 않은 냄새가 제일 먼저 나의 후각을 자극했고,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여러 개의 수액병들, 여기저기 고요를 깨뜨리는 낯선 의료기기들의 소리는 나의 심장과 모든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항상 긴장을 늦춰서는 안되는 이 곳의 분위기에 적응하는 데는 적잖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고, 혹여 내 작은 부주의로 그들에게 해가 되진 않을까,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올해로 만 3년차, 아직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애송이 간호사다. 그래도 그 3년이란 시간은 내게 환자를 볼 수 있는 눈을 밝혀 줬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가슴을 열어 준 것 같다. 그러고 보니 항상 주기만 했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서 내가 얻은 것도 있으니 그들 또한 내게 고마운 스승이나 다름없다.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그들을 위해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의사라면 최고의 의술로 최선의 처방을 해 주겠지만 간호사로서 내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한 걸음 가까이서 손잡아 주고 바라봐 주고, 살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손길이 아닐까?
얼마 전 수간호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가 우리의 보살핌을 받아 어느 정도 컨디션을 회복하여 각과 병실로, 때론 집으로 옮길 수만 있다면, 비록 완쾌는 아닐지라도 그것이 보람이고 행복이며 우리의 다할 의무라고.
가끔은 마음과는 달리 환자들에게 소홀해지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처음 캡을 쓰고 촛불을 밝혔던 그 마음으로 되돌아가 흐트러진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본다. 늘 처음처럼, 그 마음 유지하길 바라면서.
글쓴이 주봉민은 정읍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고교 시절, 첫 한문 수업에서 배웠던 이 말이 생경하게 떠오르는 요즘이다. 또한, 지금까지 나의 사고를 오랫동안 작용해 왔던 그리 많지 않은 배움 중의 하나였다.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시대가 바뀌었음에 대한 화두가 만연하였고, 개혁이니 보수니 하는 부질없는 ‘이분법’적 용어가 자주 회자되는 요즘의 시대상에서 더욱 되새겨 봄직하다.
6·25 전란 직후 출생한 우리 동년배들은, 전쟁에 수반되는 육체적 고통 등을 직접 체험하지 않아도 되는 기막힌 행운을 타고났으나, 전후의 복구 과정에서 Baby Boomer(자연히 동급생이 많음)로서 빈번한 학칙 및 제도 변화를 필연적으로 체험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한껏 늘어난 사람 수로 인한 불편한 환경, 신·구 사고가 뒤범벅된 불안정한 사회제도로 인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여 자연히 개혁 성향이 강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된 것 같다.
길지 않은 삶을 뒤돌아보건대, 20대, 30대에는 획일주의, 전체주의적 시대 조류가 만연한 소속 사회를 변모시키고자 노력했던 것 같다. 중년이 되어서는 과거의 불편했던 제도나 관습들의 운영 주체인 ‘나의 기성세대’들도 그 나름대로 야무진 논리와 또 다른 개혁 성향 아래 사회제도를 만들었거니 하는 이해심이 생겼고, 청장년기를 지배했던 그 생각이 더 큰 통찰력 없이 섣불리 출발되었으며, 아울러 그릇될 수 있음을 반성하게 되매 많은 자괴심을 갖게 된다.
즉,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온고이지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섣부른 행동이었기에 그러하다.
나라 안팎으로 숨가쁘게 바뀌는 현 상황에서, 개혁이란 용어가 또 다시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주창자 중 깨우침 있는 사람들은, 역시 또 적당한 세월이 지나면 오늘 내가 느낀 그 자괴심을 갖게 되리라 생각하니, 연연세세 실수를 반복하는 미완성의 인간 집단을 부질없이 애써 가르치고자 했던 선인들의 무모한 지혜에 새삼스레 경의를 표하고 싶다.
한편으로, 옛것·예의·효 등 당금의 시대착오적 용어를, 자식들이나 제자들에게 자주 들먹이는 나를 볼 때, 나이 들지 않았나 조심되며, 한 고비 뒤로 물러서서 세상을 관조해야 될 때인지 모르겠다. 어차피 ‘개혁’이란, 있으되 또한 실제로 있지 않은 단순한 말장난일 터이므로.
글쓴이 이문규는 서울아산병원 방사선과 교수이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