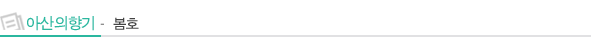|
 아산과 나
아산과 나 |
 아산이 왜 거인이겠는가! 아산이 왜 거인이겠는가! |
김재순 |
|
|
내가 아는 아산 정주영 회장님을 생각하면 한 범인(凡人)이 어떤 거인(巨人)을 안다는 것은 마치 빙산의 한 조각만을 아는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산이 세상을 떠나신 후 수많은 이들이 자기 체험을 드러낼 때마다 아산의 인간관계의 폭을 새삼 알게 된다. 그분들이 이야기해 주는 각자의 기억 속의 아산은 나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 기쁨을 더 크게 하고, 더 깊이 감사하게 하였다. 그렇다! 아산이 왜 거인이겠는가!
아산은 배우는 기쁨을 아는 분이셨다. 자신이 배우는 것을 좋아해서인가, 사회적인 필요에서인가, 모든 이가 다 배울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어 지역사회학교 후원회를 만드시고, 스스로 이사장을 오랫동안 맡으셨다. 아산은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분이셨다. 지역사회학교가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성을 기르는 길이 된다고 믿으시고 행사에는 늘 참여하셨다. 매년 열리는 ‘성가의 밤’에 나오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학교에 못 가고 있는 동네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고, 의무교육에서 빠진 세대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다.
한편, 교육은 특별한 재능을 발굴해서 그것을 키워야 하고, 탁월한 인재를 키울 수 있어야 하며, 세계의 명성 높은 학교들같이 우리 나름대로 영재교육을 하는 학교가 있기를 바라셨다. 인간은 각기 모두 다르게 태어났으므로 개개인의 재능이 사회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도록 가꾸고 기르는 역할을 교육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다. 특히 엘리트는 사회의 지도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아산은 수녀를 좋아하셨다. 나는 ‘종교인’이라기보다 ‘수녀’를 특히 신뢰하고 좋아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단순하다. 수녀가 대개는 ‘사심’에서 자유롭다. 세상 것 아닌 것에 뜻을 두고 투신하면서 평생 그 길을 간다. 직책도 순명으로 받는 것, 인간의 속성의 하나일지도 모르는 명예욕도 수녀들 안에서는 큰일을 하지 못한다. 일을 맡기면 최선을 다하는 게 삶의 일부이다.
아산 정 회장님이 울산 해성병원과 현대 중·고등학교를 지을 계획을 하실 때, 두 기관을 모두 수녀에게 맡기고자 하셨다. 여기저기 내가 아는 수녀원에 모시고 가 소개를 해 드렸다. 모처럼 나도 도와 드릴 것이 있어서 기뻤다. 두 기관 모두 대구 샬트르 바오로 수녀원에서 수녀들을 파견할 수 있어서 다행스러웠다. 그곳에서 일하던 수녀들도 정 회장님이 울산에 오시면 늘 수녀원과 병원에 들러 주셨다는 이야기를 했다.
성심수녀회는 학교 사도직을 주로 하고 있다. 아산 정 회장님은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에 지을 학교를 성심수녀회에서 운영하길 바라셨고, 국제학교, 초등학교까지도 다 지을 예정이셨다. 정 회장님은 세상 눈에는 어리석게 보임을 개의치 않고 사람이 가진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나서는 이 열정을 이해하시는 것 같았다.
국제학교 교장을 맡고 있는 미국인 수녀의 단순함과 명랑함을 좋아하셨다. 훗날 이 수녀가 고한, 사북 탄광촌에서 일할 때는 더욱 좋아하시며 광부 비슷해졌다고 농담까지 하셨다. 말괄량이라고 부르시며 울산 조선소에 첫 배가 완성된 진수식 다음 날 우리들 몇몇 수녀와 또 다른 분들을 초대하셨는데, 이런 초대에 대화가 쉽게 이뤄질 사람들을 모으는 섬세함을 보이셨다. 그래서 그날 울산 영빈관에서 우리들은 참으로 즐거웠다. 거기에다 손수 운전하시는 차로 조선소를 다 구경시켜 주신 회장님의 친절은 우리를 감동시키고도 남았다.
또 한번 아산 정 회장님이 우리를 놀라게 하신 일이 있었다. 세상이 어수선하던 때였는데도 우리는 예정대로 종교교사 연수를 실시하기로 하고 보스톤에 있는 Weston신학대학에서 교수님을 초빙해서 연수와 피정을 하였다. 교수님은 예수회 신부였고 한국 방문은 처음이셨다.
만 8일의 피정 지도와 10일(2주) 동안의 강의가 끝날 즈음, 떠나시기 전에 한국을 알려 드리고 싶었다. 혹시 현대조선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하여 비서실에 청했다. 곧 답이 와서 약속된 날 우리는 한국문화가 찬란했던 경주를 먼저 보여 드리고 울산으로 갔다. 도착해서 들으니 회장님도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었다. 얼마나 놀랐던지…. 신학교수는 지금도 ‘그 대단한 분’ 아산께 극진한 대접을 받은 것을 잊지 않고 계신다.
그날 밤에는 현대 학교에서 일하시는 수녀님들도 초대하여 만찬을 베푸셨다. 울산과 서울을 오갈 때 밤 시간을 이용하신다는 회장님께서 바쁜 일과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그것도 당신에게 아무런 이익도 되돌려 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기대는커녕 상상조차 못한 일을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이 베푸시는지 놀라울 뿐이었다. 돌이켜보면, 아산 정 회장님은 순수하셨기 때문에 어리석도록 순수한 것을 좋아하셨고, 자신이 투신한 일은 끝까지 하시는 분이어서 목적은 달라도 나름대로 자신의 길에서 충실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 것 같다.
1976년 내가 20년 만에 6개월의 안식년을 갖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교육행정을 연수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신 것도 아산 정 회장님이었다. 성심여자대학 재정에서 총장이 그런 비싼 돈을 쓸 수 없다고 아산재단 사무총장에게 의논한 결과였다. 그 동안에 연례행사로 현대와 관련을 가진 회사 간부들을 모두 뉴욕에 초청하시는 자리에 나도 초대해 주셨다. 별로 아는 사람이 없을 테고… 어찌할까 망설였지만 회장님을, 그것도 객지에서 뵈올 수 있는 기회였기에 모든 것을 놓고 나섰다. 일반적인 리셉션 후에 저녁초대까지 해 주시다니….
10여 명 미만, 한 식탁에 둘러앉아 시종 화기애애했다. 내 옆에 앉게 된 분은 회장님을 뵈러 텍사스에서 오신 미국인이었다. 6.25 때 부산에서 군 복무를 했고, 그때 회장님이 미군 내의 건설사업을 하셨을 때 맺은 인연이라며, 정 회장님이 미국에 오실 때는 뉴욕이든 샌프란시스코든 불러 주셔서 뵈러 온다고 했다. 내 마음 깊숙이 ‘그러면 그렇지!’ 하고 울리는 반향과 기쁨을 느꼈다. 참으로 큰 사람은 짧은 시간의 만남이 지속적인 친교로 의로움에까지 이어지는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것인가!
나는 그 분이 낙관적이신 데 감탄했고, 얘기하시는 것을 들으면 희망을 갖게 되곤 했다. 특히 ‘하면 된다’는 그분의 확신은 나에게 힘을 주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