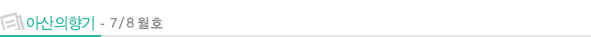|
 향기로운 세상
향기로운 세상 |
 초전 섬유 퀼트 박물관 설립자 김순희 회장 초전 섬유 퀼트 박물관 설립자 김순희 회장 |
고선희 |
|
|
여인들의 삶, 바느질
“바느질은 우리 어머니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자기를 찾는 시간’이었답니다.”
가난했던 시절, 하루 종일 손에서 일거릴 놓지 못하던 여인들, 혼인하는 순간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만 살아야 했던 여인들에게 깊은 밤, 홀로 짓는 바느질은 한을 푸는 행위였으며, 자신만의 유일한 세계를 갖는 의미였을 것이다. 바느질. 그 속에는 양말 속에 알전등을 넣어 기워 신던 어린 시절 우리네 모습이 있으며, 우리네 어머니를 닮은 소박함과 살뜰함도 있다. 또한 자투리 천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한 귀퉁이에 장식을 더할 줄 아는 우리네 여인들의 삶의 여유와 해학도 있다. 바느질은 여인들의 철학을 담는 그릇이며 인고의 삶 그 자체이다. 아니, 이었다. 누구나 할 줄 알았던 바느질을 요즈음은 몇몇 사람만 하게 되면서 단추 하나 다는 것도 세탁소에 맡기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보(褓)의 아름다움
“아주 평범한 여인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조각보의 아름다움은 때론 현대 서양 화가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세련됨으로, 때론 시골 아낙의 투박한 너그러움으로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지요.”
‘복을 싸둔다’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 보자기에는 다양한 아름다움과 철학이 녹아들어 있다.
‘함보’에서 보이는 정사각형 모양의 조각에서 부정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허용하지 않아 혼례를 신성하게 여겼던 옛 선인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으며, 정도를 걷는 기품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자투리 천을 모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든 ‘이불보’며 ‘상보’ 등에서는 평민들의 질박한 삶과 낙천적인 성격을 엿볼 수 있으며, 여기에 자수를 넣어 아름다움까지 더한 그들의 감각을 느낄 수 있다. 드물게 나타나는 마루모양의 보자기와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끈 달린 보자기, 정사각 조각마다 공들여 수를 놓은 보자기 등은 그녀가 아끼는 보자기들이다.
독립운동가 오세창 선생의 며느님께서 따님 시집갈 때 지으셨다는 이불보에서는 딸을 위한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 딸에 대한 대견함과 고마움 등이 묻어나 보인다. 가난한 살림에 여기 저기 삯바느질하시다 남은 천들을 모아 만든 듯, 무늬가 있는 천들이 군데군데 있는 것을 보면서 코끝이 찡해졌다. 이렇게 보자기에는 세월과 함께 삶의 애환과 여러 가지 상징들, 철학들이 묻어 있다.
“외국에서는 이미 예술품의 하나로 귀중하게 다뤄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보자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전통을 지켜나가겠다고 여러 분야에서 복원 사업이다, 뭐다 해서 야단이다. 그러나 그 옛날부터 여인들의 일은 남자들의 대의에 밀려 사소하고 가치 없는 것이 되어 왔으며, 지금이라고 별반 나아진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것은 진흙 속에서도 빛을 발하기 마련이다. 누군가는 여인들의 사소한 일상 속에 담긴 그 가치를 알아볼 것이고, 심미안과 애정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으리라.
평범한 것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
“어머니들이 바느질하는 모습은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보아오던 것이기에 나이가 있는 남자 분들은 가치 있다는 생각을 못하시겠지요. 그런 분들이 와서 우리 보자기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았으면 하네요.”
초전 섬유 퀼트 박물관 설립자 김순희 회장. 그녀는 선진 문물이라며 서양 것을 받아들이고 또 공부했던 시절부터 우리네 생활의 일부였던 보자기와 누비옷 등에 담긴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세계에 알리고자 한 길을 걸어온 여성이다.
“내가 남들보다 많이 보아오고, 그래도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35년 열정은 우리나라 최초의 퀼트 박물관을 열게 만들었으며, 이것은 남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녀의 ‘선생’으로서의 의지였다. 지금도 그녀는 박물관 1층에서 퀼트를 가르치고 있다. ‘퀼트’라 하여 유럽의 문화로 오인할 수도 있겠지만, 그녀는 우리 것의 세계화를 위해 ‘누빈다’라는 말보다 국제적으로 이미 쓰고 있는 ‘퀼트’라는 단어를 고심 끝에 선택하였다고 한다.
남산 자락의, 제법 굵직한 나무가 좋았던, 정원이 있는 집. 그러나 90년대에도 연탄을 때던 낡은 일본식 건물. 1998년 10월. 그녀가, 살던 집을 개조해 홀로 어렵게 박물관을 열었을 때만 해도 주변에서는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라며 만류도 하였지만, 그녀는 자신의 세대가 아니면 정확하게 알리고 전할 만한 세대가 없다고 하여 끝끝내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박물관에는 그녀 평생의 삶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전시관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세계 민속 의상을 입고 있는 다양한 인형들에서 몇십 년은 걸쳐 모았을 그녀의 정성과 신념을 누구라도 쉽게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전시관에 국보(國寶)처럼 고이 소장되어 있는 보자기들을 대하다 보면 이 세상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애정 어린 순수, 그 자체였던 그녀의 삶이 겹쳐 보이기 때문이다.
그녀의 보자기에 대한 사랑은 젊은이들의 사랑처럼 정열적이며, 황혼의 노부부처럼 진중하고, 어머니의 사랑처럼 은근하고 강하다. 그러기에 한 작품 한 작품 소개하는 손길과 눈길에서, 보는 이까지 보자기를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 느껴지는 것이리라. 그녀에게는 할머니들이 들고 다니는 낡은 보자기 하나도 소홀히 넘기지 않는 세심함이 있으며, 세계의 쟁쟁한 작품들을 모이게 하는 카리스마가 있다. 그리하여 지금은 한 해에도 굵직굵직한 전시회를 몇 번이나 가지는, 세계가 주시하는 박물관이 되었다. 내년에는 세계 박물관 총회인 ‘ICOM’도 개최해야 하므로, 이제는 그야말로 생동하는 박물관이 된 것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인정받은 작가들이 선생으로 모시고 기꺼이 작품을 기증하는 모습에서 그녀의 그간 노력이 값진 것이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세계가 감탄하는 아름다움의 경쟁력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이기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 천의 종류가 다양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바느질법이 어머니에게서 딸로 이어질 수 있었다. 면으로만 누비는 외국인들에게 계절에 따라 갑사와 숙고사, 모시와 삼베, 공단과 명주 등 다양한 천으로 그 고유의 멋을 잘 살린 우리나라의 작품들은 그야말로 ‘원더풀’한 것이리라. 그 중에서도 안과 겉이 똑같은 깨끼 바느질법은 세계인이 가장 감탄하는 솜씨라고 한다. 또한 천에 아름다움을 더하는 색도 다양하여, 같은 파랑이라도 그 농도며 색감에 오묘한 차이를 드러내어 어느 하나 같은 것이 없으며, 자연스러운 멋을 더하는데, 이것은 치자, 홍화, 쪽, 쑥, 콩 등 그 소재를 자연에서 구했던 우리 민족의 자연 친화적인 성격이 그대로 천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복 소매 끝단을 자르다 남은 천 등을 모아 이어 만든 우리의 보자기. 그 속에는 여염집 아낙네의, 밤을 지새우는 생에 대한 강인함이 있으며, 작은 천 하나도 꼼꼼하게 잇는 정교한 솜씨의 장인 정신이 있다. 또한 절묘하게 색을 선택할 줄 아는 예술적 본능이 있으며, 그것은 지금도 세계가 놀라는 아름다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초전(草田), ‘풀밭’이라는 이름이 그녀와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남산 자락을 내려왔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자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고, 알아서 애정을 갖고 지켜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글쓴이 고선희는 아산장학생 동문으로 국어 교사이다. 언젠가 멋진 드라마로 세상을 감동시킬 꿈을 꾸고 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