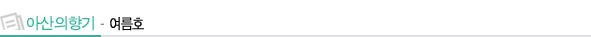|
 여름의 소리
여름의 소리 |
 여름 산의 본처 기질 여름 산의 본처 기질 |
이창기 |
|
|
나는 여름 산이다. 어쩌다보니 그렇게 불리게 됐다. 경기도 남쪽 들녘에서 모씨네 선산을 끼고 있는 덕에 간신히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는, 편하게 말해서 마을 뒷산이다. 바라보고 즐기는 자가 모든 강산풍월의 주인이듯, 내 주인이란 작자도 한가롭기 이를 데 없다. 명색이 시인인데, 무슨 연고인지 한 십년 전에 식솔을 끌고 이 고을로 굴러 들어와서는 밭농사고 글농사고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세월을 죽이는 것이 시절이 나빠 쫓겨나긴 했지만 곧 선계로 돌아갈 약조라도 받아놓은 출향 신선의 품새다.
아무튼 이 돼먹지 않은 주인은 날 바라보기를 부르지 않았는데도 안색이나 살피며 하명을 기다리는 충직한 하인 여기듯 한다. 이 자가 자주 읊조리는 시구에 따르면, 올해도 가는 봄을 잡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나마 복사꽃 핑계 삼아 간혹 만나고 싶었던 시인 묵객들에게 기별해 뒷동산에서 시회를 가진 것이 작은 위안이라고 떠벌이지만, 탄식하는 흥부 마누라를 닮은 주인댁의 지청구를 감내하고 속내를 말하면, 그날 늦도록 고분하게 앉아 처연하게 대금을 불어주던 한 앳된 처자의 옆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을 쓸어내리고 있는 것이다.
여름 산의 처지란 이런 것이다. 지나간 봄을 대하던 첫사랑 같은 아쉬움이나 애틋함은 간데없고 제법 상쾌한 골바람이 겨드랑이를 무시로 드나들어도 창이란 창은 다 활짝 열어 놓은 채 훌쩍 돌아눕는 것이 고작이고, 부지런히 키운 초록으로 산야와 식탁을 풍성하게 차려주어도 그저 야들야들한 봄나물의 상큼한 맛만을 추켜세우며 찬물만 들이켜 대는 것이다. 뭐 내 탓이 전연 없다는 말은 아니다. 이상하게 두견새 우는 신록이 잠시 머물다 가면 가뭄 끝 단비를 조금 들이켰을 뿐인데 금세 건장한 아줌마처럼 풍성해지고, 게다가 웬 식욕은 그리 솟구치는지….
그러나 언젠가 이 바람 든 내 주인도 내 품 안에서 흐뭇한 눈웃음을 던질 날이 오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어느 날 무더위를 피해 내가 드리운 웅숭깊은 골짜기 속으로 한 발자국 내딛는 순간, 산책 나온 정령들의 귀가 시간을 알리는 산새 소리며, 죽은 영혼들이 귀를 씻는 시냇물 소리, 나뭇잎 배를 띄우는 댓바람 소리, 오동잎에 이슬방울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 남은 취기마저 앗아가는 솔바람 소리에 그만 마음이 아뜩해질 것이다. 그런 달 밝고 선선한 여름밤에, 반주 몇 잔에 취해 마당 평상에 비스듬히 누워 한 때 서운했던 진득한 사랑 이야기를 함께 나누지 못한다면, 누가 그에게 처복이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단 말인가.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