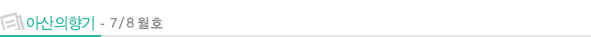|
 테마
테마 |
 "한글은 그래픽(graphic) 하다" "한글은 그래픽(graphic) 하다" |
안상수 |
|
|
‘그래픽하다’라는 말
“한글은 그래픽 하다.” 서울에 와서 한글을 처음 본 외국의 유명 디자이너가 한 말이다. 우리는 그래픽이라는 말을 그래픽 디자이너라든가 컴퓨터그래픽 등에 쓰고 있다. ‘그래픽’이라는 말은 영어에서 인쇄를 매개로 한 표현을 가리키는 말이다. 나아가 그것을 시각적으로 매력이 있는, 또는 시각적으로 디자인된 느낌을 나타내는 말로 둘러 쓰이기도 한다. ‘그래픽하다’라는 말, 그냥 어렴풋 이미지로 머리에는 오는데 사실 글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추측컨대 ‘디자인스럽다’거나 ‘인위적인 디자인의 냄새가 짙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고전적이 아닌 현대적인, 서예 작품인 것보다는 인쇄용으로 디자인된 듯한 느낌. 어쩌면 활자스러운 그래픽 디자인 작품 같은…, 그가 얘기한 ‘그래픽하다’라는 말은 이러한 느낌을 통틀어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었을까? 나는 이 말이 그 후에도 계속 생각이 났다. 혹 이 말에 한글의 아름다움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다름’의 생각
본디 한글의 태생은 기하적인 모습이었다. 유려한 곡선과 붓의 흐름으로 이루어진 한자의 조형과는 사뭇 ‘다른’ 대조적인 것이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박혀 있는 한글꼴은 한자에 비해 그야말로 도발적이기까지 한 ‘당돌함’ 그 자체였던 것이다.
훈민정음 첫머리에 등장하는 ‘다르다(異)’는 말은 그대로 한글 형태에 이어져 모습을 이루었다. 우리 말이 중국말과 다르기에 글자도 당연히 달라야 한다는 발상이 한글을 만들어내는 생각의 씨앗이었다. 바로 이 ‘다름’을 인식했던 일, 코페르니쿠스 같은 큰 발견이었고 깨달음이었다. 모든 것은 이 ‘다름’에서 비롯되는 바, 그 누가 이 ‘다름’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었으랴. 한글 태생의 단순한 선, 바로 기하적 가로, 세로선과 사선, 곡선은 ‘다름’의 생각에서 나온, 한자와는 다르다는 생각에서 나온 아름다운 꽃이었다.
그가 본 것은 바탕체 글자꼴이었다. 바탕체의 꼴은 곡선적이다. 붓이라는 필기도구는 기하적 돋움꼴을 유려하게 바꾸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래픽하다고 말했던 것은 그 태생이 읽혀지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바탕체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은 버선코나 기와집 지붕의 처마선을 연상하게 만드는 묘한 곡선으로 되어 있다. 영문의 글자는 마치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을 연상케 하는 선이 그 속에 숨어 있다. 바로 글자꼴에는 그 글자를 쓰는 민족의 오래된 미감이 켜켜이 집적되어 있는 것이다. 그는 바로 붓의 흐름에 의한 한글의 다듬어진 오늘의 형태 속에서 다른 글자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래픽적이고 디자인적인 아름다움을 느꼈다는 것이리라.
당돌하고 묘한
나는 최근 일 년 중국에서 살다 왔다. 한자 나라 중국에서 일 년을 지난 느낌에 대해 나는 ‘한자에 흠씬 두드려 맞고 왔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서안의 비림(碑林)을 돌아보며 한자의 아름다움에 도취되기도 했다. 거대한 땅 중국은 바로 한자 제국이었다.
그러나 중국 생활 내내 계속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한글의 ‘대단함’이었고, 여행을 하면 할수록 한글은 우리 민족의 가장 독창적 문화유산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600여 년 전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우리의 글자 생활은 그야말로 말과 글이 따로 노는 이상한 체제였을 것이다. 더욱이 한자란 극히 제한된 일부 상류층 양반, 궁궐, 관아 등에서만 쓰이는, 일반 백성은 가까이 하기 힘든 그저 권력만을 느끼게 하는 웃나라의 기호로 보였을 것이다.
한자밖에 없는, 또 한자밖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캄캄함 속에서 한글이라는 당돌하고 묘한 글자는 탄생되었다. 그것은 붓을 의식하지도 않았으며, 가로 세로의 직선 그리고 사선, 동그라미의 기하적 형태로만 되어 있었다. 기하적인 선이란 바로 인공적인 선이다. 사실 글자란 사람이 만들어낸 발명품 중 가장 형이상학적 작품일 것. 그러나 이 인류 누구도 글자를 의도적으로 발명하여 성공한 것이 거의 없다. 그에 비해 한글은 세종 임금이라는 한 역사적 인물이 용의주도하게 만들어낸 디자인 작품이었다. 어디 이러한 것이 있을까? 나는 그 외국인 디자이너가 바로 그것을 전문가적 직관력으로 ‘그래픽하다’라고 꿰뚫어 보고 그 담대한 아름다움에 감응했던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가 느꼈던 한글의 아름다움이란 바로 먼 역사의 깊은 곳에서부터 온 우리 민족의 미감이 단순화되고 구체화된 총화의 아름다움이었을 것이다.
글쓴이 안상수는 시각디자이너이며,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이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