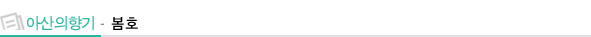|
 아산의 향기가 안내하는 세상
아산의 향기가 안내하는 세상 |
 '사랑의 공부방' 아이들이 만난 옛길의 세계 '사랑의 공부방' 아이들이 만난 옛길의 세계 |
박미경 |
|
|
새봄이다. 사철 가운데 봄에만 유독 ‘새’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은, 기나긴 겨울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돌아온 이 계절이 그만큼 반갑기 때문일 것이다. 충주 미륵리와 문경 관음리 사이로 ‘하늘재’라는 옛길이 열린 지 1800여 년. 이천 번이 가깝도록 어김없이 찾아오건만, 옛길 위의 봄은 여전히 눈물나게 반가운 ‘새봄’이다.
그토록 오랜 옛날에도 이 길에서 새봄을 맞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아이들은 아직 알지 못한다. 서울 강북구 번 3동에 있는 방과 후 교실 ‘사랑의 공부방’에서 함께 놀고 함께 공부하는 예린이(12) 하은이(12) 소연이(12) 성화(13) 규빈이(13). 새봄보다는 새 학급과 새 짝꿍에 더 마음이 쓰일 나이의 다섯 아이는 곧 옛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보다 모처럼 먼 길을 떠나왔다는 것이 그저 신나고 즐거울 뿐이다. 급할 것은 없다. 옛길이란 간단하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오랜 세월 ‘몸’으로 옛길을 만나온 안치운 씨(49)는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다.
연극평론가로 활동 중인 안치운 씨가 옛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정치적으로 암울했던 대학시절. 상처 난 마음을 안고 산에 오르면 거기에는 어김없이 희미한 옛길이 있었다. 그 길에서 손수 집을 짓고 손수 먹을거리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화전민들을 만날 수 있었고, ‘자연과 하나로 살아가는 그들’의 가난하지만 빛나는 삶을 엿볼 수 있었다. 절대로 뿌리 뽑히지 않을 강한 생명력으로, 자신의 병든 마음을 치유해주던 사람들. 그들을 알게 되면서다. 마음 안에 불안이나 절망 따위가 깃들면, 쓸모 잃어 희미해진 옛길을 그는 걷고 또 걸었다.
그 고마운 옛길이 하나 둘 사라져간다. 그것이 그를 아프게 한다. 대학교수(호서대학교 디지털 문화예술학부)인 안치운 씨에게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이즈음이 가장 바쁠 무렵. 그럼에도 그가 선뜻 아이들과의 동행에 나선 것은, 옛길의 소중함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봄을 시샘하던 추위가 오늘은 한풀 꺾여있다. 서울에서 충주까지 차로 두 시간이 넘게 달려온 옛길 입구(충주시 미륵리)에 선 아이들의 표정은 한없이 밝다. “하늘이 어쩜 저렇게 파래요? 구름도 한 점 없고.” 소연이의 감탄에 하은이가 화답한다. “저 개울물 좀 봐. 꼭 거울 같아.” 파란 하늘도 맑은 개울물도 가져보지 못한 서울 아이들에게, 이곳은 너무 쉽게 천국이 된다. 인솔교사인 최윤정 씨(25)도 한껏 신이 나있다. 아이들이 좋아 첫 직장으로 ‘사랑의 공부방’을 택한 그에게도 옛길은 처음이다.
이제부턴 두 시간 가까운 옛길 산행. 힘들지 않겠느냐고 물으니, 만화가가 꿈인 예린이가 냉큼 대답한다. “만화에서 봤어요. 과거시험 보러갈 때 이런 산길을 걷더라고요. 며칠씩 걷던데, 우린 몇 시간 걷는 거잖아요?”
드디어 출발이다. 가장 먼저 맞아주는 건 코를 찔러오는 솔향기다. 키 큰 소나무들 사이로 빗금처럼 쏟아지는 오후 햇살. 코와 눈이 열리고 나니 이번에는 귀가 열린다. 소리가 제각각인 산새들의 합창이 여간 근사하지 않다. 비포장 흙길에 발의 감각도 이내 깨어난다. 군데군데 울퉁불퉁한 돌들이 깔려 있어, 한 발 한 발 내딛는 행위 그 자체에 몰입할 수밖에 없다. 오감을 깨우는 ‘알람’이 한꺼번에 울리는 곳. 옛길이란 무릇 이런 곳일 터이다.
“자, 우리 퀴즈 맞추면서 갈까?” 안치운 씨 말에 아이들이 귀를 쫑긋 세운다. “누가 제일 먼저 길을 만들었을까?” “사람이요.” “틀렸어.” “동물이요.” “그래 맞아. 동물들은 사람보다 섬세한 감각을 타고 났어. 걔들이 가장 먼저 길을 만들고 사람들은 그 다음에 만들었지. 아저씨 경험으로 보면, 동물 발자국을 따라가면 그 길은 안전해.”
겨우 십여 분을 걸었을 뿐인데 아이들은 금세 길에 매료돼 간다. “선생님, 이게 갈대예요?” 억새를 보며 묻기도 하고, 버들강아지를 만져보며 웃기도 한다. 길 그 자체가 자연인, 옛길의 힘이다.
“자, 그럼 두 번째 퀴즈.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길은 뭘까? 다 올라갈 때까지 고민해봐. 답은 고갯마루에 올라가면 얘기해주지.” 호기심 왕성한 아이들에게 궁금증만 잔뜩 남겨놓고, 안치운 씨가 돌연 속도를 낸다. 궁금증이 컸던 탓일까, 아이들도 덩달아 걸음이 빨라진다. 그러기를 한참. 함께 걷는 일의 행복을 알아갈 때쯤, 나무에 가려져 제대로 보이지 않던 하늘이 온전히 제 모습을 드러낸다. 고갯마루다.
고갯마루를 사이에 두고, 저쪽은 조선 도공의 땅 문경 관음리. 여태 걸어온 길과는 달리 하늘재의 남은 반쪽은 시멘트로 포장이 돼 있다. 숱한 옛길들이 포장이라는 ‘횡포’아래 사라져가는 지금, 반이라도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음에 감사해야 할까. 선생의 얼굴엔 그늘이 가득한데, 아이들은 느티나무 아래 앉아 종달새처럼 지저귄다.
“선생님. 정상에 오르면 아까 그 답 알려주신댔잖아요?” “아참. 아까 내가 가장 오래된 길이 뭐냐고 물었지? 답은 ‘하늘의 별’이야. 등대도 나침반도 없던 시절에 어부들은 무엇을 보며 배를 저었을까? 별이야말로 어둠 속에서 사람을 인도해주는 최초의 길이었던 거지. 퀴즈는 이것으로 끝이고,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야. 우리가 함께 오른 이 길은 생긴 지 이천 년이 다 돼가는 길이거든. 한 번 생각해봐. 너희들의 발자국 밑엔 그 엄청난 시간 동안 이 길을 걸어 다닌 사람들의 발자국이 있었던 거야. 옛 사람들이 다닌 그 발자국 위로 너희들의 발자국이 포개진 거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과 걸음이 포개져 있는 옛길을 우리가 쉽게 잊어선 안 된다고 생각해. 오래된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가능하면 버리지 않는 것, 아저씨는 오늘 그걸 얘기하고 싶어.”
몇 녀석은 ‘옛 사람들과 발을 포개며 걸어온’ 자신의 발을 내려다본다. 먼 훗날 아이들의 머리는 이 길을 잊어도, 발은 기억할지 모른다. 때론 몸의 기억이, 마음의 기억보다 강한 까닭이다.
다시 돌아온 옛길 입구. 넘치도록 씩씩하게 옛길을 걸어준 아이들을 향해 안치운 씨가 한 자락 농담을 건넨다. “니들 몸 다 풀렸지? 자, 그럼 이제부턴 저 바위를 넘는 거야. 어때?” 아이들의 대답이 걸작이다. “우리 진짜로 가요. 네?” 동시에 터진 웃음이 다시 재를 넘는다. 가던 해가 놀라 살짝 뒤돌아본다.
*<아산의 향기>는 소외 어린이, 청소년들의 문화·역사현장 체험을 안내합니다. 신청 및 문의 <아산의 향기> 편집실 (02) 3010-2582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