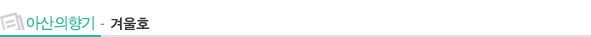|
 아산의 향기가 안내하는 세상
아산의 향기가 안내하는 세상 |
 "칼과 도마도 악기가 될 수 있네" "칼과 도마도 악기가 될 수 있네" |
박미경 |
|
|
큰일이다. 아침부터 흩날리던 눈발은 그예 빗줄기로 변해, 서울 시내를 온통 교통지옥으로 만들어버렸다. 공연 시작 30분 전. ‘정동길’ 입구에서 만나기로 한 아이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 버스에서 내린 뒤, 이제야 겨우 지하철로 갈아탔음을 전화로 알려온다. 데리러 가야 했을까. 아니다. 오늘 같은 날 신내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상봉동에서 난타 전용관이 있는 이곳 정동까지 차를 몬다는 것은, 제 시간에 도착할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 낮음을 의미한다.
그나마 고마운 것은 이곳 정동길이 도심에서 계절을 느낄 수 있는 ‘낭만’의 길이라는 것. 은행잎이 이불처럼 덮인 길 위에서, 돌담이 연인처럼 어깨를 둘러오는 거리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기분이 썩 괜찮다. 가을은 어느새 저만치 가버렸는가. 겨울은 또 언제 이렇게 와버렸는가. 가고 오는 계절에 취해 한참을 서 있는데, 저기 아이들이 온다. 10년 만의 해후가 이보다 반가울까. 승연이(13), 호연이(11), 윤주(11), 부형이(11), 진우(12). 오늘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다섯 아이들을 향한 반가움이 강물 되어 가슴을 적신다. 적당한 기다림은 늘 이렇게, 서로의 마음으로 가는 길을 단축시킨다.
공연장은 ‘호기심천국’
5분 지각이다. 닫힌 공연장 문을 밀고 들어가기가 조금 멋쩍다. 고맙게도 난타전용관 하우스매니저인 권혜영 씨가 웃음으로 아이들을 맞아준다. 더듬더듬 도우미들의 안내를 받으며 공연장에 들어서니, 폭발적인 리듬이 다짜고짜 귓전을 울린다. 어둠에 갇힌 눈은 아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소리로 열린 귀는 벌써 오늘 공연에 대한 기대로 한껏 부풀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난타>는 사물놀이에서 빌려온 리듬과 비트로,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코믹하게 드라마화한 비언어 연극이다. 굳이 ‘우리 것의 소중함’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사물 리듬은 우리 모두의 귀에 쉽게 감겨오는 익숙한 소리다.
“저 배우들, 다른 나라 사람들인가요? 한국말로 안하고 왜 저런 소리를 내요?” 호기심 많은 호연이가 귓속말로 묻는다. 각종 물건을 두드리는 소리와 국적 불명의 의성어 몇 마디가 대사의 전부인 이상한 연극. 아이가 그런 의문을 품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대사가 없는 연극이라는 걸 귓속말로 알려주니, 이번에는 그에 못잖은 호기심을 가진 부형이가 묻는다. “저 시계 실제로 가는 건가요?” 무대 위 오른쪽에 걸려 있는 시계가 그냥 소품인지 진짜로 가는 시계인지를 묻는 것이다. 확실히 알 수 없어 대답을 미루고 있는데, 녀석 스스로 이내 답을 구한다. “어, 시계바늘이 5분이나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윤주다. “저 사람들 요리도 진짜로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별로 궁금해 하지 않는 것들을 쉴 새 없이 묻고 또 묻는 아이들. 녀석들의 왕성한 호기심을 마주하노라니, 궁금한 것이 별로 없는 ‘어른으로서의 오늘’이 불현듯 슬픔으로 다가온다.
무대는 우리가 익숙하게 생활하는 부엌. 주인공은 사람이라기보다 이곳에서 나는 ‘소리’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 국자나 주걱이 서로 부딪는 소리, 채소를 볶을 때 나는 소리와 주전자 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 이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부엌이라는 익숙한 공간이 다양한 리듬과 소리를 빚어내는 창조적 공간임을 새로이 깨닫게 된다. 들려오는 소리는 그것만이 아니다. 배우들의 우스꽝스런 몸짓 하나하나에 공연장이 떠나가라 웃는 관객들. 그들의 웃음과 박수야말로 이 공연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소리의 하나다. 누구보다 먼저 웃고 누구보다 크게 박수치는 다섯 아이들이, 오늘 공연 최고의 관객이자 주인공임은 물론이다.
요리사들이 수십 개의 접시를 빠르게 주고받는 장면에서 아이들이 돌연 조용해진다. 손발이 척척 들어맞을 때까지 저들은 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습의 이름으로 함께한 걸까. 배우들의 환상호흡을 모두들 숨죽이며 지켜보는데, 안타깝게도 한 개의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진다. “와, 하나밖에 안 떨어뜨렸다.” 배우들의 실수를 바라보며 부형이가 내뱉은 한 마디다. 한 번의 실수보다 수십 번의 성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이의 눈이,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 보인다.
어느덧 공연 막바지. 고무 대야와 기름통 따위를 두드리는 다섯 배우들의 힘찬 연주가 다섯 아이들의 가슴을 사정없이 난타한다. 이럴 땐 함께 발을 구르고 함께 손뼉을 치는 것이 제격. 귀와 눈은 배우들에게 내주고 손과 발은 자신을 위해 움직이면서, 모두들 하나가 된다. 한 시간 반의 공연이 그렇게 끝나고 어둡던 객석 위로 불이 켜진다. “벌써 끝난 거예요?” 승연이가 묻는다. 발개진 뺨 위에 방금 받은 감동이 고스란하다.
언젠가 그리움으로 떠오를 오늘
“주방도구들도 악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마지막에 들려준 드럼연주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윤주와 진우가 각자의 느낌을 들려주는 사이, 오늘의 출연 배우들이 아이들 곁으로 온다. 다음 공연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기념촬영을 흔쾌히 허락해준 배우들. 조금 전까지 무대 위에서 온갖 열정을 뽐내던 그들이 지금 여기, 자신의 옆에 서있다는 사실에 아이들은 못내 상기된 표정들이다.
배우들과 헤어져 밖으로 나오니 그새 어둠이 내려있다. 이곳부터 저녁식사를 예약해둔 식당까지는 공연시작 전 부랴부랴 달려오느라 미처 그 운치를 느끼게 해주지 못한 ‘정동길’을 걸어야 한다. 해가 이미 졌으니 고풍스런 근대 건축물을 보여주기는 이미 글렀다. 하지만 길의 아름다움이 어디 낮 동안에만 효력을 발휘하던가. 불 꺼진 건물들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가로등에 비친 ‘은행나무 카펫’은 그 자체로 충분히 눈부시다. 멋지지 않으냐고 아이들에게 묻지만, 녀석들은 정작 시큰둥한 반응들이다. 하긴, 길의 멋스러움이나 계절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기엔 아직 너무 이른 나이다.
하지만 바이러스처럼 잠복해 있다가 훗날 녀석들이 어른이 됐을 때 제 진가를 발휘할 것이다. 오늘 본 공연의 감동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아이들을 초대해준 PMC프로덕션 송승환 대표의 현재가 바로 ‘어린 시절 본 공연의 감동’에서 비롯되었듯이.
아무려나, 앞으로 한 동안은 부엌살림깨나 두드려댈 녀석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공연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바람이 찬데도 마음은 점점 따뜻해진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