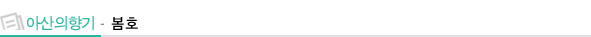|
 봄편지
봄편지 |
 나의 '꽃 출석부' 나의 '꽃 출석부' |
박완서 |
|
|
내 머리 속에는 우리 마당에 있는 꽃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점검하는 꽃 출석부가 있다. 올봄에도 제일 먼저 복수초(福壽草)가 그 샛노란 모습을 드러냈다. 해마다 복수초는 내 꽃 출석부에서 일등 자리를 놓친 적이 없다.
몇 해 전에는 복수초가 필 무렵에 폭설이 내린 적이 있다. 흙 속에서 꽃대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꽃이 곧장 땅바닥에 붙어서 피어버리는 꽃이기 때문에 눈이나 녹아야 필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날 눈 위에 여기 저기 오백원짜리 동전만한 구멍이 뚫렸기에 들여다보니 복수초가 피어 있는 게 아닌가. 눈 속에 피어 있는 복수초를 사진으로는 본 적은 있어도 내 집 마당에서 보기는 처음이었다.
복수초에는 인간의 체온처럼 눈을 녹일 수 있는 온기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햇님이 눈 속에서 열심히 꼼지작거리는 작은 꽃의 몸부림을 가상하게 여겨 그 머리 위에 특별히 따순 햇볕을 내리쬔 것일까. 복수초는 꽃대 없이 흙에서 직접 피기 때문에 아마 우리 산야에 피는 꽃 중에서 제일 키가 작은 꽃일 것이다. 그런 작은 꽃이 저 높은 곳에 있는 위대한 태양과 가장 잘 통한다는 건 얼마나 신비한 노릇인가.
올해는 복수초 필 무렵에 눈은 안 왔지만 꽃샘추위도 만만치 않았는데도 어김없이 일등으로 찾아온 복수초를 반기며 들여다보고 있으려니 나보다 먼저 온 방문객들이 수월찮았다. 어디서 겨울을 났는지 비실비실 잘 날지도 못하는 벌들이 꽃송이마다 한두 마리씩 들어앉아 정신없이 꿀을 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저 허기진 미물들이 굶어 죽기 전에 살려내려고 복수초는 그렇게 일찍 핀 것일까. 대자연 속에 숨은 생명의 연결고리에 절로 숙연해지면서 나에게도 어디선가 반가운 소식이 올 것 같은 예감으로 마음이 설레었다.
해마다 복수초가 지고 나면 나에게 오라오라, 부르는 소리가 있다. 그건 섬진강변의 매화 동산이다. 매해 매화 동산의 꽃 소식을 전해주는 것은 평생 그곳을 못 벗어나고 아니, 안 벗어나고 그 언저리에서 시 쓰고, 그곳 대학에서 가르치며 그 일대의 굽이굽이, 골짜기 골짜기를 사랑하며, 누구보다도 시인답게 나이 들어가는 K시인이다. 아직 복수초가 한창 피어있는 걸로 봐서는 매화 철로는 좀 이르다 싶었는데도 K시인의 한번 다녀가란 소리에 나는 당장 길을 떠났다.
그러나 나를 맞아준 시인은 매화 동산에 꽃이 피려면 닷새는 더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맛있는 것만 잔뜩 사주었다. 그곳 청정 바다에서 잡은 새조개 맛은 일품이었지만 나를 오라오라 한 것은 분명 매화 향이었거늘, 하는 생각 때문에 헛걸음 한 것처럼 섭섭했다. 그러나 K시인이 누구인가? 나를 위해 그 바쁜 사람이 이틀씩이나 비워놓았다고 했는데 남을 헛걸음시키자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본격적인 매화 철이 되면 매화동산이 시장바닥 같아질 거라며 조촐하게 외롭게 핀 홍매화를 보러 가자고 했다.
시인이 나에게 보여주고 싶어 한 홍매화는 금둔사(金芚寺)라는 고즈넉한 절 경내에 피어있었다. 나는 그때까지 홍매화를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느꼈다. 본 적은 더러 있었을 것이다. 서울에 이름 난 부잣집 정원에서도 주인이 자신 있게 자랑하는 홍매화를 본 적이 있었다. 다만 그렇게 아름답고 기품 있는 홍매화는 처음이었다.
분홍빛이란 자칫하면 촌스럽고, 지나치면 요염하기만 한 법인데 금둔사 홍매화는 고고하고 기품 있고도 요요했다. 나무의 수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멋지고 자유스럽게 가장귀를 뻗은 등걸이 50년은 넘었음직한 나무에서 만개 직전, 그러니까 7부쯤 핀 상태에서 내뿜는 향기는 아마 향기로서는 절정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절 경내에는 홍매화 말고 오래 된 청매화도 몇 그루 있었다. 청매화는 홍매화보다 늦되는지 녹두알 같은 꽃봉오리를 조롱조롱 이슬처럼 달고 있었다. 우리 일행은 홍매화 그늘에 앉아 일어설 줄 몰랐다. 나는 예쁜 꽃나무나 야생화를 보면 꺾거나 갖고 싶은 욕심을 내는 못된 버릇이 있는데 그 홍매화는 꽃잎 하나도 안 건드렸다. 다만 향기가 내 몸에 스미길 바랐다. 그게 꽃 한 송이 꺾는 것보다 더 큰 욕심인지도 모르지만.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