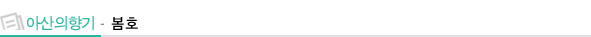|
 그림으로 읽는 세상
그림으로 읽는 세상 |
 "물감으로 이불처럼 세상을 덮겠다"는 화가 사석원 "물감으로 이불처럼 세상을 덮겠다"는 화가 사석원 |
정재숙 |
|
|
화가 사석원 씨(46)를 동료들은 ‘그림 귀신’이라 부른다. 그리고, 또 그리고, 미치도록 그려도 또 그리고 싶다는 그다. 귀신 들린 화가는 물감과 붓을 들고 황홀경에 빠진다. 붓이 지나가며 일으킨 바람에 푸드득 수탉이 뛴다. 제목도 흥취가 난만해서 ‘매화에 놀란 수탉’이다. 봄밤, 흐드러진 매화 자락에 겅중거리는 수탉은 생각만 해도 즐겁다.
‘가을 숲 속의 호랑이’‘꽃을 먹은 양’‘닭을 탄 소녀’‘산을 뚫고 나온 소’…. 화가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가 된 듯 동화 속에서 산다. 그가 그리는 그림 속에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하나다. 사람이고 동물이고, 꽃이고 산이고, 다 통한다. 그의 손에서 형태를 받고 색을 입으면 갓 태어난 아기처럼 싱싱한 뼈대와 생생한 색깔로 빛난다. 바라보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석원 씨의 그림 비법이다.
눈을 빨아들이는 사석원 그림의 비밀은 ‘잘 노는 것’이다. 화가는 신나게 놀고 있다. 고뇌하는 화가가 아니라 즐기는 화가다. 창작의 고통은 캔버스 저 멀리로 날아갔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 순간에만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화가는 “나에게 내일은 없어요”라고 말한다.
동양화를 전공한 사석원 씨가 동양화를 고집하지 않는 이유도 이 자유로운 정신에 있다. 종이에 먹을 쓰건, 캔버스에 유채를 사용하건 표현하고 싶은 주제에 걸맞은 재료요 기법이면 좋다는 생각이다. 동서양의 정신과 도구를 넘나드는 그는 스스로를 ‘그림 그리는 건달’이라 부른다.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림으로 세상을 주유하는 방랑자의 모습이 화가가 즐겨 그리는 동물에 비쳐있다.
화가는 2004년 11월에 연 개인전을 ‘이불처럼 물감으로 세상을 덮는다’라 했다. 통도 크다. 어찌 물감으로 세상을 덮겠는가. 하지만 사석원 씨는 한다. 정말 좋아하니 한다. 그는 처음 내놓은 산 그림에 좀 과장하면 물감을 들이부었다. 캔버스에 바로 짜버린 물감의 빈껍데기가 산을 이뤘다. 하지만 정작 그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 아닐까. 삭막한 이 우주를 이불처럼 따뜻하게 감싸줄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큰마음.
그는 여러 동물과 몇몇 사람과 산과 바다 그림을 내놓은 전시회의 주제를 이렇게 말했다. “세상과 살아있는 것에 대한 찬미, 그리고 자유와 고독 같은 것이다. 어차피 고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니 너무 징징대지 말자. 정 힘들면 해삼 몇 토막에 소주 몇 잔 마시고 드러누워 코 골며 자버리면 될 것 아닌가.”
이 때 이불이 되고 싶다는 화가의 진심이 그림에서 불꽃놀이처럼 터지고 있다. 오늘도 그는 야수처럼 세상을 덮을 이불 같은 그림과 마주하고 있을 것이다. 화폭을 서성거리는 그가 보인다. “한쪽은 먹이를 찾아서, 한쪽은 예술을 찾아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