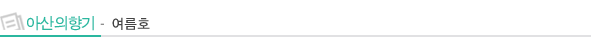|
 그림으로 읽는 세상
그림으로 읽는 세상 |
 싱싱한 생명의 아름다움을 쉽게 싱싱한 생명의 아름다움을 쉽게 |
조우석 |
|
|
얼마 전 문학평론가 이어령 씨를 TV에서 인터뷰하던 사회자의 첫 질문이 좀 별났다. “이어령은 본명입니까, 예명인가요?” 왁 하는 방청객 웃음부터 터졌고, 분위기도 풀렸다고 한다. 생뚱맞기도 하지만 사실 궁금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어령이 그렇듯 화가 김점선(59)도 ‘필명 같은 본명’이다. 그걸 모르고 누가 무릎을 쳤다던가? “야, 멋지다. 점과 선 딱 두 개를 찍어 예명으로 하다니….”
이름부터 화가로 타고 난 김점선을 두고 ‘원조 히피’ ‘여성 조르바’라고들 한다. 나 역시 공감한다. 고백하자면 그는 내게 연구대상이다. 지치지 않고 ‘나, 김점선!’하며 자기 스타일에 충실한 오랜 내공부터가…. 사실 한국사회는 ‘시선의 감옥’이다. 사람들은 그 안의 통조림으로 산다. 그런 따위에 아랑곳도 하지 않는 김점선은 ‘길들여지지 않는 여자’인데, 스스로를 “거칠고 씩씩한 여자” “여성적 매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도 태무심하게 덧붙인다.
그건 자전 이야기를 담은 ‘10cm 예술’(마음산책)에서 털어놓은 얘기인데, 묘하게도 자학이나 자기모멸의 구석이 전혀 없다. (쉿! 그 말은 처녀시절의 김점선이 한 ‘개털’ 이혼남에게 청혼할 때 구사했던 레토릭이다. 그 말로 결혼에 성공했다) 생각해보라. 김점선의 키는 170cm의 큰 키다. 화장기는 전혀 없고 머리도 대충 헝클어져있다. 옷은 ‘약간 정돈된 집시’ 정도이니 약속 차 한 고급호텔에 들어가려다가 보기 좋게 쫓겨난 일도 있다던가?
그럼에도 당당한 화가 김점선은 1983년 첫 개인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개인전을 가졌다. 작품 값도 꽤나 높게 형성됐다는 건 다 알려진 얘기다. 그가 절친하게 지내는 동향 개성 출신의 소설가 박완서를 포함한 고정 팬 층이 넓어 작품도 꽤나 잘 팔린다. 미술계 주류에서 성큼 비켜 서있으면서도 전업작가로 성공한 흔치않은 경우다. 그림? 그건 사람과 똑같다.
오방색을 자신 있게 구사한 시커먼 기와집이 귀기스러운 분위기의 유화 작업에서 “저건 붓이 아니라 마당 빗자루에 물감 묻혀 그렸겠지?”싶을 정도로 터무니없게 씩씩하게 그려진 꽃 그림까지. 화투 패러디 작업도 좋다. 하지만 무엇보다 김점선 스타일은 특히 말(馬) 그림에서 빛난다. 화가로서는 사형선고인 오십견이 온 뒤에도 그는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아들에게 컴퓨터를 배워 ‘디지털 그림’을 창안한 것이다.
혹시 몇 해 전 언뜻 그 컴퓨터 그림을 스쳐서 보셨다고? 그건 잊어라. 요즘에는 고급 기계를 도입해서 독자적인 질감까지를 살려내고 있다. 가로 세로 10cm 내외의 이 컴퓨터 그림도 한 눈에 “아 저거 김점선이네?” 싶다. 본인이 밝힌 작품 활동의 화두란 이렇다. “싱싱한 생명의 아름다움을 쉽게 전달하는 것”.
‘나, 김점선’ ‘10cm예술’ 등 책에서 선보인 특유의 글에 매료됐다는 사람도 주변에 많다. “글을 읽으며 확 트인 해방감부터 들었다.” “남의 시선이나 사회적 통념 따위를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자유인 같다.” 그건 사실이다. 대학시절의 김점선은 ‘물 좀 주소’라고 외친 가수 한대수의 노래를 듣는 순간 대오각성 했다고 고백하지만, 독자들 역시 그의 글을 읽으며 해방감을 맛보는 셈이다. “나는 아류가 좋다. 본류는 버겁다. 일상은 그저 덤덤해야 한다”며 선사(禪師)같은 소리를 퉁퉁 내뱉는 것도 그 아니면 하기 힘든 말이다.
독자적인 단문(短文)을 구사하는 그는 믿거나 말거나 문인, 비문인의 구분을 떠나 가장 뛰어난 우리 시대 문장가의 한 명이라고 나는 확신을 한다. 김점선이라는 ‘괴물’은 알고 보면 엄청 섬세하기도 해서 쉬 상처받고, 숨어서 끙끙 앓는 위인이기도 하다. 당연하다. 그가 작가이니까. 그런 그가 우리 사회에 건재하고 있는 점이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또 아직까지는 김점선이 큰 무리 없이 사회적으로 수용 내지 유통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왜? 그는 우리 사회의 건강지수 혹은 탄력지수의 하나이니까.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