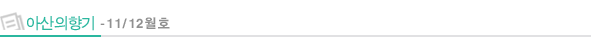|
 책 한 구절
책 한 구절 |
 나에겐 지금 못할 것이 없다 나에겐 지금 못할 것이 없다 |
이영미 |
|
|
대구에서 서울까지 먼 길을 아이와 함께 병원을 다녀왔다. 지친 몸으로 돌아와 내가 맨 먼저 간 곳은 책장 앞이었다. 그리고 앤드류 우드의 ‘나에겐 지금 못할 것이 없다’를 꺼내들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일들과 만나기 전 먼저 이 책을 만나 나를 격려하고 용기를 얻고 싶기 때문이었다. 아이와 병원을 다녀 온 후처럼 지치고 힘들 때나 용기가 필요할 때면 나는 늘 이 책을 뽑아든다. 번역서이기에 원서와는 전혀 다르게 붙여진 제목인 ‘나에겐 지금 못할 것이 없다’라는 한 마디가 이렇게 나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왜일까?
2000년 가을, 이 책을 만나면서 나는 작가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글을 쓰는 것이 꿈이었다고 했더니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자신도 날 닮아 꿈을 이루지 못하면 어쩌냐는 딸아이의 말을 듣고 밤을 새워 고민하던 시절, 나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책이었다. 서른일곱의 나이에 나는 용기를 냈다. 제목에 끌려 읽게 된 이 한 권의 책으로 인해.
사람들은 묻는다. 세 권의 책이 모두 너무 다른 분야이고 구성이 독특한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해냈느냐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시간이 어디에 있더냐고? 직장 다니고 아이를 키우면서? 시간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이 책에서 배웠다. 나는 아이들과 놀면서 내 꿈인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다. 내가 글을 쓸 주제는 내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이들과 함께 한 시간들을, 자식을 죽음의 문턱까지 보내보면서 타인들과 더불어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된 것을 글로 써 보았다. 없는 것을 창조해내기보다는 있는 것을 새로운 형식으로 재구성해 보는 것, 그것이 내가 찾은 방법이었다. 나는 글을 쓰는 것도 좋아하지만 새로운 형식을 구상하는 것 또한 좋아한다. 내 삶의 한 부분을 내가 만들어 낸 새로운 그릇에 담아 세상에 내보내는 작업에서 나는 삶의 성공을 본다. 내게 있어 성공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신학기가 되어 학생들을 처음 만나면 이 책을 이야기한다. ‘여러분에겐 지금 못할 것이 없다’고.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