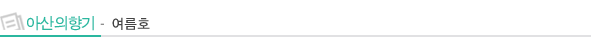|
 향기있는 뜨락
향기있는 뜨락 |
 피보다 붉은 오후 피보다 붉은 오후 |
. |
|
|
입원하세요.” 이 짧은 한 마디가 비수처럼 머릿속을 찌르는 느낌이었다.
“나쁜 건가요? 암이라든지….” 나는 가능한 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짧게 물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의 김정룡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간암이 틀림없는 것 같다, 다행히 빨리 발견했으니 손쓰기 어렵지 않을 것 같다, 대강 이런 대화를 마치고 진찰실을 나왔을 때, 나는 손바닥에 땀이 젖어있는 것을 느꼈다.
간암이라니! 오랫동안 만성간염을 치료하면서도 이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기를 얼마나 바랐던가. 그 날, 1998년 12월 31일 저녁, 식구들이 못 들어오도록 문을 걸어 잠근 빈 방에서 나는 오래 울었다. 억울했다. 이런 사태에 맞닥뜨리는 것만은 피해보려고 그토록 조심하고 노력했건만, 결국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러나 이상하게도 원망이나 비관적인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오히려 빨리 발견한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냉정하게 대처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벌써 18년 전에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았던가? 지금까지 버텨온 것도 축복이 아닌가?
1981년 봄이었다. 이질에 걸려 항생제를 먹고 겨우 가라앉혔던 어느 날 아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마치 콜라나 간장빛의 검푸른 색깔의 소변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일주일에 걸친 검사와 진찰 끝에 B형 활동성간염과 간경변 초기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앞이 캄캄했다. 아직 30대 중반의 나이에, 이제 겨우 대학에 자리 잡아 할 일 많은 조교수의 신분에, 아홉 살, 일곱 살, 약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둘이고, 너무 여려서 이 시련을 감당할만한 강단이 있어 보이지 않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든 이 고비를 넘겨야한다고 마음먹었다.
이 시기, 직장을 한 학기 쉬면서 요양하는 내게 힘이 되었던 것은 신앙이었다. 그러나 허황된 기적을 청하거나 초인적 신비의 능력을 구하지는 않았다. 대신, 지금까지 이 어리석은 나를 살아 숨 쉬게 하신 하느님께 감사하였다. 아직 희망이 절망보다 많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은총으로 느껴졌다. 세상에는 무서운 병도 많고 끔찍한 사고도 많은데, 나를 이 정도의 상태에서 구해주시려고 이 병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몸이 힘들고, 구역질이 나고, 메스꺼운 가운데도 스스로를 위로하고 부축하고 격려하려고 노력했다. 적어도 포기하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였다. 간 질환은 지구전을 요하는 병이다. 편안한 휴식과 안정, 고단백을 위주로 한 균형 잡힌 식사의 영양요법, 주치의의 지시에 철저히 따르는 길 밖에 없다. 이것이 치료의 정도이며 왕도인 것이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생사관을 가지려고 노력한 점은 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었다.
그런데…. 결국 피할 수 없었단 말인가?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 보자. 입원해서 C.T.촬영 등 정밀검사를 받은 후 나는 내 상태에 대하여 자세히 물었다. 아직 암세포의 크기가 작고, 한 개이고, 위치도 수술하기 어렵지 않은 곳에 있어서 잘 처치하면 괜찮을 거라는 얘기였다. 그러나 내가 읽은 책에는 간암의 예후는 대부분 별로 좋지 않은 쪽으로 쓰여 있었다. 수술 날을 앞두고 불안한 것은 인지상정이 아닌가. 나는 기도하였다. 삶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를 더 중히 여기는 하느님, 부디 이 절벽을 제가 건너뛸 수 있게 힘을 보태 주시고, 요행히 맞은 편 언덕에 서게 되거든 쓰임새 있는 곳에 저를 쓰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기도는 평화에 이르는 길 중의 하나이다. 나는 상당히 평화로운 심정으로 수술실로 들어갔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 병소를 절제하고 얼마간의 안정을 거친 후 퇴원하였다. 간동맥 색전술도, 항암주사 요법도 잘 견디고 집에 돌아온 후 나는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것을 느꼈다. 이른 봄 찬 비 내린 날 아침, 노란 산수유 꽃들이 메마른 가지에 바글바글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아직 눈 안 뜬 세이레 강아지들 마루 밑에서 오글오글 기어 나오는 것 같은 신비와 행복감을 느꼈다. 세상은 이토록 맑고 밝고 아름다운 것을…. 세상에는 기쁨과 감사와 축복으로 가득 찬 향기가 넘치는 것을…. 살아 숨 쉬는 흔적 하나하나가 모두 신비인 것을….
그러나 그 신비와 아름다움 저편에는 피울음 응어리진 기도와 멍자국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생각하였다. 이 시기에 쓴 시 한 편을 여기에 옮겨본다.
푸른 잔디 가운데로 투명한 햇살이 폭포처럼
쏟아진다
피보다 붉은 모란 꽃잎이
툭
떨어진다
아그배나무 가득 희고 작은 꽃이
바글바글
피어있다
첫 키스를 기다리는 숫처녀처럼
숲을 설레이게 하는 두려움이
파도처럼
술렁인다
이 하늘 아래 빈 발자욱 몇 개 남겨 놓은 일이
너무 눈부셔
어깨에 묻은, 달빛 같은 바람을
쓸어안는다
--졸시, <피보다 붉은 오후> 전문
간암 수술한지 벌써 여섯 해가 지났지만, 별 탈 없이 잘 지내오고 있다. 나는 내가 사는 것이 내 힘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누군가 큰 힘을 가진 분이 살려주어서 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 고맙고 다행스럽고 신비로울 따름이 아닌가. 이제 이 보잘 것 없는 육신이라도 어디 쓰임새 있는 곳이 있을 터이니 유용하게 쓰도록 해야겠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