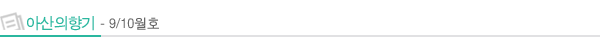|
산도라지
아내가 도라지 껍질을 벗기고 있다.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서 흙이 푸석푸석 묻은 겉껍질을 칼로 서걱서걱 긁어 댄다. 내일모래가
선친 제삿날이다. 제상을 차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한다.
우리 집 제상에는 도라지 나물이 빠지지 않고 오른다. 도라지 나물이 없으면 제상 차림이 안 되는 줄 알 만큼 아주 굳혀졌다.
그것은 시골에서 오랫동안 살며 산도라지를 캐서 정성껏 장만하여 제상에 올렸던 인식이 깊이 배어서, 구조물이 완전히 바뀐, 아파트라는
시멘트 바닥 위에서 차리는 제사가 된 뒤에도 도라지 나물이 빠지면 여전히 섭섭한 느낌이 들어서다.
그 옛날 시골에서는 제사에 쓰기 위한 도라지를 일부러 캐러 다녔다. 그때는 도라지라면 산도라지의 개념밖에 없었다. 뿌리는 살지고
줄기는 오륙십 센티미터가 자랐다. 봄에 돋아나는 새싹을 뜯으면 산채로도 일미였다. 여름 한 철을 자라고 나면 초롱꽃 모양을 닮은
자주색 또는 흰색의 꽃을 한들한들 피워서 씨를 담뿍 달고 부끄럽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겨울 바람을 못 이겨서 씨앗이 떨어졌다.
그 흩어진 씨앗이 한 번 땅에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일년을 살고 마감하는 일도 없이 매년 봄이면 다시 싹이 돋아나는 다년생 식물이다.
눈(雪) 속에 얼거나 부식토와 같이 썩어서 죽지도 않는다. 몇 년을 묵어도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뿌리에 살을 찌운다. 그렇게
연년이 씨를 뿌려서 군락을 이룬 곳에 괭이를 들고 가면 한나절을 캐도 수북했다.
아내의 손에 의해서 뽀얀 속살이 드러나며 껍질이 벗겨지는 도라지를 한참 동안 보고 있으려니 나는 또다시 몇 해 전의 그 산도라지
한 뿌리가 생각난다.
추석 성묘를 하기 위하여 아이들과 함께 산을 오르고 있었다. 고향을 떠난 지도 이십여 년이 넘었으니 일 년에 단 한 차례의 귀향은
낯설고, 한 해가 다르게 울울창창 깊어지는 산도 옛 산은 아닌 듯 길을 잃고 말았다. 얼마만큼 헤매다가 아니 되겠다 싶어 도로
산을 내려와서 예전에 도라지를 캐러 다녔던 길을 찾아들어섰다. 그 길로 가면 무려 두어 시간은 더 걸린다. 작년 추석까지 숲을
헤치고 오르던 길이 아쉽기도 하고, 한 해가 다르게 겹겹으로 쌓이는 잡목들의 기세에 밀려난 일탈감에 허전하기도 했다.
산소를 찾아 성묘를 마치니 여유가 생겨 행동이 느슨해졌고, 예전 일을 생각하며 산도라지를 한 번 찾아보았다. 그런데, 고향에
살 때 한나절에도 적잖이 캘 수 있었던 산도라지의 군락은 사라지고 없었다. 예전의 그 산도라지 군락지가 맞는데 잡목만 가득히
우거져서 스산한 바람 소리만 낸다.
물론 생태계의 변화야 인지하는 사실이다. 땔감을 나무에만 의존하던 시절에는 잡목이 무성하기는커녕 갈퀴로 긁어서 낙엽도 없었다.
두꺼운 낙엽층도 그렇거니와 마른 가지는 가시넝쿨보다 더하게 어지럽다. 아무리 그렇지만 군락을 형성하며 자생하던 산도라지가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은 사라짐에 대한 변화를 너무 서둘렀다는 느낌이었다.
어쩌다가 겨우 한 뿌리를 발견하였다. 그 반가움이란…. 한들한들 꽃을 피우고 외롭게 자란 모습이 애처롭다. 예전에 그 많던
산도라지를 어디로 다 떠나 보내고 네 혼자서만 터를 지키느냐? 아무리 살펴도 네 혼자뿐이니 그 외로움이 어떠하냐? 나는 그 산도라지
한 뿌리에 대한 감회가 깊었고, 그 씨앗이 떨어져서 다시 올라오는 것을 한 번 두고서 보고 싶었다. 이미 꽃도 피었겠다, 그대로
두면 씨앗이 떨어질 것이고, 내년 봄이면 주위에서 새로운 도라지들이 자란다는 생각으로 둘레의 땅을 일구었다. 묵은 풀은 걷어내고
억새는 뿌리를 뽑아 없앴다. 과연 다음 해에 오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새로운 도라지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까?
그러나 다음 해의 추석에 성묘를 마치고서 그 자리를 찾았을 때, 씨앗이 떨어져서 몇 포기쯤 산도라지가 자생하고 있을 줄 알았던
미증유의 바람은 물거품만도 못했다. 떨어진 씨가 새로 뿌리를 내리기는커녕 작년에 꽃을 피우고 있었던 그 한 뿌리조차도 없어지고
말았다. 잡목의 억센 뿌리에 떠밀려서 군락의 자리를 내놓고, 울밀한 나뭇가지와 그 잎에 묻혀서 그늘만 먹다가 설 자리까지 잃은
산도라지들. 자생력을 상실한 뒤에도 종족을 잇기 위한 몸부림으로 오로지 한 뿌리가 가엾게 남아서 옛 터를 지키고 있었는데, 다음
해에는 그것마저 자취를 감추고 말았으니 당초 씨를 받으려 했던 내 생각이 부질없는 짓이었다. 그 산도라지 한 뿌리는 과연 어디로
갔을까? 아내가 제상을 차리기 위해서 도라지 껍질을 벗기는 것을 보고서 나는 또 그때의 그 산도라지 한 뿌리 생각이 난 것이었다.
제상을 차리기 위한 준비로 아내가 저렇게 도라지 껍질을 벗기고 있는 데에는 봇물처럼 밀려들어서 굴러든 돌이 박힌 돌을 뽑고
주인 행세를 하는 그 중국산이 아니라는 신념이 자리잡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필요 이외의 노력을 보태면서 구태여 흙투성이를 사다가
벗길 이유가 없다. 시장 골목에는 뽀얀 속살만 드러낸 도라지들이 지천이고 값도 비싸지 않은데, 하필이면 껍질을 벗기는 수고를
감당하면서 살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신토불이로 제상을 차리려는 아내의 정성은 갸륵하지만 내 생각이 미심쩍기는 매한가지다. 중국산과 국산에 구분이 없어진 지 이미
오랜데 하물며 흙이 무슨 구별이 있겠는가. 토종이라면 그 해 성묘길에서 보았던 바로 그 산도라지 한 뿌리가 진짜였는데, 우리
것이 그렇게 이유 없이 사라지기만 하니 안타까울 뿐이다.
글쓴이 이광민은 시각장애를 가진 수필가로, 한국문인협회 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