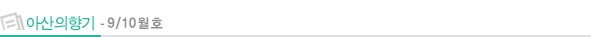|
 정훈소의 여백
정훈소의 여백 |
 가을 2 가을 2 |
정훈소 |
|
|
이 시는 설명이 필요하다. 나는 이 시를 지지난 가을에 썼고, 2년 전 가을 10월의 어느 날 밤, 내 방의 창을 통해 아파트 놀이터를 내려다보며 썼고, 어린아이의 벗겨진 신발이 굴러다니는 놀이터에는 늦은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실제로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나는 비가 내린다고 생각하며 놀이터 모래 위를 굴러다니는 벗겨진 신발처럼 내리지도 않는 가을비에 비를 맞으며 울면서 썼다.
아니다. 이것은 수박 겉 핥기 식의 표면적 설명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 시를 쓴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다. 역시 이 시는 설명이 필요하다.
다시, 가을이다. 가을. 항상 가을이 문제다. 아니 내가 문제고 내 입이 문제다. 내 입은 언제든, 무엇이든 전혀 그것 자체로는 문제가 아니거나 문제가 없는 것을 부풀리길 좋아하고 문제라고 말하길 좋아한다. 화농의 부스럼 딱지처럼 긁고 떠벌려서 어떻게든 문제를 만들어 내고야 만다. 더러운, 거친, 거친 내 입을 통해서 말해진 것 중, 문제가 아닌 것은 거의 없다. 역시 내 입이 문제고, 가을이 문제고, 가을이라는 내 시가 문제고, 시는 설명이 아니고 그냥 내버려두면 시가 됐든 뭐가 됐든 자기들이 알아서 지지고 볶고 다 해먹을텐데 이걸 굳이 설명하려는 이 글이 문제다.
아니다. 나는 또 빗나가고 있다. 다시, 다시, 가을이었고, 2년 전, 이맘때였고, 가을은 가을이라는 계절의 특성상, 떠남의 이미지, 떠나보냄의 이미지, 조락과 잊혀짐의 이미지를 거느리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만성적인 우울병이 도지기 딱 좋은 가을의 어느 날 밤이었다. 나는 자살 대신 시를 썼고, 한 여자를 떠나보냈다. 그 여자에게서 받은 사진을 돌려주었고, 나의 패스워드를 가르쳐 주었다. 왜 그랬는지, 그 여자는 그냥 여자일 뿐이고, 바람일 뿐이고, 스쳐 지나가는, 그래서 그것으로 그만인 바람 같은 존재였을 뿐이었는데, 가을이라는 이미지상, 그래야만 될 것 같았다. 더구나 나는 그때 우울병에 시달리고 있었고 숨을 쉬기가 거북해져 있었다.
아니다. 이것은 오독이고 잘못된 설명이다.
나의 시를 이런 식으로 읽거나 말하면 곤란하다. 나는 단지 이런 것만 말하려고 이 시를 쓰지는 않았다. 나는 가을을 쓰고 싶었다. 가을의 잊혀져 가는 것들에 대해서, 땅에 떨어져 뒹구는 나뭇잎에 대해서, 흙으로 소멸되어 가는 것들에 대해서, 시간의 자기동화작용이라든가 풍화작용에 대해서, 존재의 대열에서 점점점 밀려나 멀어져 가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말하고 싶었고, 쓰고 싶었고, 노래하고 싶었다.
아니다. 다시, 다시, 지금은 가을이고, 나는 우울병에 시달리고 있다. 가을만 되면 나는 언제나 이 모양이다. 나는 어느 날 밤 정말로 자살할지도 모른다. 2년 전 가을 내가 사랑한 어떤 여자에게 그러했듯, 나는 나를 있게 한 어떤 존재에게 여태까지 나 혼자만 알고 있는 패스워드를 가르쳐 줄지 모르고 그 동안의 나를 삭제해 달라고 부탁할지 모른다. 용기가 없을 뿐이지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이젠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지겹다. 어서어서 시간이 가고 이 지겨운 가을이 가 버렸으면 좋겠다. 겨울이 오고 눈이 내리고 내리는 눈에 사랑도 무엇도 하얗게 하얗게 다 덮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나 지금은 비가 내리고, 가을이다. 가을이 점령군의 군홧발처럼 저벅거리며 오고 있다.
글쓴이 정훈소는 뇌성마비 장애인이다. 지금은 삼성동 그의 집에 웅크리고 앉아 처마밑 쳐 놓은 거미줄에 먹이가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거미처럼 습작과 창작에 몰두하고 있다.시집으로 「아픈 것들은 가을하늘을 닮아 있다」 등이 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