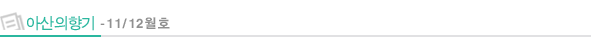|
화두
밥을 먹으며
동생을 생각한다
겨울 날 벌거벗고
욕실에 들어가 대변을 보고 아침마다
가스 보일러 더운물에 목욕을 하며
동생을 생각한다
서울문고 서점에 가 읽고 싶은 책 몇 권, 눈독을 들이며
혹은 사다 읽으며
동생을 생각한다
밀린 공과금을 내고
생활비를 찾기 위해
어머니의 은행 심부름을 하며
동생을 생각한다
시를 쓴다는 핑계로 담배를 사 피우고
명절 날 같은 때
집에 온 조카 놈들에게 몇 천 원씩 집어주며
동생을 생각한다
어떤 볼일로 밖에서
사람을 만나고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을 때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
오늘은 내가 내겠다고 큰소리 꽝꽝 치며
동생을 생각한다
생각을 죽이기 위해 밤에
어머니 몰래 가방에 넣어온 2홉들이 소주 한 병
안주 없이 빨대로 홀짝거리며
동생을 생각한다
동생은 나의 화두다. 나는 이번 생(生)에서 이 화두를 풀고 가야 한다. 이 화두를 풀지 않으면 나의 금생(今生)이며 전생(前生)에 이은 내생(來生)에까지 끊임없는 윤회의 반복이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윤회의 고리를 단번에 잘라 버릴 수 있을까? 박살낼 수 있을까? 방파제의 둑을 쌓고, 물길을 차단하듯 세세생생의 이 지겨운 반복을 어떻게 해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토굴 속 안거에 들어 한 소식하기를 기다리는 스님들처럼 나도 이 겨울 동안 문고리에 묵언패(默言牌)를 내다걸고 용맹정진, 면벽에 들어야 할까? 그래서 용수나 ‘금강경’에서 말하듯, 내가 나라는 이 아상(我相)을, 여름날 골은 수박통 같은 나의 머리통을 짱돌이나 벽돌로 내리쳐 깨 버려야 할까? 나는 단지 오온(五蘊)의 가합(可合)일 뿐, 나라고 할 수 있는 무엇이 없다는 자성(自性)의 공(空)함을 보여야 할까?
도대체 나에게 있어 동생은 왜 나의 화두인가? 동생이 무엇을 어쨌길래 나는 화두라고 말하는가?
4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동생은 아버지 대신 나를 무거운 짐처럼 자신의 양어깨에 짊어지고 있다. 나는 그가 먹여 주는 밥을 먹고, 그가 어머니의 손을 거쳐 주는 용돈을 쓰며,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보면 언제나 생각이 많아지고, 맞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또 그래서 화두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이 화두고, 내가 쓰는 용돈이며 내가 먹는 밥이 나의 화두다. 맑스도 밥을 말했고, 시인 김지하도 밥을 말한 적이 있다. 나 역시도 지금 밥이 나의 고뇌다.
나는 사실 생명이나 밥이 근원적인 과제요 물음이란 걸 몰랐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이고, 어머니 아버지가 밥을 주시니까 밥을 먹는 것이라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생과 밥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노릇이란 말인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몰랐었다니!!!
한 끼의 밥을 먹기 위해서는 노동을 해야 하고, 아무리 하기 싫거나 아니꼬운 일도 참아내야 하며, 때로는 양심을 버리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현실이고 인간 삶의 총체적인 모습이라고 말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나의 삶이 더욱 부끄럽고 내가 동생을 일러 화두라고 말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이 무거운 화두를 나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살아있는 한 밥은 먹어야겠고, 쉬 답은 나오지 않는다. 공안(公案)을 세워 참구(參究)할 것인가? 아니면 가출을 하여 동생이 없는, 동생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 어디로 잠적할 것인가?
글쓴이 정훈소는 뇌성마비 장애인이다. 지금은 삼성동 그의 집에 웅크리고 앉아 처마밑 쳐 놓은 거미줄에 먹이가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거미처럼 습작과 창작에 몰두하고 있다. 시집으로 「아픈 것들은 가을하늘을 닮아 있다」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