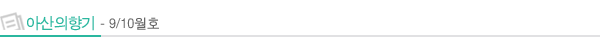|
가을을 앓는 남자, 정훈소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정훈소. 그는 12년 된 나의 문우이다. 나는 그냥 그를 동생부르듯 야, 훈소야, 하다가도 그의 사고(思考)에 존경스러움이 생기면
'아상'이라고도 부른다. '我相'의 한문적 풀이는 '나의 형상'인데, 그는 '나가 없다'는, 뜻으로 지었다고 한다. '정훈소는
없다'고 스스로 지은, 조금은 아픈 뜻이 담긴 이름이다.
나는 그를 12년 전 어느 문화센터 창작반에서 만났다. 전부 여성 회원들인데, 장애인인 한 사람, 그것도 남자가 맨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남자 혼자라는 낯가림도 없이, 용감하게 여성들 속에서 강의를 들었으며, 강의가 끝나면 그 좁은 백화점을 남의 시선
따윈 아랑곳없이 휠체어를 굴리고 다녔다. 껌을 딱딱 씹으면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면서, 달관자처럼 웃어가면서….
나중에 듣고 보고 느껴서 안 일이지만 그가 불량스럽게 껌을 매일 딱딱 씹는 것은 껌을 잠시라도 씹지 않으면 안면 근육이 마비되어
얼굴이 일그러지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좁은 백화점을 두리번거리고 다니는 것은 휠체어가 다니기에 좋은 길이니 되도록 많이 보고
시를 쓰기 위해서였으며, 실실 잘 웃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온갖 아량과 관용이 배인 듯한 태도로 보여졌다.
사실 그를 보는 사람들은 그가 어린아이처럼 참 맑고 구김살이 없다고들 한다.
매주 거의 빠지지 않고 창작반에 나오는 그를 보고 처음엔 환경이 좋은 줄 알았다. 누군가의 보살핌으로, 일주일에 한 번의 외출만은
보호받으며 나오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과거에 그가 살던 집은 계단이 있는 2층집이었는데, 누군가가 옮겨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려온다고 했다. 휠체어에 날개가 달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려오냐고 물었더니 여름이고 겨울이고 두터운 옷을 몇
벌씩 껴입고 대여섯 개 되는 계단을 굴러 내린다고 했다!! 여기저기 타박상을 입는 건 물론이란다.
그렇게 계단을 내려온 다음엔 큰길에 나와서 지나가는 택시를 기다린다고 했다. 어쩌다 마음 좋은 택시 기사라도 만나면 행운이지만,
그런 마음 좋은 아저씨를 만나기 위해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눈이 오면 눈보라에 꽁꽁 얼어가며 무작정 택시를 기다린다고 했다.
그가 어쩌다 결석할 때가 있는데, 그런 날은 택시를 못 타서 그냥 돌아갔다고 했다. 다행이 요즘 그는 혼자서도 출입이 자유로운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미 세 번의 시집을 낸 시인이면서 여전히 문화센터에 다니는 그. 그것이 세상으로 향하는 유일한 출구인 그를 생각하면 나까지도
저 맑은 가을빛이 아프려고 한다. 도심의 한 아파트에 갇혀서 보는 것이 없어서 시를 쓸 수 없다고 늘 한탄하는 그는 언제쯤 산과
들과 바다를 맘껏 볼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자유로이, 바람처럼, 한 번도 못 본 세상 나들이를 할 수 있을까?
바람은 족적을 남겨서는 안된다
그냥 미쳐야 한다
미쳐서 바람을 안고 끙끙대다가
자기가 흔들어대던 세상의 모든 밤들보다
먼저 잠들어야 한다
그것이 바람의 속성이다
그래도 바람이 지나간 자리 골다공처럼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다
아프다
아프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다
아픈 나는 가슴이 비어 가을하늘보다 더
푸르다
정훈소 / 아픈 것들은 가을하늘을 닮아 있다, 전문
저렇게 맑고 아름다운 청천의 하늘빛도 아프게 표현한 시인.
감옥 아닌 감옥에서, 가을 하늘을 창으로만 보면서, 세상을 향한 눈은 환히 열어두고 마음 속으로는 혼자만의 토굴을 파고 들어앉아서
또 얼마나 이 가을을 앓고 있을지!!
글쓴이 이남주는 정훈소 시인의 문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