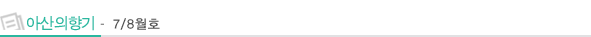|
 병상일지
병상일지 |
 당신의 가슴에 창을 내세요 당신의 가슴에 창을 내세요 |
김미혜 |
|
|
“간호사 님, 일주일에 두 번만 투석받으면 안될까요?”
처음 투석을 시작하는 환자들이 어김없이 던지는 질문에 난 웃고 만다. 안된다는 답을 듣고 돌아갈 것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묻는 말이기 때문이다.
처음 투석실에 왔을 때, 방마다 떡 하니 버티고 서 있는 낯선 기계들에 놀라고, 절망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다가왔을 만성 신부전 환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막막했던 기억은 잊혀지지 않는다. 오랫동안 투석을 받아온 환자들은 새로운 간호사가 잘 하는지 걱정스런 빛이 역력한 얼굴로 날 주시했고, 처음 투석을 받는 환자들은 엄마 제비에게서 먹이를 기다리는 새끼 제비마냥 나에게서 뭔가를 듣기를 원했다.
지금은 날 걱정스럽게 지켜봐 준 환자들과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여유도 생기고, 처음 투석을 하는 환자들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알 만큼의 시간이 지나갔지만, 돌아보면 이 투석실은 참 많은 것을 생각케 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얻었던 곳이다.
시간은 투석실 구석 구석마다 흔적을 남기고 지나갔다.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투석실을 거쳐 갔다. 자식들이 먹고 살 만하니 이런 몹쓸 병에 걸려서 자식 볼 면목이 없다는 할머니, 자신이 벌어서 먹여야 할 식구가 많아 이틀에 한번 투석은 힘들겠다는 아저씨, 부모님이 신장이 안 좋아 걱정했는데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아주머니, 신장 이식 후 거부반응이 나타나 다시 투석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투석실엔 많은 사연과 삶의 모습이 있다.
몸무게가 너무 많이 늘어 숨이 차서 응급실에 들렀다거나, 포타슘이 너무 높아져서 심장발작으로 중환자실에 갔다거나, 엊그제 봤던 것 같은 환자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가슴 아린 이야기도 있는 한편, 이식이 잘 되어서 잘 지낸다는 기분 좋은 이야기도 있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주는 많은 의료진이 있고, 또 하나의 삶의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활력도 있다.
잔뜩 내려앉은 하늘에서 비라도 금방 쏟아낼 것 같은 이런 날에도 가슴에 태양 하나씩 보듬고 있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춰낼 창 하나씩 가슴에 달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곳, 이곳 투석실에 나도 있다.
글쓴이 김미혜는 서울아산병원 투석실 간호사이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