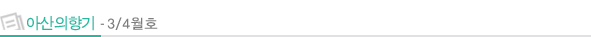|
 병상일지
병상일지 |
 응급실에 '나'는 없습니다 응급실에 '나'는 없습니다 |
김희숙 |
|
|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십니까?”
“아!… 네…?…응급실…이요…”
“예?… 아!… 응급실이라…???”
이렇게 매번 소개팅에서 쓴잔을 마시고 돌아선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나의 응급실 근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같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곳에서 어떻게 근무하세요? 대단하시네요”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일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어머니마저도 나를 볼 때마다 빼먹지 않고 하시는 잔소리 중 하나이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10년 가깝게 응급실에서만 살아온 나에겐 얼마나 편안하고 아늑한 곳인지 모른답니다. 힘들고, 무섭고,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그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다 보면 나름대로의 즐거움과 보람, 애절함이 많이 느껴진답니다.
벌레로부터 청년을 구출한 사건, 물에 빠진 사람 살려내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사람, 치열한 부부싸움으로 우리들 모두를 결혼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드는 사람들, 조폭들의 응급실 점령, 김희선이 응급실에 떴다는 정보에 서로 심전도를 찍겠다는 남자분들…. 그야말로 응급실은 다양하고 ‘드라마틱’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곳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응급팀의 필사적인 심폐소생술로 삶의 반전을 연출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로 감동이고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그와는 반대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상황에도 맞닥뜨리게 되지만, 그럴 때면 같이 슬퍼하고 혹시나 최선을 다하지 못한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도 들고, 반복되는 아픔을 다시는 만들지 말자는 다짐도 하게 된답니다.
응급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찔러도 피 한방울 안 나올 정도로 독하다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절대로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뜨거운 심장이 뛰는, 맑은 눈물을 머금은, 따뜻한 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혹독한 주위 환경에 의한 지배를 받다 보니,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좀더 강하고, 좀더 이성적으로 변해 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 이면엔 보이지 않는 작은 여림이 자리잡고 있답니다.
응급실에서 ‘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라는 팀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아니 앞으로도 ‘우리’들은 하나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뛰고, 소리치고, 땀 흘릴 것입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