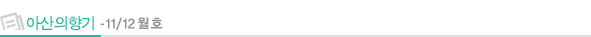|
 병상일지
병상일지 |
 출근할 때와 퇴근할 때 출근할 때와 퇴근할 때 |
신경아 |
|
|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로서 신경외과 병동에 근무한 지 10개월이 지났다. 글을 쓰려고 컴퓨터 앞에 앉으니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처음 병동에 인사했던 일, 신규 트레이닝 받았던 2개월, 독립 후의 일들이 죽 머릿속에 그려진다.
신경외과는 주로 뇌와 척추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이 오는 곳이다. 처음에 신경외과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속은 걱정들로 가득했다. 사람의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뇌를 다루는 곳에서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지금도 이 생각은 여전히 들고,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한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이런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려 노력한다는 것이다.
내가 있는 병동은 일반 병실과 관찰실이 같이 있는 곳이다. 관찰실은 일반 병실보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있는 곳이어서 간호사의 손이 더 필요하다. 처음 관찰실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의 습한 공기와 가래 끓는 소리, 관찰실 특유의 냄새가 생각난다. 관찰실 간호사로서 한 달을 보낸 지금, 이제는 이런 환경에 익숙해져 나 역시 관찰실 내의 한 부분으로 느껴진다.
관찰실 환자를 본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심폐 소생술을 했다. 그날은 나에게 잊지 못할 암울한 기억을 남겨 주었다. 한 시간 여 남짓 소생술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모른다. 살려만 달라고…. 결국 맥박이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중환자실로 내려갔는데, 30분이 채 안 되어서 사망 소식을 들었다. 온몸의 힘이 빠지면서, 숨쉬기 힘들다고 말했던 환자와 심폐 소생술을 초조하게 지켜보던 보호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출근하면서 ‘오늘 하루도 후회없이 열심히 일하자’라는 다짐을 했던 나는 온데간데없고 ‘과연 나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소생술을 막 마치고 내 마음은 참담한데, 다른 환자와 가족들 앞에서는 웃으면서 일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아마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이 무던해질 때쯤 다른 일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순식간에 변하는 환자 상태 때문에 늘 긴장하며 일해야 하는 것과 까탈스러운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나에게는 큰 스트레스다. 그러나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소변을 치워 주고 자리를 정리해 주고 가래를 뽑아주고 나서 조금이나마 편안해 하는 환자를 볼 때, 새벽에 양치질을 해 주면서 병실 창 밖으로 떠오르는 햇살을 볼 때, 뭐랄까 묘한 뿌듯함이 든다고 해야 할까.
출근할 때는 ‘환자들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잘해 줘야지’ 다짐을 하지만, 퇴근할 때는 ‘오늘 왜 그랬을까. 내일은 더 잘해야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던 것 같다. 아마 오늘도 내가 164병동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든 병동 선생님들을 생각하며, 또 내 손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생각하며 또 한번 다짐을 하고 출근하지 않을까.
글쓴이 신경아는 서울아산병원 164병동 간호사이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