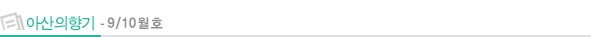|
 병상일지
병상일지 |
 뛰는 아이, 안 뛰는 아이 뛰는 아이, 안 뛰는 아이 |
송은영 |
|
|
“이야~. 까르르르. 다다다다. 어이쿠! 으~앙~”
“얘들아, 누가 뛰니!”
“헤헤헤헤 우와~ 도망가자~!”
휴~, 여기는 소아들이 있는 병동입니다. 성인들도 함께 있지요. 그래서 늘 어수선하고 정리가 되지 않은 듯 보입니다. 이따금 불평도 들어오네요. 왜 소아와 성인이 함께 있냐고. 아이와 어른, 신생아에서 할아버지까지 57명의 환자들을 보면서 생의 시작과 끝자락으로 이어지는 작은 사회를 봅니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아프면 울고 안 아프면 잘 웃습니다. 그러다가 더 기운이 나면 뛰기 시작합니다. 휠체어 놀이도 합니다. 손을 수술하고 팔을 높게 매달아 묶은 아이는 앉고, 다른 아이는 뒤에서 밀며 뜁니다.
“간다~아”
“아이고 위험해. 병원에선 뛰면 안돼요. 걸어야지.”
하지만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란 걸 압니다. 아이들은 뛰어노는 것을 좋아하니까요. 아이들의 친구는 아이들이지요. 아니, 그보다는 아이 부모님의 친구분들이 자녀들을 데려오는 경우나 또래 친인척 아이들이 몰려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건강한 아이들과 아픈 아이의 만남. 서로 위안을 주며 천진스레 어우러지는 모습. 감동적입니까?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다 못해 소망합니다. ‘조용히 살고 싶다’고. 참!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당부의 말씀, 아니 제발 부탁입니다. 병원에 아이들 데리고 오지 말아 주세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입니다. 떠드는 아이가 얼마나 이쁜지요. 장난치는 아이는 차마 감동이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유월 우리는 소아 심장외과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과가 이사를 온 것이지요. 손, 발, 얼굴을 수술한 아이들과 달리 심장이 아픈 아이들은 뛰지 않더군요. 숨이 가쁜 아이는 떠들지도 않네요. 아! 아이는 눈으로 얘기합니다. 크고 맑은 눈망울로 죄없이 타고난 심장병의 두려움을 글썽입니다.
작은 일에 노여워하고 투덜대는 일상 속에 이따금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 아이들. 우리의 존재가, 여기 있음이 의미있게 하는 아이들.
“얘들아, 너희들의 약한, 그래서 이따금 말썽도 부리는 그 여린 심장을 사랑한다.” 그리고… 여름비 내리는 날 새벽 천사가 된 신혁이의 명복을 빕니다.
글쓴이 송은영은 서울아산병원 91병동 간호사이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