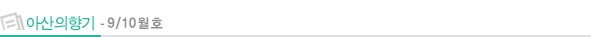|
 행복이란
행복이란 |
 음악평론가를 해요? 음악평론가를 해요? |
임진모 |
|
|
나의 수입?
"뭐, 한심하죠. 돈 벌려고 하나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죠."
음악평론가 활동 12년 동안 내가 사적으로 대화하면서 가장 많이 한 말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음악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만나 조금 깊숙한 얘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묻는다. 사람들이 그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도 아니다. 대놓고 부연 설명 하지는 않지만 거기에는 내심 '음악에 대해 글을 써서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알려진 평론가이니까 일반인들보다는 많을 것' 이라는 인식, 그 두 가지 상반된 느낌이 뒤섞여 있는 것 같다.
한 달 보내기가 무섭다
그런 질문을 하면 난 또 어김없이 그들에게 반문한다. "제가 한 달에 어느 정도 버는 것 같나요?" 라고. 그러면 사람들의 예측은 상극이다. 몇 십만 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사람도 있고, 천만 원을 부르는 사람도 있다. 실은 통장을 입금된 한 달 원고료. 출연료. 강의료 등을 지금까지 계산해 본 일이 없어서 나도 내가 얼마를 버는지 알지 못한다. 그냥 아내를 통해 ' 한 달 보내기가 무섭다' 는 것만을 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선택한 것이 '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하는 일' 이라는 응답이다.
그래도 수입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을 보면 사정이 나아진 것은 확실하다. 평론가 활동을 시작하던 1990년대 초반에는 수입을 물어보기는커녕 한심한 표정으로 "음악평론가를 해요? 부모님이 반대하지는 않았나요?" 하며 존재에 대한 회의를 품는 사람들도 많았다. 어떤 '솔직파'는 웃으며 " 먹고 살기는 틀렸네요" 라고 한 적도 있고, 그나마 정황에 밝은 사람은 "기자 생활을 때려치우고 음악을 택한 용기가 부럽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엄연한 자긍
길지 않은 12년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 나날이었다. 방송 출연 하랴 원고 쓰랴, 일은 제법 많았지만 아무리 해도 살림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그렇고 그런 수준에서 맴돌았다. 프리랜서라서 입금도 불규칙하고 널을 뛰다 보니 아내는 '구조개선'을 위한 계획을 잡을 수도 없었다. 가족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재정, 재테크를 떠나 자아의 경우는 단 한 번도 갈등한 적이 없을 만큼 만족의 세월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사람들에게 말한 것 그대로 '좋아서 하는 일'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글을 쓰고, 게다가 음악에 대한 글을 쓰고, 보고 싶은 공연을 찾아다니고, 음악에 대해 강의를 하고, 방송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라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 그것은 자위가 아니라 엄연한 자긍이다.
음악평론도 생활은 생활인지라 돈 문제에 관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언제인가 내 생활은 '즐거움과 돈 사이의 반작용' 이라고까지 애처롭게(?) 규정하기도 했다. 음악평론으로 고소득 대열에 오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1996년 부터인가 '돈을 포기하자'고 마음을 다잡았던 것이 기억난다. 그랬더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이상하게 일도 더 많아지는 것이었다. (박리다매?)
해가 갈수록
해가 갈수록 체력과 음악 감각이 떨어지고 있지만 반대로 늘어나는 것은 행복감이다. 적어도 음악계 사람들은 날 이해해 주고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인터뷰 차 만난 발라드 슈퍼스타 신승훈은 불쑥 나에 대해 이런 얘기를 꺼냈다. "지금까지 잘해 오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을 것 같구요. 음악 하는 사람들은 다들 진모 형을 알잖아요. 그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안치환의 격려사도 있었다. "그동안 오로지 음악 평론만 해 오셨잖아요. 순수하게요. 그 위치에서 한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걸로 알아요. 다른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평론가로서 힘을 얻은 거죠."
듣기는 낯뜨겁지만 기분은 좋다. 그 기분이 바로 내 존재의 밑거름 아닐까 생각하며 세월에도 불구하고 늘 내 직업을 '좋아해서 하는 일'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 난 지금도 음악을 듣는 게 가장 즐겁다.
글쓴이 임진모는 음악평론가이다.(www.izm.co.kr)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