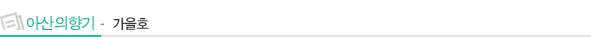|
 나누는 행복
나누는 행복 |
 고마운 옆집 할머니 고마운 옆집 할머니 |
엄선 |
|
|
지난해 여름, 남편의 갑작스런 발령으로 충남 아산으로 집을 옮기게 되었다. 덕분에 난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둬야했다.
이사를 하던 날, 모든 게 걱정스러웠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이제 막 백일이 된 아기를 돌보는 일이 막막했다. 그동안 서울에 있을 때는 가까이 계시던 시어머니가 아기를 보살펴 주셨기 때문이다.
이사 온 첫날부터 난 아기와 한판 전쟁을 벌였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이상하게도 아기는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배가 고픈 건지, 기저귀가 젖은 것인지, 아니면 어디가 아픈 것인지…. 나의 하루는 어지럽기만 했고, 아기를 따라 울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렇게 1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밤, 아기가 좀 이상해 보였다.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한번 기침을 하면 너무 힘겨워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은 그날 회식이 있다고 집에 들어올 생각도 않고 핸드폰도 받지 않았다. 나 혼자 쩔쩔매는 가운데 시간은 밤 12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난 아기를 안고 일단 시원한 바람 좀 쐬어줘야 겠다는 생각에 집 앞 마당으로 나갔다. “우리 아기 착하지, 까꿍~~ 괜찮지 아기야.”하며 나름대로 아기를 달래고 있었다.
그 때였다. 옆집 할머니가 아기 울음소리에 깨셨는지 문을 열고 나오셨다. “이봐 새댁, 아기가 아픈가 보군. 어디 이리 줘봐. 이거 열이 많네. 일단 우리 집으로 들어가세.” 난 할머니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다. 그동안 간단한 목례 정도로만 인사를 해오던 할머니였는데,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 감사할 따름이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할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이내 평안한 모습으로 잠이 들었다. 할머니는 아들, 딸들의 손주도 다 당신께서 키우셨다며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내 어깨를 두드려 주셨다.
이 일이 있은 후 아기의 주치의는 옆집 할머니가 되었다. 할머니는 내게 아기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살림하는 노하우도 전수해 주셨다. 덕분에 난 낯선 곳에서의 적응도 빨리 할 수 있었다.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다. 옆집 할머니 덕택에 이제는 아기를 나 혼자서도 잘 돌볼 수 있게 되었다.
작은 것 하나도 나누려 하시는 정이 많은 할머니 때문에 ‘이런 게 사람 사는 맛이구나’하고 느낄 때가 많다. 그래서 할머니께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하늘에 기도해본다. “할머니, 언제나 건강하시고, 오래 오래 사셔야 돼요.”
‘나누는 행복’ 지면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보내 주십시오.
더욱 다양한 독자 여러분의 행복한 이야기를 만나고 싶습니다.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이메일(asanhyanggi@korea.com)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