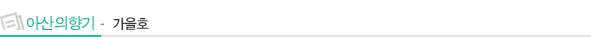|
 나누는 행복
나누는 행복 |
 남편의 손 남편의 손 |
장미숙 |
|
|
아이 이발을 해주려고 바리캉을 켰는데 어쩐 일인지 움직이지를 않았다. 한 5년 쓰다보니 너무 낡아서 새로 하나 사야겠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쓰고 있는 형편이었다.
“아이, 이를 어째? 바리캉이 안 되네.” 아이를 의자에 앉혀 보자기를 씌워놓고는 기계를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자 아이는 빨리 안 한다고 짜증을 부리며 난리였다. 그때 남편이 “이리 줘봐.” 하며 내 손에서 바리캉을 빼앗아갔다.
기름칠을 하고 요리조리 만지자 금방 웽~ 하며 돌아가는데 참 신기했다. “그것도 하나 못하고는…” 의기양양해져서 휑하니 방으로 들어가는 남편의 으스대는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조금 얄밉기는 했지만 솔직히 남편의 손재주 하나는 인정해 줄만 하다. 손은 두꺼비처럼 두둑하게 생겼는데 희한하게 뭔가를 고치는 데는 선수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도 내 휴대폰 충전기가 불이 들어오지 않고 고장이 나 있었다. 충전기를 하나 사야 되겠다고 하자 남편이 한참을 자르고 붙이며 들여다보더니 모양은 좀 어설프지만 빨간 불이 들어왔다. “어? 희한하네.” 정말 희한하게 남편 손을 거치면 우리 집의 온갖 물건들이 새 생명으로 탄생하게 된다.
다리미, 선풍기, 심지어는 세탁기까지도 고친다. 고장 나서 자꾸 흘러내리던 벽걸이식 옷걸이도 고쳤고, 보일러 스위치도 높은 곳에 있어서 불편하다고 뜯어버리더니 손 닿기 편한 곳으로 옮겨놓았다. 화장실의 낡은 샤워기도 다 뜯어내 버리고 새것으로 감쪽같이 달아놓았다.
그러나 남편은 뚝딱 뚝딱 고치는 데는 선수이지만 ‘이것 좀 가져와라, 저것 좀 치워라, 이것 말고 다른 거 가져와라’ 등등 나를 조수처럼 마구 부려서 짜증나게 할 때도 많다. 내가 이름을 아는 공구는 몇 개 안 되는데, 생소한 걸 가져오라고 하면 늘 헤매다가 엉뚱한 걸 가져다주고는 타박 맞기 일쑤다. 게다가 다 고치고 난 뒤 뒤처리도 언제나 내 몫이다.
며칠 전 남편이 베란다를 보더니 “이거 빨래 널기 불편해서 쓰겠어?” 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곧이어 뭔가를 들고 들어왔는데, 그건 바로 천장 부착식 빨래건조대였다. 곧바로 남편은 작업에 들어갔고 큰 손으로 뚝딱뚝딱 하는 사이 정말 편리하고 깔끔한 건조대가 완성되었다. 쓰던 빨래건조대를 치워버리자 베란다에 여유 공간이 생기고 미관상 보기도 훨씬 좋아졌다. 빨래 너는 것도 수월해져서 나에겐 일이 줄어든 셈이다.
이제는 나도 남편을 인정해 줘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손보다도 남편의 손이 귀하게 보인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고귀한 손이기 때문이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