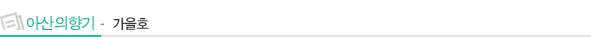|
 나누는 행복
나누는 행복 |
 가을풍경그리기 가을풍경그리기 |
권명애 |
|
|
요즘 부는 바람에는 가을 냄새가 가득 묻어 있다. 이곳 충주는 사과의 단내와 들꽃향기에 자꾸만 코를 흠흠 거리게 될 정도다.
나는 가을이면 오래 전 유년시절의 풍경이 한 폭의 수채화처럼 떠오른다. 그 시절 실개울엔 쑥부쟁이와 코스모스가 무더기로 피어 있었다. 벼 이삭이 고개 숙인 논둑길을 달리면 콩 튀기듯 메뚜기가 여기저기서 뛰어 오르곤 했다.
하지만 그런 가을에도 힘들었던 일이 하나 있었다. 바로 운동회 연습 때문이었다. 친구들과 나는 마지막 끝나는 종이 울려도 쉽사리 집에 가지 못했다. 운동장에 모두 모여 남학생들은 곤봉체조, 포크댄스, 기마전, 여학생들은 꼭두각시 춤, 소고춤 등 한참 운동회 연습을 하다보면 점심을 배불리 먹었는데도 어느새 배에서 ‘꼬르륵’ 하고 맑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렇게 한참 연습을 하다보면 저녁 노을이 물살처럼 떨리고 교실 유리창은 채송화 꽃물처럼 서서히 번져왔다. 그제서야 아이들은 긴 그림자를 드리우며 집으로 갈 수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 함초롬히 피어있는 이름 모를 들꽃을 한 움큼 꺾어 냇가에 띄워 보기도 하고, 여자아이들은 까만 단발머리에 끼워 보기도 했다. 가끔씩 시냇가 풀숲에서 ‘찌르륵 찌르륵’ 여치가 울어대기도 하고, 언제 날아왔는지 고추장 항아리에 꼬리를 빠뜨렸다 온 것 같은 빨간 고추잠자리가 가을 하늘에 떼를 지어 빙글빙글 맴을 돌기도 했다.
그 땐 힘든 운동회 연습 탓인지 가방이 무척 무겁게 느껴졌다. 우리는 가위 바위 보를 해 진 사람 두 명이 긴 막대에 가방을 줄줄이 꿰어 양쪽에서 들고 가는 가방 들어다 주기를 하며 걸어갔다. 누군가 노래를 부르면 다같이 합창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 저 멀리서 저녁밥 짓는 허연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오르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가방을 들고 냅다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런 날이면 난 저녁밥을 두 공기나 다 비우고도 어머니가 가마솥에서 박박 긁어 공처럼 말아준 누룽지를 반쯤 감긴 눈으로 먹다가 나도 모르게 잠에 떨어지곤 했다.
드디어 운동회가 열리는 날. 운동장에는 만국기가 펄럭이고, 허연 김을 내는 국밥 아주머니도 장사를 나오시고,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애기 강아지까지 모두 다 학교로 모여 동네가 텅텅 비곤 했다. 그러면 이제껏 가다듬어 둔 우리들의 함성과 함께 가을 운동회가 펼쳐졌다.
지금도 해마다 가을에 초등학교 운동장 곁을 지나게 되면 어릴 적 가을 운동회의 추억이 떠올라 발길을 멈추게 된다. 그리고 달리기 시합에서 1등을 해서 손목에 찍어 준 파란색 도장이 지워질까봐 한 손으로만 고양이 세수를 한 것이 떠올라 살포시 웃음이 나곤 한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