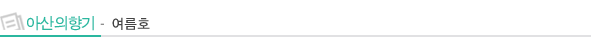|
 나누는 행복
나누는 행복 |
 장터의 할머니 장터의 할머니 |
유재범 |
|
|
몇 해 전 지방 소도시로 발령받아 홀로 자취생활을 한 적이 있었다. 자취생활의 고통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지만, 그 중에서도 먹거리 해결이 가장 큰 고충이었다.
어느 주말 저녁, 손수 찌개를 한번 끓여봐야겠다는 무모(?)한 도전정신의 발로로 근처 시장에 장을 보러 간 일이 있었다. 슈퍼에서 이것저것 사들고 파 한 단을 사겠다고 장터 여기저기를 둘러보는 찰나, 한 양장점 앞에 초췌하게 웅크리고 계신 할머니를 볼 수 있었다. 시커멓게 그을린 얼굴에 골 깊숙한 주름, 황토 묻은 수건으로 머리를 동동 동여매신 모습이 꼭 몇 해 전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를 생각나게 했다.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이 맞벌이 하시느라 모두 직장에 가시고 형과 누나들도 학교에 가면 으레 집안에는 나와 할머니, 이렇게 둘이 있을 때가 많았다. 전원생활에만 익숙하신 할머니께 도심생활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셨던 것 같다. 어느 날부터인가 할머니는 집 근처 마당에 파를 심고 다 자라면 캐서 시장에 내다 파는 일을 시작하셨다. 그때마다 가족들은 할머니께 싫은 소리를 했다.
“용돈을 적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가 모자라서 그런 일을 하세요?”
“돈 때문에 그러능가? 사람 구경도 좀 하고 바람 좀 쐴라고 그러능거제.”
아무리 바람 쐬고 사람 구경하는 것도 좋다지만, 몇 시간도 아니고 지금 마주친 할머니처럼 우리 할머니도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계셨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각, 우리 할머니를 생각하며 나는 만 원짜리를 꺼내 남은 파 전부를 떨이로 달라고 말씀드렸다.
“어이구, 억지로 살 것 없어. 내가 무슨 돈벌러 왔당가? 그냥 바람 좀 쐬고 사람 구경 좀 할라고 왔제.”
어쩜 그리도 우리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식당에서 왔는데 많이 필요하니까 다 파시라고 말씀드린 후에야 할머니께서는 승낙을 하셨다.
지금도 나는 도심 장터에서 농산물을 파는 할머니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한다. 사람 구경하고 바람 쐬는 것은 적당히 하시고 이제는 집에 가서 편히 쉬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