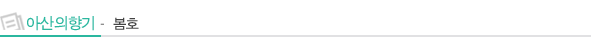|
 나누는 행복
나누는 행복 |
 고구마 밥 고구마 밥 |
장미숙 |
|
|
밥맛이 없어서 고구마를 삶는데 불현듯 고구마 밥이 먹고 싶어졌다. 어렸을 적 먹어본 후로 한번도 맛보지 못한 고구마 밥이 갑자기 생각난 건 얼마 전에 엄마가 고구마를 보내 주셨기 때문이다. 밥솥에 쌀을 씻어 앉힌 후에 고구마를 잘라서 군데군데 넣어 밥을 짓다 보니 어김없이 배고프던 어린 시절 생각이 났다.
“작은집에 가서 쌀 한 되만 달라고 해라. 엄마가 모시 팔면 갚는다 하고….” 엄마가 건네 주는 닳아빠진 바가지를 들고 쌀을 얻으러 갈 때부터 나는 아마 철이 들어 버렸는지도 몰랐다. 정말 하기 싫은 심부름을 하면서 우리 집은 왜 이리 가난할까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했고, 내가 커서 돈을 벌면 엄마에게 쌀을 아주 많이 사드려야지 다짐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쌀을 사 드려 본 적은 없는 것 같다.
쌀이 많으면 부자였던 그때, 우리 집 쌀독에는 늘 몇 줌 안 되는 쌀이 담겨져 있었고 그나마 텅 비어 버린 적도 많았다.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한 건 아니었다. 아버지가 머리를 다치신 후 병이 드셨기에 집하고 선산만 남겨두고 모든 재산을 팔아 버렸으므로 농사지을 땅이 없었다.
거기다 아버지는 노동을 할 수 없었고 엄마 혼자서 남의 집 품팔이를 해서 우리를 겨우 먹여 살릴 정도였으니 하얀 쌀밥을 구경하기란 턱도 없는 일이었다. 산에 밭이 있어서 보리농사는 지었지만 쌀은 남의 집 일을 해주고 얻어오거나, 엄마가 모시를 삼아서 판돈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양이라고 해봐야 변변치 못한 것이어서 늘 배가 고프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엄마는 산에 있던 밭에 고구마를 아주 많이 심었다. 고구마는 우리에게 다름아닌 밥이었다. 그러나 매번 고구마만 먹을 수는 없었기에 엄마는 고구마 밥을 해서 우리의 배고픔을 달래 주었다. 지금 같으면 상당한 영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아주 지겨운 밥이 아닐 수 없었다.
밥보다 고구마가 많았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면 늘 고구마는 그릇 바깥쪽으로 밀려다니다가 마지못해 입안으로 들어가곤 했다. 쌀 한 되로 다섯 식구가 일주일을 살아야 했으니 다른 방법이 없었을 터이기도 했다. 그렇게 엄마는 우리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 살갗이 터지도록 모시를 삼아서 장에 내다 팔았다.
초등학교 사 학년 봄 소풍을 갔을 때 나는 소풍가는 것도 싫었다. 도시락 때문이었다. 엄마는 고구마나 감자를 넣은 밥을 분명히 싸줄 테고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을 걸 생각하니 짜증이 났다. 나는 학교에 가면서 슬그머니 도시락을 열어 보고는 깜짝 놀랐다. 고구마가 섞이지 않은 하얀 쌀밥이 도시락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었고 나는 자신 있게 도시락 뚜껑을 열고 펼쳐놓았다. 그런데 밥을 뜨기 위해 숟가락을 깊숙이 꽂았을 때 숟가락에 묻어 나온 건 고구마였다. 엄마는 고구마를 밑에 깔고 쌀밥을 덮어 주었던 것이다. 갑자기 눈물이 핑 돌며 얼굴이 발개졌는데 그때 친구 정숙이가 “와! 너 밥에 고구마가 있네. 맛있겠다. 나랑 바꿔 먹자.” 하며 내 도시락을 가져가 버렸다. 그때 정숙이는 내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걸까? 아마 그런 건 아닐 터였다. 어렸을 때니까… 그래도 그 친구가 얼마나 고맙던지….
나에게는 지금도 쌀이 주는 의미는 각별하다. 부모님이 농사를 지어서 보내 주시기도 하지만 밥과 쌀에 대한 목말랐던 기억이 더 큰 이유일 것이다. 쌀보다 보리가 훨씬 많이 섞여 있던 고구마 밥을 이제는 밥맛 없을 때 먹는 별식이 되어 버린 세상이지만 기억은 언제나 아릿하게 남아 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