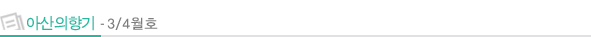|
 나누는 행복
나누는 행복 |
 그리운 유년 시절의 풍경 그리운 유년 시절의 풍경 |
박인자 |
|
|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녀석이 놀이터에서 얼마나 재미나게 놀았는지 머리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벌컥벌컥 들이킨 아이는 머리가 가려운지 마구 긁적긁적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시골서 살던 어릴 적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봄, 교실에 앉아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면 웬 잠이 그리도 쏟아지는지 전날 밤 잠을 많이 잤는데도 자꾸만 눈꺼풀이 무거워 몇 번이곤 허벅지를 꼬집으며 졸음을 참았습니다.
그러다 쏟아지던 잠이 일순간 확 달아나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짝꿍 형숙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형숙이는 부쩍 머리를 긁적긁적거렸지요. 4교시 산수 시간, 어디서 나타났는지 형숙이의 산수 공책에서 시커멓고 큰 머릿니가 제 쪽으로 스멀스멀 기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놀란 토끼눈이 되어 형숙이를 연필로 콕콕 찌르며 조그맣게 말했죠.
“형숙아, 이거.”
그러자 형숙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한 손으로 이를 잡더니 엄지손톱을 맞대어 꾹 눌렀습니다. 형숙이의 손톱 가득 시뻘건 피가 묻어 났지요. 흔하게 보는 이에 익숙해질 때도 되었는데 …. 겁이 많던 저는 돌담 사이로 들어가는 들쥐만 봐도 깜짝 놀라 간이 콩알만해지는 아이였지요.
그날 저녁 저도 왠지 모르게 머리와 몸이 가려웠습니다. 제가 하도 긁적이니까 어머니는 제 머리 속을 보시더니 머릿니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참빗으로 제 머리를 계속 빗겨 주셨습니다. 지금이야 하루에 한번씩 머리를 감지만 예전엔 가끔가다 머리를 감아 머리가 잘 빗겨지지 않았지요. 저는 너무 머리 밑이 당기고 아파 두 눈 가득 눈물을 달고 “아-아”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행이었죠. 옆집 숙희는 겨울날 한밤중 달랑 한 벌밖에 없는 빨간 내복을 벗어 추위에 떨곤 했지요. 빨간 내복을 뒤집어 마당 빨랫줄에 널었습니다. 아마도 못 잡은 이들이 한밤중 추위에 몽땅 얼어 죽으라는 것이었지요.
다음날 새벽 숙희는 내복을 입고 싶어 빨랫줄에서 내복을 걷다 그만 그 때까지 꽁꽁 언 내복 팔 한쪽이 뚝 하고 분질러지고 말았지요. 숙희 어머니는 산 지 얼마 안 된 새 내복이라며 목소리를 높이셨죠. 숙희는 엉덩이에 불이 나게 부지깽이로 혼줄이 났고, 끝내 신발도 못 신고 우리 집으로 피신(?)을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 당시 학교에서는 교탁 앞으로 나가면 선생님은 천에 하얀 가루약을 주먹만하게 싸 우리 머리에 대고 ‘톡톡’ 두들겨 주셨는데 지금의 아이들은 상상을 할 수 없겠지요.
지금쯤 다들 중년이 되어 있을 유년시절의 친구들. 그들도 아주 가끔은 저처럼 그 시절을 그리워하겠지요.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