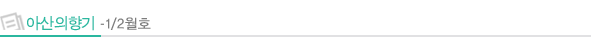|
 나누는 행복
나누는 행복 |
 내 존재의 행복, 나의 버팀목 같은 가족 내 존재의 행복, 나의 버팀목 같은 가족 |
홍경석 |
|
|
어젯밤에 아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이제 2주 후면 첫 휴가를 나오는데 벌써부터 우리 가족들과 상봉할 생각에 고무되어 잠이 안 온다고 했다. 그 얘기를 전해들은 아내 역시도 금세 함박 웃음을 띠며 아들이 어서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했다. 아들은 지난 여름에 입대를 했다. 그런데 어찌나 심지가 곧은 녀석인지 이따금씩 보내오는 편지에도 늘상 우리 가족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이 마치 갓 바른 물감처럼 뚝뚝 떨어지곤 하여 가슴을 뭉클하게 하곤 한다.
“아들이 휴가를 나오면 당신과 나는 당분간 별거해야 되겠네?”라며 웃는 아내에게 나는 딱히 부언(附言)할 것이 없었기에 이내 침잠의 늪으로 빠져들어야 했다. 그러한 나의 의기소침을 금세 간파한 아내는 밖으로 나가더니 소주와 안주를 사 가지고 돌아왔다. 아내가 따라준 술은 다소 울적했던 내 마음을 희석시켜 주는 청량제이자 묘약이었다. “내가 딸하고 잘테니 당신은 아들하고 자면 되지 뭘 그래요….” 허름한 방이 두 개뿐인 이곳으로 이사를 왔기에 아내는 아들이 돌아와서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걱정했던 것이다. 2003년도 이제 달력을 한 장 달랑 남겨놓고 있는 즈음이다. 누구라도 연말이 되면 그 해에 자신이 어찌 살아왔는가를 반추하게 마련이리라.
올 한 해 역시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하지만 내가 40년 이상을 살면서 2003년 한 해처럼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아니, 가히 파란만장했던 수난의 시절은 다시 없었다. 2년 전에 정리한 사업은 공룡처럼 크나큰 빚과 나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줬을 뿐 아니라, 좌절이라는 상흔마저 남겼다. 저승사자 같은 빚쟁이들의 등쌀에 못 이겨 빚을 변제하고자 가산을 정리하여 달동네로 이사를 하였다. 승용차도 처분하고 핸드폰까지도 해지하는 등의 악전고투를 하였지만 이자가 이자를 낳는 고리(高利)의 여타 빚은 태산준령이었다.
사업을 정리하고 취업을 하였지만 나이도 많고 딱히 기술도 없는 터였기에 ‘비정규직’이라 하여 사람 대접도 해 주지 않았다. 조족지혈(鳥足之血)의 급여로는 입에 겨우 풀칠을 했고, 여식의 사교육비를 감당하기도 버거웠다. 아내도 부업 전선에 나섰지만 가난은 강력한 본드처럼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다. 가정 형편이 그처럼 나락으로 추락하자 아들은 입대하기 직전까지도 수업을 마치면 식당에서 고된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돈을 벌었다. 그렇게 받아온 임금을 전액 아내에게 건네고 자신은 교통비 정도만을 받아가곤 했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는 무능한 이 아비의 마음은 자괴감으로 인해 무너지기만 했다.
그러한 질곡의 나날이 계속되자 나는 시나브로 생에 대한 의욕의 끈을 놓아버리기 시작했다. 허구한 날 폭음으로 낮과 밤을 모른 채 비척였으며 이 풍진 세상에 대한 이유 모를 저주의 서릿발을 곧추세웠다. 극심한 우울증과 자살의 망령이 그림자처럼 달라붙었다. 믿음직한 대학생 아들도, 여전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있는 여식도 다 필요없었다. 남들은 내 나이면 이미 집도 한 채 장만했고 직장에서도 간부급으로서 여유자적할 나이거늘, 머저리처럼 살아온 지난날 내 생의 여정은 고작 극심한 가난의 고통만을 가족에게 남겨 주었다는 자괴감으로 가족들을 볼 때에도 늘상 부끄럽기만 했다.
우울증과 자학의 강에 빠진 나머지 그만 음독자살까지 기도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미완(未完)으로 그쳤고, 입대를 앞둔 아들과 고교생 여식이 눈물로서 호소했다. 아내 역시 “삿갓 아래서 잠을 잘지언정 부부간의 정만 있다면 살 수 있댔어요.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자구요!”라며 격려했다. 혼수상태에서 깨어나 정신을 추스리며 나 자신을 돌이켜보았다. 불혹과 지천명의 중간 언덕에 서 있지만 하는 사업마다 늘상 실패의 연속이었다. 그도 모자라 믿었던 지인에게서 배신과 이용을 숱하게 당하면서 삶은 고통의 질곡으로 점철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저런 빚이 대추나무에 걸린 연처럼 많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진정 물질만이 행복의 기준이며 척도일까? 천착해 보니 실상 그건 아니었다. 행복이란 물질이 아닌 가족간의 무변한 사랑과 신뢰, 그리고 격려만이 진정한 것이었다. 마음을 다잡은 나는 다시 일어서기로 했다. 그것은 바로 가족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시일이 흘러 논산 훈련소에 아들이 입대할 때 나는 다시금 참았던 눈물을 흠씬 뿌려야 했다. 그 눈물은 남들처럼 입대를 앞둔 아들에게 마음의 휴식인 여행 따위를 보내주기는커녕 황금 같은 대학 시절을 힘든 아르바이트로 소진하게 만들었다는 나의 처절한 회한이었다. 하지만 아들은 “군대 2년은 금방 갑니다, 제가 얼른 제대해서 아버지의 힘든 어깨의 짐을 덜어 드릴테니 걱정 마시고 부디 건강하세요~”라고 외려 이 못난 아비를 위로해 주면서 군인이 되었던 것이다.
도래할 신년엔 이젠 제발(!) 흉(凶)보다는 길(吉)한 나날만이 연속으로 펼쳐지길 염원한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나서서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쾌도난마(快刀亂麻)로 헤쳐 나아가야만 하리라. 오늘은 귀가하여 휴가를 나오는 아들이 신을 구두를 닦아놓을 요량이다.
나는 현재 말 그대로 적수공권(赤手空拳)이다. 하지만 마음만은 더욱 옹골차게 다지고 있다. 날씨가 더욱 가파른 엄동설한의 협곡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겨울이라고 해서 만물이 생장을 멈추고 있는 건 아니다. 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황량한 벌판에 홀로 서 있는 나목(裸木)일지라도 내년 봄에 다시금 펼칠 힘찬 약동을 위해서 움직임을 멈추고 있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내가 바로 그러하다. 비록 나의 처지가 빈한의 극치이긴 하지만 어둠의 끝에는 반드시 밝은 새벽이 도래함을 믿고 있다. 또한 아내는 지금 역시도 우리 가정의 화목한 정립을 위해 사랑과 신뢰라는 양념을 아낌없이 뿌려주고 있으니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아울러 나에게는 아내 외에도 아들과 딸이라는 굳건한 버팀목이 존재한다는 것이 내 행복의 원천이며, 또한 내가 살아가는 의미임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아들이 돌아오면 삼겹살에 통음도 하고 목욕탕에 가서 아들의 등도 밀어 주리라. 그리고 한 이불을 덮고 잠을 잘 때엔 그동안 밀렸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사나이들만의 우정(?)을 확인하리라.
벌써부터 내 마음은 바람 가득 찬 풍선이 된다.
‘나누는 행복’ 지면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보내 주십시오. 더욱 다양한 독자 여러분의 행복한 이야기를 만나고 싶습니다. 우편으로 보내 주셔도 좋고, 이메일(asanhyanggi@korea.com)로 보내 주셔도 좋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