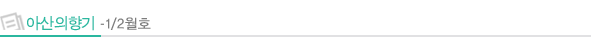|
 나누는 행복
나누는 행복 |
 빨간 내복 빨간 내복 |
김기숙 |
|
|
시골에서 나고 자란 나는 대중목욕탕에 대한 추억이 남다르다. 시골에서는 지금도 대중목욕탕 한번 가려면 버스 타고 읍내까지 가야 하는데, 내가 어릴 적에는 버스마저도 변변찮던 시절이니 대중목욕탕을 한 번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사였겠는가. 보통 여름이면 개울에서 멱감는 것이 고작이고 겨울이 되어서도 무쇠솥에 아궁이 불피워 물 데우고 온 가족이 순서대로 목욕하는 것도 호사였다.
그러나 일년에 한 번, 온 마을이 들썩이는 연중 행사가 섣달 그믐에 치러진다. 새해를 맞이하는 전날이면 어머니의 쌈짓돈이 나오고 우리 온 가족은 버스 타고 읍내로 목욕을 간다. 일년에 한 번, 묵은 해의 때를 벗겨내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의미와 설날 차례를 지내며 조상님께 깨끗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고 올 한 해도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절히 하기 위해서다.
읍내에 한 곳뿐인 대중목욕탕은 이날만큼은 콩나물 시루 같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옇게 김이 서린 탕 안에는 얼굴만 내민 사람들로 그득하고, 아이들은 찬물을 튀겨가며 놀기에 바쁘다. 아줌마들은 서로의 등을 밀어주고 바가지물을 퍼부어가며 살갗이 벗겨지도록 밀고 또 밀어댄다. 한켠에는 때를 안 밀겠다고 도망치는 아이와 그런 아이에게 때수건을 들이밀며 윽박지르는 아줌마, 뜨겁다고 소리를 질러대는 아이와 “그래야 때가 밀리지” 하며 탕 안으로 아이를 밀어넣는 아줌마, 결국에는 울어가며 때를 밀리는 아이들로 탕 속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1년에 한 번 하는 목욕이고 쌈짓돈 털어 하는 행사이니 오죽했을까. 묵은 때를 박박 밀어내느라 속때는 물론이고 살갗까지 벗겨져서 탕 밖으로 나온 몰골들도 가관이 아니다. 벌겋게 달궈지고 벗겨져서 당시에 유행하는 빨간 내복을 입을라치면 왜 그렇게 까끌거리던지…. 언니 오빠가 입던 것을 물려 입던 시절이라서 성한 곳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빨간 내복, 여기저기 기우고도 손목이 짧아 배꼽이 보이는 빨간 내복에 목을 들이밀고 억지로 몸에 맞춰 입을라치면 방금 밀어낸 등가죽이 따끔거린다. 그래도 서로 좋다고 까르르거리던 때가 어제같다.
이런 행사를 치러내고 맞이하는 새해. 설빔으로 얻어입은 헐렁한 새옷을 차려입고 마을을 돌며 새배를 한다. 집안 어른들의 덕담과 달콤한 강정으로 배를 불리며 새해를 시작한다. 먹을 것 변변찮던 시절의 새해 아침은 전날의 대중목욕탕 같은 아수라장만큼이나 그렇게 부산하게 덕담들로 넘쳐난다.
섣달 그믐이 되면 나는 소중하게 간직해 두었던 그 시절의 추억과 향수를 살짝 끄집어 내고 혼자 행복해하곤 한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