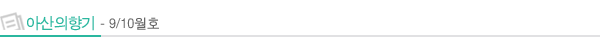|
우리 식구 가을 풍경
"할머니, 이불에 또 오줌을 싸셨어요?" 요실금으로 밤마다 이불을 펑덩 적시시는 예씨 할머니의 방에서 나는
소리다.
또 한편에서, "제 약 주실 거죠?" "약 주셔야 돼요?"라고 되풀이하시며 불안한 표정으로
외치고 있는 김씨 할머니. 김씨 할머니는 몇년째 우울증과 치매를 앓고 계신다.
우리집의 가장 부지런한 왕언니 옥희 할머니가 현관을 힘겹게 들어서신다. 식전부터 텃밭에 나가서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와 오이를
한 아름 안고 들어오시는 길이다. 84세로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신 옥희 할머니는 어찌나 부지런하고 정신이 건강한지 아픈 다리를
이끌고도 텃밭에 옥수수며 감자며 각종 작물들을 무더운 여름 내내 가꾸고 돌보셨다. 옥희 할머니를 보고 있자면 젊은 사람인 나는
부끄러울 때가 많다.
우리집의 아침은 이렇듯 소란 아닌 소란 속에서 시작된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한바탕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여름에 묵은 이불 빨래를 하는 동안, 할머니들은 각자의 위치로 가신다.
엄살이 심한 예씨 할머니는 다음 식사 때까지 방에 들어가 꼼짝도 안하고 주무신다. 옥희 할머니는 그늘 한 점 없는 텃밭에 나가
잡초를 뽑으시고(덕분에 우린 농약 한 번 안 치고 아주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먹을 수 있다), 김씨 할머니는 치매 때문에 하는
일 없이 줄곧 옥희 할머니만 따라다녀서 강아지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하셨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점심 시간. 오늘은 찰옥수수를
한 솥 삶았다. 가을에 맛보는 별미 중의 별미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즈음 우리 가족들의 마음은 가을 들녘처럼 풍성하다. 이곳 강원도 산골에 찾아온 가을도 너무나 시원하고 신선하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어느새 봄, 여름이 지난 오늘, 가을의 평화로운 하늘이 내 가슴에 들어와 있다.
글쓴이 김진동은 무의탁 노인들의 무료 쉼터인 하늘 공동체에서 봉사하고 있는 천주교 선교사이다.
대추는 익어가는데
베란다 창 너머로 늘어진 가지에 오롱조롱 탐스럽게 매달려 익어 가는 대추를 바라보노라면 가을 속으로 푹 빠져든다. 말복이 지나고
처서도 갔건만 다음 달 중순까지 오락가락 늦장마가 이어지고 국지적으로는 장대비를 쏟아부을 것이라는 예보를 접하고 보니 아침 저녁으로
가을이 익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장삼이사(張三李四) 모두가 불안하기만 하다. 남쪽 들녘의 논과 밭의 황량함이 보도 매체를 통하여
전해지고, 조금 나은 마을에서도 부담스러울 정도의 강수가 예상된다고 하니 걱정이 태산 같다.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을이 오면 농사 짓는 맛을 알게 되는 것인데….
남쪽 우리의 이웃들은 온갖 고통을 곱씹으며 땀흘려 가꾼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되었다니 어찌한단 말인가? 무엇으로 시름을 달래고
내년 농사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우리의 이웃, 그들의 모든 것을 그토록 기다렸던 비가 심술(?)을 부리며 송두리째 앗아가고
말았다. 어떻게 해야 집을 세우고 일용할 가장집물(家藏什物)을 마련한단 말인가? 원상대로는 몇 해가 지나가야 할 것이고 보면
우선 내년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다짐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격려가 답지(遝至)되어야 한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 언제나 고통을 치유하기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 풍요한 가을을 모르고 이 가을을 보내야 하는 이웃에게 또 다른 영역에서의
가을이 안겨지도록 뜨거운 도고(禱告)가 긴요한 때다.
재앙은 예고없이 밀려온다고 하면서도, 유비무환(有備無患)을 잘 알면서도, 당하고 나서야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는 삶은 이제
그만…. 당장 다음 달 중순에 쏟아진다는 비가 어느 고장에 어떤 모양의 재앙을 몰고올 수도 있는 것인데…. 자연은 자연 그대로라지만
절대신의 섭리에 따르는 것이고, 인간에 의한 그 어떤 힘으로도 자연은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이 가을의 문턱에서 다시 본다.
알량한 과학의 힘을 내세워 자연 정복 운운한다는 것은 분명히 신성모독이다.
천재는 어쩔 수 없다지만 근자에 빈발하는 인재까지 예방하려는 의지마저 보이지 않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주어진 시간을 바람직하게
관리하도록 신이 아껴 주신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고집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언젠가는 누구나 끝나는 시각에
가 있을 것인데, 오욕이나 생명 감정의 포로가 되어 배려에 인색한 삶을 산다면 그 이상 불행한 일이 또 있을 것인가?
근자에 돈(재산)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어두운 우리 사회에 빛이 되어 박수를 받고 있다는 것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희망이며
신선한 충격이다. 즐거워야 할 이 가을 문턱에서 쏟아져 내린 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 모두에게 격려와 위로를 보내며 다른
영역에서의 가을을 찾도록 감히 권면하는 것이다.
글쓴이 전석창은 강원도 홍천읍에 살고 있으며, 강원 인제남 초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가을이 가르쳐 주는것
윤기 나는 머리카락처럼 찰랑대던 여름의 꼬리가 감춰진 지 한참 지났다. 내 가난한 울 안에도 가을이 내려앉았다. 발그레한 감,
못생겨서 과일전 망신시킨다는 모과, 얼굴에 누런 분칠을 하느라 손에서 거울을 놓지 않는다. 나는 이제 가을 속으로 툭 빠져서
흠씬 취하기만 하면 된다.
여름 한철을 그처럼 신나게 노래하던 매미, 가버린 계절이 몹시 아쉬워서 처연하게 운다. 볼품없이 일그러진 내 가슴을 뚫고 들어와선
온통 헤집고 다닌다. 정말이지 우리 나라의 가을 하늘과 청량한 바람은 눈물이 날 만큼 눈이 부시다. 가을이 짧다고 푸념하지 말자.
저렇게 맑디맑은 하늘과 붉은 액체를 내뿜는 모습을 좀더 오래 동안 향유하려는 욕심에서 하는 말이다.
땡볕 아래 나뭇잎이 방향을 뿜어내며 치열한 몸놀림을 하였던 한여름. 이젠 인고의 시간을 마무리하며 짧은 가을볕에 얼굴을 씻는다.
가을은 우리에게 마음의 여백을 늘리라고 가르친다. 지난 계절의 그 참담했던 기억일랑 차분하게 비우지 않고선 가을이 주는 은혜로움을
담을 수가 없다고 충고한다. 여름의 고통과 상처, 구름처럼 떠돌며 살아온 많은 나날들을 하늬바람을 헤엄치듯 날아다니기에 분주한
고추잠자리의 날개에 실어 날려 버리자꾸나.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촛불을 켜자.
창 밖의 풀벌레들이 더욱 애절하게 울수록 나조차 가슴이 휑하여진다. 나도 긴 방황에서 돌아와 남루한 누더기 한 벌 벗으리라.
저 들녘을 보라. 쏟아지는 햇살에서 구수한 누룽지 냄새가 나누나. 눈물을 흘리지 않고선 볼 수가 없다. 두 팔 벌려 가득 안고
사랑으로 열매 맺음에 감사하며 이 가을을 보내야 한다. 익은 곡식들을 곳간에 채우는 농부도 이때만큼은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고
흐뭇함에 잠긴다.
가을은 스스로 완성하는 계절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탄생과 출발을 준비하는 계절이기도 하여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나무들은 잎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봄에 싹 틔울 잎눈과 꽃눈을 준비한다. 가을은 인생으로 보면 장년기이다. 노년기인
겨울을 문턱에 두고 있기에 지나온 계절을 안타까워하기보다 남아 있는 시간을 음미하면서 가슴 속에 무엇인가 하나쯤 챙겨 담아야
한다. 구수한 누룽지를 한데 모으며 이 가을을 보내고 싶다.
글쓴이 박순여는 전라북도 김제시에서 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