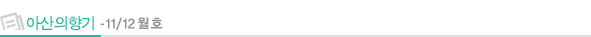|
 재단 사람들
재단 사람들 |
 매스미디어의 놀라운 힘 外 매스미디어의 놀라운 힘 外 |
김수진 |
|
|
“○○○님 들어오세요.”
다음 환자를 호명하는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연세 지긋한 노부부가 잰 걸음으로 진료실에 들어섰다. 진료 예약 시간에 늦은 것도 아니었는데 꽤 맘이 급하셨는지 할머니 손에 이끌려 들어오신 할아버지 이마엔 땀방울마저 송글송글 맺혀 있다.
“선상님, 우리 영감 폐암 검사 좀 해 주세요.”
어디가 편찮으시냐는 내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할머님이 급하게 말씀을 꺼내신다.
“네? 폐암이라구요?”
무턱대고 폐암 검사를 해달라는 보호자의 요구에 어안이벙벙해진 나는 다른 병원에서 혹시 폐암이 의심된다는 말씀을 들었는지 확인해 보았다.
“그건 아닌디유, 폐암 증상이 맞다니께유. 우리 영감이 엊저녁부터 등이 아파서 밤마다 앓는 소리를 해대는데, 이게 꼭 폐암 증상하고 똑같다고 그러잖유, 테레비에서….”
“그게 아니고….”
급한 마음에 숨까지 몰아가며 말씀을 이어가는 할머니의 설명에 자못 심각한 표정으로 묵묵히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가 그제서야 입을 여신다.
“거 일요일에 의사들 나와서 상담해 주는 테레비 프로 있잖여유. 거기 진행하는 개그맨 ○○○이 아버지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었는데 폐암 말기로 나왔었대유. 나는 담배도 안 피고 여지꺼정 감기 한 번 앓은 적 없는 사람인디, 아 글쎄 우리 할망구가 그 프로 보고 나서 내가 등짝이 아프다니께 테레비에서 본 거랑 똑같다믄서 서울 아들네에 전화 넣어 가지구 오늘 급하게 올라온 거유, 시방….”
할아버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이 순박한 시골 할머니를 이토록 걱정하게 만든 원인이 다름 아닌 TV에서 방송되는 의학 관련 프로그램임을 알게 되었다.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한편 방송에서 특정한 증례를 섣불리 일반화시켜 순진한 대중을 현혹하는 듯한 생각이 들어 씁쓸함이 느껴지기도 했다. 어찌 되었든 나는 그 날 할아버님을 진찰하고 간단한 몇 가지 검사를 시행한 후에 할아버님의 통증은 폐암이 아닌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것임을 할머님께 수 차례 확인시켜 드린 후에 댁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 놀라운 것은 그 주에만 등이 아파서 폐암 검사를 하러 오신 환자들이 네다섯은 되었다는 것이며, 그 때마다 나는 자신이 폐암에 걸렸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진 그분들과 적잖은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는 사실이다.
한때 모 프로에서 ‘토마토가 장수에 좋다’는 방송을 내보낸 후로 시중에 토마토 값이 배 이상 뛰었다는 웃지 못할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대중에게 미치는 방송의 힘이 이토록 가공할 만한 것이었는지를 피부로 절감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때 아닌 폐암 소동 이후 나도 몇 번인가 그 프로그램을 시청해 보았다. 물론 일상에서 쉽게 품을 수 있는 갖가지 궁금증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이 흥미로웠던 것은 사실이나 일부는 단지 시청자들의 흥미 유발에만 치중하여 너무 과대 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것이 사실이다. 때로는 확실한 의학적 근거가 마련되기도 전에 몇몇 연구 결과에서 보고된 자료만으로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을 아무런 의학적 지식없이 받아들일 시청자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자연스레 걱정스런 맘까지 생겨났다.
의사는 환자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제시해 줘야 하는 의무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인터넷과 방송에서 난무하는 의료 정보가 과연 우리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이제부터라도 관심의 눈으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왜 환자들이 의사의 말보다 방송에 더 의지하게 되는지를 오늘의 우리를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겠다.
글쓴이 김수진은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임상강사이다.
내가 마라톤을 하게 된 계기는 학교 다닐 때 오래달리기를 하면서부터였다. 체력엔 자신있었던 나였지만 학교 체육대회에서 전체 5등을 차지하고 보니 나 스스로가 놀라웠다. 처음부터 순위엔 관심이 없던 터라 7~8km 뛰는데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꾹 참고 완주한 결과는 5등. 기쁨과 동시에 아쉬움이 남았다. 4등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병원에 입사하면서 운동으로 스쿼시와 달리기를 시작했다. 퇴근하고 2~3시간씩 매일 운동에 매달렸다. 토요일이면 장거리도 뛰어보고, 42.195km에 도전하기 위해 준비를 많이 했다. 마라톤 풀코스 첫 도전은 김제지평선 마라톤 대회에서 가졌다. 첫 도전이라 설레기도 하고 기분도 들떠 있었다. 같이 뛰는 주위 사람들이 예상 기록을 물어보면 자신있게 “2시간 40분대요”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주위에선 처음이면 힘들 거라는 대답들뿐이었다. 그래도 나는 자신 있었다.
총성과 함께 ‘출~발’. 한 사람 한 사람 따라 잡는 재미를 만끽하면서 열심히 뛰었다. 10km를 40분 정도의 기록으로 통과하면서 계산상으로 2시간 40분이 힘들어 보였다. 기록에 대한 부담과 불안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15km를 넘어서면서부터 페이스가 늦춰지고 다리에 피로가 몰려오기 시작했다. 하프를 넘어서면서 발목, 무릎, 골반, 온몸이 아프기 시작했고, 30km를 넘어서자 다리까지 말을 듣지 않았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지나가는 행사 차량을 타고 싶은 심정이었다. 10km 정도를 걷고, 뛰기를 반복하고 다시는 마라톤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도 했다.
드디어 목적지가 눈앞에 보였다. 결승점인 종합운동장에 들어서자 모두들 박수를 쳐 주고 환영해 주는데, 힘이 솟고 가슴까지 뭉클해졌다. 젖 먹던 힘까지 쏟아가며 운동장을 한바퀴 돌아 결승선에 도달했을 때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도 마라톤 풀코스 42.195km를 완주했구나!’ 하고 감격이 북받쳐 올랐다. 목표했던 2시간 40분대에서 1시간이 더 걸린 3시간 42분으로 들어왔지만 나에게 기록은 큰 의미가 없었다. 마라톤은 도전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포기하고 싶어도 참고 일어나는 마라토너를 바보(?)이자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한다. 보스턴마라톤을 목표로 2시간대의 기록인 sub-3를 달성하기 위해 오늘도 달리고 또 달린다.
글쓴이 박광원은 정읍아산병원 의무기록사이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