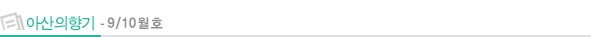|
 재단 사람들
재단 사람들 |
 TV 단상 外 TV 단상 外 |
김성윤 外 |
|
|
일요일 아침 식사 시간쯤에 TV에서 하는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프로를 가끔 봅니다.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가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일일 근무자로 일하면서 일의 힘겨움이나 애로를 경험하는데 여기서 생긴 수익금을 모아 좋은 일에 쓴다는 취지의 프로지요. 이 프로를 보면서 “와, 저런 물건은 저렇게 만드는구나…” 하면서 놀라기도 하고, 낯선 일에 쩔쩔매며 허둥대는 연예인들 모습에 깔깔대기도 하지만 가끔은 석연치 않은 마음 한구석의 불편함이 있어 곰곰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 프로그램을 볼 때 간혹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자행(?)되는 신참 길들이기의 풍토가 상기된다는 점입니다. 요령 없는 초보자가 감당하기엔 좀 어려운 일을 시키며 그 옆에서 마치 ‘나도 처음엔 그 고생 다 했으니 너도 한 번 당해 봐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람 참 약 오르게 만듭니다. 사회 어느 분야에나 이런 ‘길들이기’ 풍조는 있겠지만 이렇게 선임자가 후임자를 애 먹이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 분야의 발전은 항상 제자리 걸음 아닐까요? 더 나은 방법, 일의 요령 등을 쌓아 나가고 그런 노하우를 새로 온 사람에게 전수해서 ‘내가 고생한 것보다는 뒷사람이 좀 덜 고생하고, 그 뒷사람은 남는 에너지를 일을 더 낫게 하는데 쓰는’ 전통이 세워진다면 그 사회는 더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참에겐 가차없고 조금 이력이 쌓이면 요령을 피우기 시작하는 그런 수준을 벗어나 초보자에게 관대하고 관록 있는 사람에겐 엄격한 그런 ‘각 분야 프로들의 사회’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프로그램의 접근 방식이 무엇을 ‘한다’가 아니라 ‘해 본다’라는 점입니다. ‘한다’와 ‘해 본다’는 엄연히 다르지요. 어떤 일이건 그 가치와 의미, 방법을 익혀서 알고 진지하게 접근하는 것과 ‘한 번 해 보자’는 식으로 덤비는 것과는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곰탕을 끓이거나 나무 젓가락을 깎는 일에서부터 정교한 전자부품을 설계하고 거대한 선박을 짓는 일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이건 쉬운 일은 하나도 없기에 어떤 일에 종사하건 최선을 다하는 한 직업엔 귀천이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너무 오버한 건지는 몰라도 ‘한다’가 아니라 ‘해 본다’는 말 뒤엔 마치 ‘아님 말고’란 태도가 숨어있는 것 같아 씁쓸하군요.
일요일 아침 TV 보면서 원 별 생각을 다하네 하는 기분도 들지만 많은 사람들이 웃고 즐기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처음 온 친구 길들이기,’ ‘그냥 한 번 해보기’에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익숙해질까봐, 그래서 우리 사회 각 분야가 여전히 아마추어들의 세계로 남게 될까봐 조금은 염려가 돼서 해 본 이야깁니다. 그건 그렇고, 이렇게 글 ‘써 보니’ 나름대로 재미있는데요?
글쓴이 김성윤은 서울아산병원 정신과 전문의이다.
일요일 아침 7시, 머리맡 핸드폰 소리에 눈을 떴다.
짧은 순간, 나를 추스리게 한 창속의 번호는 병원을 표시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세면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오늘 하루도 결코 평범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박 과장님, 오늘 새벽 1시에 부산에서 뇌사자 발생했거든요, 방금 전에 간 이식 수혜자가 응급실에 와 계신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후다닥 씻고 양복 챙겨 입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기까지 채 1시간, 이 정도면 거의 ‘5분 대기조’ 수준이다.
문득, 처음 장기이식 상담 업무를 맡게 된 때가 기억난다.
누가 초보 아니랄까 봐, 왕초보 티를 팍팍 내며, 원칙과 기준만을 내세우는 게 무조건 잘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앞이 캄캄해진다. 환자, 보호자들에게 친밀감(Rapport) 형성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장기이식에 대한 방향 제시까지 완벽하게 해야 하는 카운셀러로서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던 시간들이 아닐 수 없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쌓인 노하우는 그래서 내게 재산과 같다.
사실 장기이식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환자나 보호자가 더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했고, 바로 이때부터 상담을 적정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호자께서는 지금 빨리 ○,○○○만 원을 병원 통장에 입금하시고 연대 보증인에 대한 서류도 서둘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황달 기운으로 노랗게 물든 눈동자와 검게 변색된 피부, 마치 임산부의 배마냥 뿔룩 튀어 나와 있는 부인이 들을 새라, 떨리는 손을 몰래 감추며 몇번이나 계좌번호를 고쳐 쓰던 남편은 잠시 드릴 말씀이 있다며 자리를 옮기자고 했다.
“선생님, 제발 살려 주세요. 저희가 워낙 없이 살다 보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굵은 눈물을 떨구던 남편은 손때가 잔뜩 묻은 농협 통장을 내보이며 무릎까지 꿇고 통사정을 한다.
현대의학의 마지막 선택이라는 장기이식은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지만 역설적으로 절망을 안겨 주기도 한다.
아무리 훌륭한 상담기법과 거창한 친절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했다고 해도 이쯤되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다. 오직 상담자만의 상황을 꿰는 정확한 판단력과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하여 내리는 올바른 결정밖에는 그 어느 것도 소용이 없다.
한바탕 태풍을 겪은 일요일 오후 병원 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볍다. 환자의 이름이 새겨진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 옴으로써 수술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남편과 고등학생 큰딸, 중학교에 다니는 동생이 서로 볼까 몰래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뒤로 하고, 오늘 하루 한 생명을 구하는데 작은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모든 것이 고마워진다.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가족과 함께 파멸의 길로 들어섰다는 끔찍한 뉴스를 자주 접하는 요즘, 생명의 고귀함을 알고 가족간의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장기이식 업무를 수행하는 내게 덤으로 주어진, 더없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글쓴이 박명근은 서울아산병원 원무팀 재원법무 UNIT 과장이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