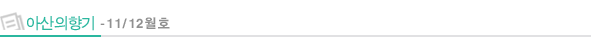|
 이철수 판화
이철수 판화 |
 이철수 판화 - 고양이 몫 이철수 판화 - 고양이 몫 |
이철수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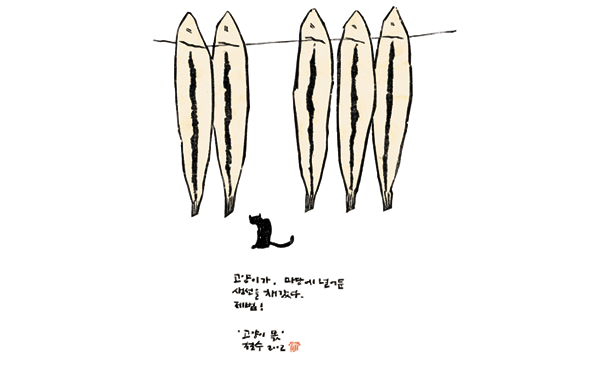 |
살다 보면 괜찮은 상대를 만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일전불사를 작정했다가 상대가 쉽게 무너지면 허탈하지요? 이편이 너무 쉽게 접으면 상대가 그런 심정이 될테구요. 녹녹치 않은 상대를 만나 겨루다 보면 상대가 밉기보다 존경스러워집니다.
“이것 봐라?”
“괜찮네!” 싶어지는 거지요.
살다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놀랍다!’는 경탄을 자아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솔직성에 놀라기도 하고, 욕심 없음에 놀라기도 하고, 너그러움에 놀라기도 하고, 기발함에 놀라기도 합니다.
저하고 가까이 사시면서 자주 오시는 어른들 중에 ‘전주 할머니’가 계십니다. 자주 씻지도 못해서 냄새가 풀풀 나는 ‘미친 노인네’시라 그이 언행에서 무어 배울 게 있을까 싶지만 제게는 가끔씩 아픈 죽비를 내리시는 큰 선생님이십니다.
전쟁 중에 가족을 잃고 홀로 되어서 정신도 놓아버린 그이는 이제 80 중반을 넘긴 연세이십니다.
언젠가,
“우리 아들 잘 생겼지요?” 하고 농담 섞어 여쭈었다가
“사람은 다 똑같어!” 하신 바람에 놀라서 그림으로 옮긴 적도 있었습니다만, 흘러간 메모첩을 뒤지다 보니 또 다른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할머니, 잡숫고 싶은 것 없으세요?” 하면
“밥 먹었어!” 하시고
“아니, 드시고 싶은 것 없냐구요?”라고 다시 물으면, 역정을 섞어서
“아, 밥 먹었당께로!” 하시는 겁니다.
김구 선생은 첫째 소원도 통일이요 두번 세번 다시 물어도 ‘내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셨다는데, 전주 할머니도
드시고 싶은 것 목록을 다채롭게 하실 생각이 아예 없으신가 봅니다. 그래도 이런 저런 음식을 내드리면 달게 드십니다. 맛에 까다로운 제게는 그이 편안한 음식 습관이 절제와 자연스러움을 두루 갖춘 어른스러움으로 보입니다.
한번은 봉지에 담긴 귤에 눈길을 주시길래,
“할머니, 그 귤 가져다 드세요.” 했더니 저를 빤히 보시고는 달랑 두 개만 집으셨습니다.
“두 개만 가져갈께.”
“그거 다 가져가셔도 돼요.” 해도 다시,
“두 개만 가져갈께.” 하십니다.
큰 보살이시지요?
어린 딸아이가
“할머니한테서 냄새 나!” 하는 소리를 듣던 날 제가 그랬습니다.
“그 냄새가 전주 할머니다.”
그이는 악취 안에 숨겨진 보석입니다. 그 깊은 존재가 제 곁에 오래 사시기 빌고 있지요.
때로 어리석어 보이는 짐승들도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도둑고양이 한 마리, 빨랫줄에 높이 달아놓은 생선을 노리고 있더니 밤새 채갔습니다. 솜씨가 놀라워서 비린 생선 몇 마리 아깝지 않았습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