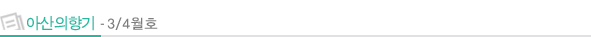|
 노둣돌
노둣돌 |
 물과 불 물과 불 |
정호승 |
|
|
산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산을 태우며 좀처럼 꺼질 줄 몰랐습니다. 진달래도 철쭉도 노란 산수유도 산불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봄 햇살에 기지개를 켜던 너구리도 오소리도 그만 불타 죽고 말았습니다. 이리저리 산을 휘돌아 돌던 강물은 산불을 보자 은근히 화가 치밀었습니다.
“야, 불아, 너 힘 자랑 좀 그만해. 지금 비가 안 와서 야단들인데, 왜 너까지 나서서 그러니?”
불은 그런 말을 하는 강물이 우스워 아예 무시해 버릴까 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물아, 넌 왜 쓸데없는 잔소리를 하니? 괜히 남의 일에 끼여들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해.”
“우린 남이 아니야, 친구야.”
“우리가 친구라고?”
“그럼, 친구지. 우린 서로에게 약해. 불은 물에 약하고, 물은 불에 약해. 서로에게 약하다는 것은 서로 친구라는 뜻이야.”
“아니야, 난 네 친구가 아니야.”
불은 더 이상 물을 쳐다보지도 않고 거침없이 산을 태워 버렸습니다. 산에는 이제 막 새 움이 돋기 시작한 나무들이 불길에 휩싸여 하나 둘 사라져갔습니다.
“불아, 제발 좀 그만해. 부탁이야. 이제 그만했으면 됐잖아!”
물은 불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아직 멀었어. 난 배가 고파.”
“불아, 네가 산을 태우면 산에 사는 나무와 벌레들이 다 죽어 버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아니야, 그건 네가 반드시 알아야 해. 그건 소중한 생명을 죽이는 일이야. 생각해 봐, 누가 널 죽이면 좋겠어? 지난 겨울에 넌 추운 곳을 따뜻하게 해 주었고, 얼어붙은 것들을 녹여 주었어.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말이야. 그런데 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니? 도대체 무슨 심술이 난 거야?”
불은 그런 말을 하는 물이 우스웠습니다. 강바닥을 기어가는 목마른 물뱀 같은 물이 정말 가소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야, 물아, 너 이제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마. 한 마디만 더 하면 널 삼켜버리고 말 거야.”
불은 지금 당장이라도 물을 집어 삼켜버릴 듯이 붉은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하하, 불아, 큰소리치지 마. 난 널 꺼뜨릴 수 있어도, 넌 나를 이길 수가 없어.”
물도 지지 않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하하, 정말 웃기는군. 어디 다시 한번 그런 말을 해봐.”
불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듯 물을 덮쳤습니다.
물은 몸이 증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지만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혀를 날름거리는 뜨거운 불길에 온몸을 맡긴 채 고요히 비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비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산에 물을 뿌렸으나 산불 또한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가에 가녀린 제비꽃 한 송이가 막 꽃망울을 터뜨릴 때였습니다. 갑자기 날이 흐려지더니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처음에 봄비답게 부슬부슬 내렸으나 곧 여름 장대비처럼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산불이 꺼지고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삽을 들고 이리저리 들녘을 뛰어다녔습니다.
불은 슬펐습니다. 꺼져 가는 불길을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불은 하는 수 없이 마지막 남은 불씨 하나를 가슴에 품고 강물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물이 불을 힘껏 껴안으면서 말했습니다.
“불아, 무서워하지 마. 우린 이제 하나가 된 거야. 난 널 사랑해!”
글쓴이 정호승은 시인이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