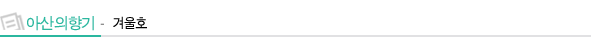|
 춤으로 읽는 세상
춤으로 읽는 세상 |
 '원조' 탐미주의자 김영태 '원조' 탐미주의자 김영태 |
장승헌 |
|
|
당신의 일상이 나른한 오후에는 서울 혜화동 로터리에 있는 커피숍 ‘엘빈’을 방문하길 권한다. 그곳에 가면 한쪽 구석에서 눈에 띄는 발레 토슈즈의 소묘 액자가 맞이한다. 그 아래서 시인이자 화가, 무용평론가인 ‘초개눌인(草介訥人)’ 김영태는 언제나 풍경처럼 구겨 앉아 (그의 포즈를 직접 봤다면 구겨져 앉아 있다는 말에 크게 동감할 듯) 커피향과 담배 연기를 친구 삼아 5개의 일간지를 탐독한다.
시쳇말로 그는 ‘종합예술인’이다. 그것도 서너 세대를 아우르는 기간을 종합적으로 살아왔다. 1936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복고를 졸업하고 홍익대 서양화과에서 붓을 든 것이 1957년, 이듬해 가을 ‘사상계’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한다. 당시만 해도 세인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하던 ‘무용평론’을 쓰기 시작한 시기는 69년이다.
대학시절 홍대 근처 외국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용 사진집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 발레리나 안나 파블로바의 고혹적 모습에 반해 그만 ‘춤’에 빠져버린 것이다. 이후 춤은 그가 눈 뜨면 찾는 담배, 커피와 함께 단 한순간도 그의 곁을 떠난 적이 없는 동반자가 된다. 언젠가 그에게 춤 없는 인생을 생각해 본적이 있냐고 했더니 일순 정적이 흐른 후 한숨 쉬듯 ‘단 하루도 못 살 것’이라 답했다. “장식처럼 살았는데 어쩌다 보니 벌써 70이네요. 본업은 시인데, 여기저기 편력하다가 69년부터 무용에 전념하게 되었어요. 후회는 없습니다. 한눈팔지 않고 춤 동네에서 몸과 마음을 부대끼며 살았으니까….”
대학로 아르코 예술극장(구 문예회관) 대극장 가열 123번. 그가 30여 년간 무대에서 춤추는 뮤즈들을 얼굴 솜털까지 관찰할 수 있다는 독일제 망원경으로 훔쳐보는 자리다. 그 자리는 이제 극장 리모델링으로 L11번이 되었다. 자신의 글씨를 연상케 하는 봉두난발 머리를 감추기 위해 그가 항상 고집하는 모자는 그만의 기막힌 콘셉트이자 패션의 일부다. 그의 애장품 1호 은빛 단장, 구겨져 펴지지 않는 와이셔츠와 조끼, 조금씩 다른 디자인을 한 버버리와 롱코트 패션 역시 무용계 멋쟁이들조차 찬사를 보내는 그만의 독특한 분위기다.
“하염없이 내리는 첫 눈 / 이어지는 이승에 / 누군가 다녀갔듯이 / 비스듬히 고개를 떨군 / 개잡초들과 다른 / 선비하나 / 저만치 가던 길 멈추고 / 자꾸 자꾸 되돌아 보시는가”
(시 ‘누군가 다녀갔듯이’ 전문)
위는 그의 예술인생의 또 다른 축인 절친했던 지인, 무용가 최현 씨가 3년 전 타계한 후 그 영전에 바친 우정의 시다. 형님, 아우로 호형호제하던 최현 씨가 세상을 떠난 후 덧없고 허전함을 넋두리처럼 읊은 노래. 30여 년을 하루같이 매일 무대를 찾던 그도 요즘은 건강이 좋지 않아 공연 관람을 빠지는 일이 많아졌다고 한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건강을 걱정하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 청춘이다. 인생은 칠십부터라는 주위 덕담을 몸소 실천이라도 하듯 그의 또렷한 영혼은 저물기는커녕 갈수록 젊어진다.
“칠십인데 청바지를 입고 다니니? / 그렇다 (중략)
칠십 청바지는 건달에게나 어울려 / 건달도 상품, 하품 나름 /
몸이 쪼개지면서 스며있던 향기를 / 무슨 물감을 남겨야 되거든 /
당신은 하품인가? / 그렇다”(시 ‘캐주얼’ 중에서)
스스로를 하품(下品)으로 낮추는 그의 겸손함은 삶과 죽음이라는 이율배반적인 변증법마저도 단순한 풍경으로 바꾼다.
지난 11월 중순에는 그의 고희를 앞두고 필자를 비롯해 평소 그가 아끼는 무용가 7인이 감사의 마음을 모아 ‘김영태 선생 고희 기념 헌정무대’ <우리시대 무용가 2005 - 세상을 홀로 걷는 춤, 솔로>를 호암아트홀에서 공연하며 노 시인의 춤 인생을 기념한 바 있다.
“과분하죠. 춤이 좋아 살아온 아웃사이더에 대한 우정의 배려인데, 쑥스러울 뿐입니다.”
그의 아호 ‘초개눌인’은 ‘지푸라기처럼 보잘 것 없는 어눌한 사람’이란 뜻이란다.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선생은 스스로 “아름다움을 훔치러 다니는 사람”이라고 칭했다. 평생 아름다움을 찾아 방랑해온 보헤미안, 김영태. 그는 오늘도 아름다움을 훔치러 공연장으로 향한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