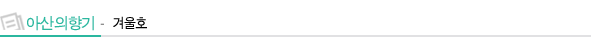|
 이 사람의 이야기
이 사람의 이야기 |
 연기자 최불암의 '아버지와 아랫목' 연기자 최불암의 '아버지와 아랫목' |
김지영 |
|
|
주판이 놓인 상 앞에 어깨를 수굿이 내리고 앉아있던 백발성성한 노인. 그러나 최불암 씨를 직접 만났을 때, 말끔한 회색 슈트 차림의 그는 ‘전원일기’속 양촌리 김 회장님보다 훨씬 젊어 보여 낯이 설었다.
“대학 연극반에서 원래는 연출을 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 역을 할 배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암시인지, 이후론 내내 노역 단골이 되었어요.”
처음 전원일기를 시작할 때 김 회장은 이미 환갑노인이었는데, 그때 자신의 실제 나이는 채 마흔이 안 되었었다며 ‘퍼허’ 웃는다. 그 유명한 ‘최불암표’ 웃음 아니, 밭고랑처럼 굵은 주름을 쫙 펴며 웃는 김 회장식 웃음이다. 그제서야 배우 최불암은 간 데 없고, 양촌리 김 회장 어른이 눈앞에 앉아있다.
전원일기를 시작한 것이 1980년이었다고 한다. 2002년까지 방영되었으니, 22년 여 긴 세월 동안 최불암 씨는 양촌리 김 회장이자 대가족을 거느린 아버지로 살았고, 그 안에서 그가 보여준 아버지 역할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우리시대 아버지에 관한 민요
“전원일기는 전통적인 한국가정의 대가족 구조로 4대가 모여 살았는데 김 회장은 이 대가족의 중심이었죠. 김 회장은 거의 안방 아랫목에 앉아있었는데 그 자리가 옆모습만 나오는 위치였어요. PD가 좀 돌아 앉아 보라고 권유했지요. 저는 그대로 있겠다고 했습니다. 화면에 얼굴이 잘 나오는 것 보다, 아버지로 나와야했으니까요.”
아랫목은 아궁이와 바로 연결된 곳으로 방바닥에서 가장 뜨거운 부분이다. 그래서 추운 겨울, 대가족의 식솔을 거느린 아버지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그곳에서 고단한 몸을 녹이곤 했다. 또한 외출 후 꽁꽁 언 손을 아랫목 이불 속에 넣으면 식지 말라고 넣어둔 아버지의 밥주발이 만져지기도 했던 정감어린 곳이다.
“녹화장에서 그 때 막 나오기 시작한 비닐 장판을 사용했는데 색깔이 윗목이랑 분간이 안 갔습니다. 우연히 방송국 미술팀에서 쓰는 스프레이를 보고 갈색을 구해서 아랫목 위치에 뿌렸지요. 그랬더니 영락없이 장판이 좀 타서 꺼메진 아랫목이 되더라고요.”
이렇듯 그는 아랫목에 앉아 있는 순간에도 아버지로서의 삶에 충실했다. 사람에 대한 인정어린 배려와 흙바닥과 군불이 지층을 이루어 만들어내는 ‘가장 인간적인 온도’, 그 자리에 깃든 ‘아버지의 체취’를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아버지는 뜨뜻함 때문에 아랫목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의 위치를 스스로 격려하고 존중하는 의미에서 앉지요. 이걸 가부장적인 ‘권위’라기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인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랫목을 지키는 남자의 심정을 누가 알까요?”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아버지의 심정. 이에 대해 어느 작가는 ‘지독히도 미워하던’ 아버지를 자신의 드라마 속 아버지 대사를 쓰면서 이해하게 되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식구들의 하루 세 끼니 밥걱정이 평생을 갈 때 그 역할을 잘 해내든 그렇지 못하든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감이 크다는 것을 알았다며 덧붙여 말했다. ‘밥은 신성하고, 아버지는 위대하다’고.
40여 년 세월에서 길러낸 ‘구수한 큰 맛’
최불암 씨에게는 세 가지 고유한 멋이 있다. 기운을 사방으로 흐르게 하는 탁 트인 ‘웃음’과 낙엽의 마찰음을 연상시키는 가을질감의 ‘음성’, 그리고 한 빛깔의 농담(濃淡)만으로 이루어진 듯한 담백한 ‘초상’이다. 이런 그만의 매력은 세월을 연료로 하여 더욱 깊은 멋을 자아낸다. 오랜 아버지 역할이 아니어도, ‘구수한 큰 맛’을 내는 우리시대 아버지의 느낌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일본식 사무라이 아버지가 있고 미국식 카우보이 아버지가 있다면 우리들 아버지의 특징은 질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투박하지만 구수하고 깊은 정이 있는 아버지요. 사람들이 김 회장을 통해서 흙내 나는 우리의 전통적인 아버지를 느낀 것 같습니다.”
평소 그는 전원일기의 김 회장과 집에서 아버지로서의 생활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이에 대해 무릇 훌륭한 연기자들이 그렇듯 ‘크게 다르지 않다’고 답한다.
“요즘은 대부분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아랫목 윗목 구분이 없죠. 집집마다 아버지의 자리가 사라진 듯하여 쓸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도 아파트라서 아랫목은 없습니다만 저는 소파에 제 자리가 있고 안사람과 애들의 자리도 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바닥에 아무데나 앉아서 방석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듯이, 자기 자리가 있음으로 해서 가정 내의 역할에도 충실하고 화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 속에서,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앉는 자리가 달라진다 해도 ‘아버지 DNA’를 배양해 내는 묵묵한 아버지의 숨결이 읽힌다.
험난한 세파를 온몸으로 이겨내는 우리의 아버지들.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경제발전의 밑거름으로서 당신의 하나 뿐인 삶에 헌신해 온 아버지는, 그래서 이 겨울, 밖에서 돌아온 이를 제일 먼저 맞아주는 아랫목의 뜨거움과 같은 등가로 그리워지는 것이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