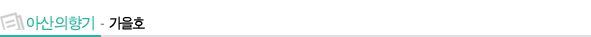|
 오늘하루 그대가 되어
오늘하루 그대가 되어 |
 ‘행복덩어리’와 노는 엄마 ‘행복덩어리’와 노는 엄마 |
이인영 |
|
|
“오뚝이처럼 일어나라, 공부 잘해라, 희진아.” 생후 10개월 된 아기 희진이 손을 만지작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거는 홀트아동복지회 위탁모 김재석 씨(65). 아기가 알아듣지 못해도 희망처럼 주문처럼 짬만 나면 소곤거린다. 때론 아기를 배 위에 올려놓고 잠을 재운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 자라야지. 자장…. ” 등을 토드락거리며 그녀의 심장 소리도 듣게 한다. 이내 새액색 곤한 잠에 빠지는 아기는 간간이 꿈속인 양 배내 미소를 짓는다.
생모인 미혼모는 알코올 중독이었다. 그래서 희진이는 발달장애로 발육이 늦다. 지금쯤이면 잘 기고 뭐든지 잡고 서려고 할 때인데 일어설 생각을 안 한다.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또 되뇌인다. “아가야~ 오뚝이처럼…. 공부 잘 하고….”
20년 전, 위탁모로 처음 아기를 받았을 때도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그 아픔은 줄어들지 않았다. 아기는 왜 그리 가슴에 와 닿는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눈망울은 왜 그리 예쁜 건지! 아기의 눈이 왜 슬퍼 보이는지! 그녀는 알 수가 없다.
위탁모인 친구 집에 갔었다. 그 집에 맡겨진 아기의 눈은 티 없이 빛났고 아기를 들여다보는 친구는 행복해 보였다. 맏딸을 막 시집보낸 김재석 씨에겐 초, 중, 고등학생 아들 셋이 있었다. 아들들 뒷바라지 등의 이유로 가족들이 반대했지만 교육을 받고 위탁모가 될 수 있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1955년 미국인 해리 홀트 씨 부부가 한국 전쟁 중에 고아가 된 혼혈아 8명을 입양하면서 출범한 전문 입양기관이다.
86년 4월 첫 아기를 받았다. 친구 집에서 사랑이 움찔거리며 움터오던 그 날, 자신이 그 후 20년 세월의 밤낮을 헌신하며 80여 명의 아기를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재우게 될지 그녀는 몰랐다. 그것도 대부분 장애가 있는 아기를.
김재석 씨는 400여 명의 위탁모 중 가장 많은 장애아동을 돌보았다.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맡아달라고 부탁이 오면 한 번도 ‘못하겠어요’ 거절하지 않았다. ‘자식을 어찌 선택하나. 주는 대로 받고 정성껏 길러야지’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세 번째 아기부터는 뇌성마비, 수족기형, 저 체중아 등 중증 장애아동이 그녀에게로 오게 된 것이다.
장애아기. 핏덩이로 찾아와 생명을 맡긴 아기들. 버림받은 슬픈 존재를 받아 다시 기쁨 자체가 되도록 행복의 기운을 불어넣어야 하는 건 그녀의 몫이었다. 벅찬 희생과 고통과 정성 없이 그런 종류의 아름다움은 절대 이루어 질 수 없는 거였다.
강영이는 안 아픈 곳이 없었다. 미숙아로 태어날 때 기관지 협착증세로 호흡곤란을 일으켜 수술을 받고 목에 작은 구멍을 뚫었다. 그 외에도 뇌수종 등 여러 병으로 몹시 힘들었다. 한 위탁모가 못 키우겠다며 복지회에 되돌려 보냈던 강영이가 그녀에게 왔을 때 그래도 막연히 기대했다. ‘우유는 먹을 수 있겠지.’ 그 바람은 무산되었다. 주사기로 우유를 먹여야 했다. 튜브를 달고 힘들어하는 아기의 가래를 빼주고, 감기에 걸리면 밤을 꼴딱 새웠다. 아기가 아파 울면 그녀도 애처로워 함께 울었다. 몸은 정말 파김치가 되었다. 그 때 그녀는 생각했다. ‘나 보다 아기가 더 힘들지….’ 강영이는 5살까지 그녀가 키웠다. 지금 9세가 되었지만 홀트일산복지타운에서 자라고 있다. 엄마 아빠도 없이. 장애가 심한 아동은 입양이 되지 않아 더욱 눈에 밟힌다. 돌본 아기 중 5명은 결국 시설로 갔다. 일반 장애아동들은 거의 다 국외 입양이 된다. 그녀가 키운 80여 명 중 국내 입양은 단 두 명뿐이었다. 위탁모들은 1세부터 10세까지의 입양대상 아동을 몇 개월 혹은 몇 년씩 맡아 기른다.
이혼가정 아이들을 볼 때도 눈물을 흘린다. 3남매 아기들은 홀트에서 한 달에 한 번 만날 때마다 서로 붙잡고 울었다. 뭔가 아는 것일까? 그들에게 친엄마, 아빠, 그리고 고향이 숨어버리고 사라져 간다는 것을. 태생적으로 적합한 기후와 풍토는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세 남매는 다 비행기를 탔다.
제일 겁나는 건 응급실로 뛸 때다. 새파래진 아기 곁에서 마음 졸이며 숨을 쉬나 안 쉬나 들여다보노라면 입술이 탄다. 그러나 그 보다 더 힘든 건 이별할 때다. 아기들 입양이 결정되고 출국 날짜가 다가오면 가슴에서 뭔가 ‘쿵’ 하고 떨어진다. ‘정이 들어 내 자식인데 보내야 하다니!’ 하지만 마음을 달랜다. ‘빨리 이곳을 잊고 그곳에서 적응 잘하고 사랑받는 아이가 돼야지!…’ 혼자서 스스로에게 말을 한다.
다행히 가족들도 아기를 좋아했다. 그녀에게 첫 번째 장애아동이었던 요섭이는 ‘정말 예쁘다’며 항상 웃으며 지냈다. 고 3이던 아들은 “시장에 다녀오세요. 무릎에 앉히고 공부할게요!” 했고, 남편은 아기를 안은 채 식사하는 날도 많았다. 요섭이는 머리 수술을 하고 걷지 못해 8개월을 매일 업고 다니며 세브란스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산만해진 분위기 때문에 아들 공부도 염려되고 모두 피곤했지만 힘을 합해 키웠다. 다행히 아들들은 공부를 잘했고 올바르게 자라줬다. 아들은 일류대학에 합격했고 지금 대기업에서 근무한다.
어느 날, 공무원인 둘째 며느리가 말했다.
“제 아이들 좀 봐 주세요, 어머니. 돈도 많이 드릴게요.” 손자를 봐달라는 절실한 청을 곤란했지만 단호히 거절했다. “안 된다. 네 아이는 네가 키워야 해. 그게 최고야. 적으면 적은대로 살려무나. 직장 그만두고….” 손주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있으니 아들 내외가 키우고 부모 없는 이 아기들은 그녀가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기는 엄마의 숨소리와 눈 맞춤을 먹고 자라지 않는가.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존경했다. “어머니처럼 살 거예요”하더니 공무원직을 사퇴했다.
2003년과 올해 5월, 미국 입양아동 모임에 초청돼 미국에 가 아이들을 보고 왔다. 손가락이 붙은 아기도 예쁘게 자라고, 일어서지 못했던 요섭이도 훌쩍 자라 잘 걸었다. 아이들도 한국에서 엄마가 온다는 소식에 달려왔다. 말도 안 통하지만 얼굴을 비비고 가슴에 안겨오는 아이들.
“남과 같이 가진 것 배운 것 없는데 자식 복은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라는 김재석 씨. 65세 정년이 되어 희진이를 끝으로 그 행복덩어리를 두 손에서 놓게 되는 걸 아쉬워했다. “이젠, 뭐 하고 놀죠?” 그녀가 물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