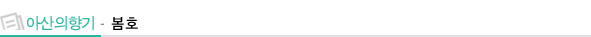|
 오늘하루 그대가 되어
오늘하루 그대가 되어 |
 제 17회 아산상 수상 단체 모현호스피스 문선옥 수녀 제 17회 아산상 수상 단체 모현호스피스 문선옥 수녀 |
이인영 |
|
|
“할아버지 불을 켜야지요. 방이 너무 어둡고 추워요. 보일러 좀 트세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요 밑으로 손을 디밀며 모현호스피스의 문선옥 수녀가 생기 있게 말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은 이미 아프다. 생일날 식구 하나 없이 전립선암 투병을 하는 김장선 할아버지(71). 가져온 미역국과 케이크가 별 위로는 안 되더라도 젊은 수녀들과 함께 기타에 마음을 실어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드린다.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아름다운 동행이 될까….’ 밖은 어둑어둑 해지고 합창이 할아버지의 작은 방안에 울려 퍼진다. 가슴 속엔 눈물이 고인다. 미소 짓던 할아버지가 드디어 못 참고 얼굴을 손으로 감싼다.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그녀가 할아버지 등을 조금씩 쓸어내리며 조심스레 묻는다. “죽는 건 괜찮은데 왜 이렇게 병들고 아파야 하는지….” 환자들은 죽음을 부정하다가도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정말로 슬퍼한다. 이 슬픔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도록 해야 한다. 죽음으로 가는 길은 너무 외롭고 두렵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누구나 가는 길. 우린 모두 죽음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않은가? 문 수녀는 묻는다.
할아버지 방엔 오래된 큰 전화기가 두 대나 이부자리 옆 방바닥에 놓여있다. 하루 종일 걸려오는 전화는 없다. 그래도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전화기가 소중하기만 하다. “죽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모르면 어떻게 해?” 할아버지가 몹시도 슬퍼한다. 벽에는 ‘네슬레 이유식 만들기 125년 기념 세레락 시계’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 시간을 돌려놓을 순 없을까? 이유식처럼 부드러운 음식이 필요한 건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인데.
젊은 날 문 수녀는 여동생이 병으로 죽는 것을 보았다. 사제 서품을 받은 지 6달도 안된 사촌오빠도 교통사고로 죽었다. 한창 풋풋한 꿈 많은 소녀와 자신을 봉헌하고 헌신의 삶을 살기로 서약한 아름다운 청년 사제. 그들이 죄가 많아 죽진 않았음을 알았다. 어느 날, 모현호스피스를 찾아가 눈으로 확인한 다음 임종자들을 돌보는 ‘마리아의 작은자매회’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유한한 세상에 그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었다. 환자의 육체, 정신, 심리적 통증을 덜어주고 끝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스피스의 역할이 리얼하게 다가왔다.
그녀가 보고 들은 죽음은 여러 모습을 하고 있었다. 잘 죽기 위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삶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변화된 모습 없이 원망하며 병마의 고통 속에 간다. 그러나 30대 젊은 시인 부부의 이별은 몹시도 안타까웠다. 남편은 아내가 안쓰러워 임종시 아내를 안아주고 싶다고 했다. 아내는 침대 위로 올라가 남편 품에 안겼다. “사랑해. 죽는다, 미안해….” 이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미국에서 만난 이웃 할아버지도 임종시까지 또렷한 의식을 갖고 “나, 이제 가도 되겠어?” 라며 사랑하는 아내 품에서 물었다. “예, 이젠 가세요”라는 아내의 대답을 듣고야 숨을 거두었다. 배려하며 가는 사람. 그들은 끝까지 사랑하고 갔다. 사후 세계에 대한 확신으로 먼저 간 이를 만날 기쁨에 들떠 임종하는 이도 있다. 성품대로 간다고 한다.
김장선 할아버지도 한 때 가족이 있었다. 아내가 딸을 데리고 나가 소식이 끊기고 유일한 여동생은 미국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 왕래가 끊긴 지 오래다. 이제 마지막 가야하는 길.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짓눌러 오지만 사랑 받지 못했다는 슬픔과 아무도 함께 하지 않는다는 소외감에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린다. “저희가 아무 때고 달려 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곁에서 봉사자와 문 수녀가 함께 위로를 한다. 잊지 않고 함께 한다는 것, 있어 준다는 것 이상의 위로는 세상에 없다.
인생의 완성, 그 마무리 시간이 소중함을 알기에 아무 준비 없이 임종을 맞는 사람들이 가엾기만 하다. 안타까운 경우는 너무도 많은데 시간이 없다. 그래서 밤에도 부르면 가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의약품은 물론 에어매트까지 들고 버스를 탄다. 문 수녀가 소속되어 있는 모현호스피스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애정으로 자청해서 자신의 삶을 바친다.
“수녀님, 나 같은 사람도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죽음을 조용히 받아들이던 아가씨가 하루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다가 물었다. 뼈 암이 전이된 아가씨. 여전히 너무 예쁘기만 한 젊은 모습은 더욱 애처롭다. 문 수녀는 말없이 한동안 그녀를 끌어안았다. 마치 성모님이 갈바리에서 예수님을 끌어안은 것처럼.
영국에 총본부를 둔 ‘마리아의 작은자매회’는 지난 1963년 강릉에 갈바리의원을 개원해 호스피스 활동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다. 1987년에는 서울에 모현호스피스를, 지난해에는 경기도 포천에 호스피스 전문병원인 모현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를 열었다. 모현호스피스에선 가정 방문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환자들은 직접 오게 해 데이 케어(Day Care)도 한다. 죽음을 앞둔 환자끼리 동병상련의 정으로 대화도 하고, 찰흙 빚기며 음악 미술 영화 감상과 아로마 마사지도 받는다. 마음을 평온하게 정리하고 근육의 통증도 완화시킨다.
환자의 가족도 돌본다. 사람을 잃는 고통은 치유되기가 힘들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가족들. 그들을 돌보는 사별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연구모임도 갖는다.
사무실 테이블 위. 문 수녀가 김장선 할아버지의 누이에게 쓴 편지가 보인다. 어떻게든 더 아프시기 전에 소원도 푸시고 여동생하고 여행이라도 다녀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철철 담겨있다. ‘…꼭 연락이 되어 마지막 순간을 행복하게 맞이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너무 보고 싶어 집을 팔아서라도 미국 가서 동생 얼굴 한 번 보고 오고 싶다고 하세요. 꼭….’ 남산 자락 모현의 하늘 위로 기도와 정성이 올라가고 있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