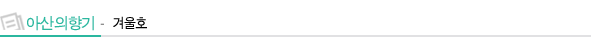|
 오늘하루 그대가 되어
오늘하루 그대가 되어 |
 '나눔의 전화' 상담원 표화순 '나눔의 전화' 상담원 표화순 |
이인영 |
|
|
“따르르르릉” 2평 남짓한 사무실의 적막을 가르는 벨소리가 울린다. 그 순간 올해로 21년 째 ‘나눔의 전화’ 봉사를 하고 있는 표화순 씨(61)의 가슴이 떨려온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이 갈수록 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엔 어떤 가슴 아픈 사연일까? 심호흡을 한번 한다. 수화기를 든다. 잠시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흐르고 “녜…. 그러셨군요.” “녜, 힘 드셨겠네요.” 이따금씩 “ 녜….” 하는 조용한 그녀 목소리만 정적을 깨며 낮게 흐른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귀에 온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예요’라고 한번 시원하게 외쳐보세요. 마음속으로 부추긴다. 어느 틈인가 상담자의 닫혀져있던 가슴이 조금씩 열리며 마음이 소통하는 길을 스스로 찾아낸다. 한 사람에게 숨어있던 슬픔과 고통들이 일부 길 위로 튀어나오고 이따금 잦아드는 울음소리가 어떤 시작의 신호음처럼 들려오기도 한다. 고통은 쏟아져야만 한다. 그녀는 묵묵히 받아주는 역할을 한다. 정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 아픈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해결 방법, 또 해야만 하는 마음의 정리를 도울 뿐이다.
드러나는 보람은 없다. 죽고 싶다며 쏟는 눈물을 보고 곁에서 같이 가슴 아파할 뿐이다. 그러다 보면 희망의 빛을 찾아 살고 싶어하는 상처받은 여린 내면들과 만나게 된다. 그저 공감만으로도 그들은 위로 받고 고백을 통해 정화되기 시작한다. 들어주고 함께 고민하는 것만으로 살 힘을 얻는 사람들이 너무 가엾다. 함께 울어줄 수 있고 메아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 길을 계속 간다.
50대쯤 되는 남성이 어제 퇴원했다며 전화를 걸어왔다. ‘찰칵’하고 공중전화에서 돈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났다. 그녀의 가슴도 그때마다 ‘찰칵’ 내려앉았다. 심장이 안 좋아 15일간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부인과 딸이 한 번 와봤다고 했다. 돌아온 집엔 냉기가 돌고 밥 한 끼에도 따뜻함은 없었다. 서러움이 묻어있는 목소리로 중년 남자는 어린아이처럼 숨죽여 울먹이며 말했다. 병원에서 우연히 본 ‘나눔의 전화’ 안내를 보고 전화하고 싶었지만 그런 아내가 있는 곳에서 전화 걸 수는 없었단다.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그에게 따뜻한 가정은 동경의 대상이었다. “아내에게 남자가 생긴 거 같아요. 추궁하려 해도 두렵습니다. 이혼만은 피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는 헉헉 우는 소리가 한참 났다.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그녀가 겨우 말했다.
사람들은 외딴 섬에 갇힌 채 구원해줄 배를 하염없이 기다린다.
80년대만 해도 고부간의 갈등이나 남편의 외도가 문제였다. 요즘은 부쩍 40~50대 남성 전화가 많아졌다. 경제적인 위기, 인터넷 채팅중독, 자녀 문제, 우울증 등으로 심한 불안과 갈등을 겪는다. 여자의 외도문제도 많다. ‘나눔의 전화’를 통해 사회문제를 먼저 알게 되는데 스와핑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는 일도 간혹 있다.
진정 아픔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상대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가장 상담을 잘하는 사람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녀는 기도를 잊지 않는다. ‘내 눈을 열어 남들에겐 요긴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남들이 부르짖는 바를 듣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 남들을 돕게 하소서’
나눔의 전화는 1983년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개설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80여 명의 봉사자가 교대로 상담을 한다. 표화순 씨는 처음에 성당에서 선교 상담을 하다가 자신의 상담으로도 입교를 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을 보고 상담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상담교육을 이수하고 이곳의 상담원이 되었다. 심리교육도 정기적으로 받으므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
밤에 노숙자 상담을 나갈 때도 있다. 어디 아픈 데는 없나 하고 살핀다. 그들은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녀의 마음 같으면 1차 상담은 자원봉사자가 하고 2차는 정신과 의사들이 의료봉사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 정착하도록 주선하면 도로 나오는 사람들. 그러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 순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관심과 대접을 눈빛을 마주하며 받아본 적이 거의 없다. 자활할 분들을 가려 쪽방을 얻어드리고 도와드렸다. 추석 다음 날 11분을 모시고 자원봉사자 10명이 집에서 음식을 장만해 서울어린이대공원에 함께 갔다. 그날 그렇게 어린이처럼 좋아하는 어른들의 무리를 보았다. ‘난생 처음 인간 대접 받는구나’ 하면서 짓던 환한 웃음이란!
정이란 이렇듯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무기력하게도 만든다. 그녀는 이 일을 하다가 발견했다. ‘아, 어릴 때 환경이 문제구나. 어머니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구나.’ 누구보다 부모의 관심과 책임지는 사랑이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다. 그녀는 ‘부모에게도 자격증이 있어야 하지 않나’하고 사회를 향해 묻고 싶다.
다시 벨이 울린다. 창호지 창문으로 빛이 은은하게 흘러 들어오고 있다. 그녀가 호흡을 가다듬고 귀를 열기 위해 눈을 감는다. 전화를 걸 곳이 있고 전화에 응답해주는 사람이 있는 한 세상은 고독과 절망의 유배지에서도 하나의 희망이라는 틈새를 발견하고 살 이유를 알아내는 것이리라.
나눔의 전화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사회복지회 (02-752-4411, 4413)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