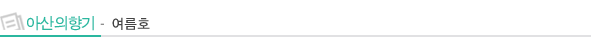|
 오늘하루 그대가 되어
오늘하루 그대가 되어 |
 어느 간병인의 하루 어느 간병인의 하루 |
윤성희 |
|
|
그녀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한다. 손으로 말을 하고, 표정으로 말을 하고, 가슴으로 말을 한다. 이것이 올해로 11년째 간병인을 하고 있는 성진숙 씨(58세)의 하루 일과다. 환자들에게 따뜻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그녀의 이야기에 말을 할 수 없는 환자들은 눈빛으로 대답해준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다. 11년 전, YWCA에서 간병인 교육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아름다운 삶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막연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았지만, 오히려 그녀는 그 환자들이 자신을 돌보았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자신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빈약했으리라. 이 세상에서 나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사로잡혀 있었으리라. 자신이 얼마나 세상을 좁게 보고 있었는지도 깨달았다. ‘사랑’ 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깊은 지도 이제야 깨달았다. 간병인을 하면서 그녀는 더욱 더 기도를 자주 한다. 자신이 돌보는 환자를 위해 기도를 하고, 병들지 않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한다.
그녀가 간병인을 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자식들이다. 아이들이 엄마의 품을 떠나 세상의 품으로 들어가는 나이가 되자 그녀는 자신의 일을 찾았다. 간병인은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인 그녀가 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다. 환자의 경우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간병은 24시간을 돌봐야 한다. 집안에 환자가 있었던 사람들은 알리라. 병원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교통사고 환자와 같이 골절을 많이 입은 환자들은 통증 때문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럴 때 간병인은 같이 밤을 새워주고 같이 아파해야 한다.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겨 입원한 환자들은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밤에도 안심을 할 수 없다. 그녀는 말한다.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 엄마겠지. 내 형제겠지. 내 남편이겠지. 내 자식들이겠지. 그래서 돌보던 환자가 끝내 회복하지 못할 때는 내 혈육을 잃은 것처럼 가슴이 아파지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던 환자가 건강하게 병원을 나설 때는 새로 태어난 것처럼 마음이 환해진다. 간병인이란 그렇게 다시 태어나기를 수십 번 해야 하는 사람이다.
간병인은 환자의 병을 간호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 전에 병에 지친 환자의 마음을 간호하는 일이 더 먼저다. 오랫동안 누워있는 뇌졸중 환자는 근육이 굳어버리기 쉽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마다 관절운동을 한다. 손가락 마디마디, 발가락 마디마디. 그녀를 보고 있노라니,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라도 그렇게 정성껏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비록 간병인과 환자로 만났지만 그 만남이란 인연은 소중한 것이라고, 어느 연인들과의 만남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간병인의 첫 번째 조건은 사람을 폭넓게 좋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마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절대 ‘좋은’ 간병인은 될 수 없다. 그녀는 생각한다. 이 세상에서 병든 사람을 보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다고. 그래서 손가락을 주무를 때도, 관절운동을 시켜드릴 때도, 가래를 빼낼 때도, 대소변을 받아낼 때도, 자연스럽게 정성이 몸에서 배어나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는 병들었지만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마음의 병은 회복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알아차린다. 그녀에게는 마음의 병이 없다. 늘 자기 자신에게 아픔에 대해 물어야 하니까. 생로병사를 깨달으면 누구나 삶에 대해 겸손해진다. 그녀는 자신의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만의 욕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요즘은 한다. 그래서 그녀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것을 인정하겠다고 말한다. 자기가 돌보는 환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 간병을 해주는 걸 더 좋아하지 않겠느냐고. 그녀는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장담하지 않는다. 그것은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녀가 터득한 생에 대한 겸손일 것이다.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고개를 들어보면, 창밖으로 한강이 보인다. 그 창을 통해 그녀는 앞으로 몇 달 동안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볼 것이다. 간간이 가슴에 물음표가 새겨질 것이다. 하지만 쉽게 답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쩌면 그것에서 일곱 색깔이 거꾸로 된 희한한 무지개를 만날 지도 모르겠다. 혹은 일곱 색이 아닌 열두 색으로 된 무지개를 만날 지도 모르겠다. 그걸 기적이라 부르든 뭐라 부르든 상관없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돌보고 있는 환자가 창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 그 무지개를 보고는 환한 미소를 짓는 것. 그리고 오랫동안 다물고 있던 입을 열며 ‘배고프네’ 라고 찬찬히 말을 하는 것. 그날을 기다리며 그녀는 오늘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한다. 환자들은 간호받기보다는 이해받기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글·윤성희(소설가) 사진·하지권
|
|
|
|
|